글쓰기의 무림, 이른바 문림(文林)에 고수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강원국. '지존'이었던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절대고수 밑에서 8년간 연설문과 글쓰기를 절차탁마했던 그였다. 지존 생전에는 좀처럼 문공을 드러내지 않고 강호(江湖)에서 은인자중 하던 그가 지존 사후 5년만에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문림신공'을 들고 나타난 것이다.
사실 세상에는 연설문과 글쓰기에 관한 책이 널려 있다.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대통령의 글쓰기>(메디치미디어, 2014년)를 쓰는 데 참고한 글쓰기 책만도 30권이 넘는다. <글쓰기의 최소원칙>에서부터 <글쓰기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정치는 다수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 '함께' 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말과 글은 상대를 설득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은 연설문을 통해 자신의 뜻을 국민에게 전하고 국가를 경영하거나 통치한다. 대통령 연설문은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인 글이다.
이 책이 다른 글쓰기 책과 다른 점은 김대중(3년), 노무현 전 대통령(5년)에게서 8년간 직접 보고, 듣고, 배운 글쓰기 비법을 담았다는 것이다. 그냥 글쓰기 비법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글쓰기' 비법을 응축한 것이다. <대통령의 글쓰기>는 글쓰기에 관한 실용서이자 두 대통령의 인간적 면모를 추억하게 하는 회고록 성격을 띠고 있다.
'글쓰기 40검법'과 '에피소드 10화(話)'

▲<대통령의 글쓰기> 책 표지. ⓒ 메디치
이 책에는 저자가 평생 갈고닦은 '글쓰기 40검법'과 8년간의 청와대 생활에서 추려낸 '에피소드 10화(話)'를 담았다. 독자와 교감하라, 메모하라, 제목을 붙여라, 진정성으로 승부하라, 타이밍을 잡아라 등이 전자이고, 보이지 않는 유령이 되어라, 대통령과의 특별한 여행 등이 후자이다. 닳고 닳은 표현이지만 교양(인문)과 실용(글쓰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가르쳐주는 보기드문 책이다.
저자가 대통령 연설문을 쓸 때 청와대에 출입했던 기자의 시각에서 보면, 대통령 연설문 쓰기라는 '노가다' 현장에서, 더구나 누구보다도 뛰어난 글쓰기의 두 고수(高手) 밑에서 치열하게 고민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이 책에는 논리학과 수사학, 철학 등 인문학과 미국의 대통령학 저술에서 건져내 응축한 엑기스가 녹아 있다. 현장과 이론의 적절한 배합은 이 책의 가독성을 높인다.
저자의 글쓰기 '내공'이 이미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입소문을 탄 덕분인지,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이런 내공의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사실 글쓰기에는 왕도가 없지만 글쓰기 훈련에는 검증된 지름길이 있다. 예로부터 전해온 다독(多讀)과 다작(多作), 그리고 다상량(多商量)이 그것이다. 많이 읽고, 많이 써보고, 생각을 많이 해야 글을 잘 쓸 수 있다고 했다.
저자는 어릴 때부터 책 속에서 살았다. 어릴 때 더부살이를 했던 이모부집에 책이 많아 "책에 묻혀 자고 책 속에서 밥 먹었다"고 할 만큼. "그때 우리나라 소설 중에 야한 것은 거의 읽었다"고 한다. 고교(전주 신흥고)에 다닐 때는 전북에 있는 제일 큰 서점에서 입주 과외를 한 덕분에 "과외를 끝내고 나면 서점 책이 모두 내 것"이던 시절도 있었다.
이른바 '남아수독 오거서(男兒須讀 五車書)'가 있었기에, 그는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후 기자 되기를 포기하고 대우증권에 들어갔지만 글쓰기와 인연이 닿은 것이 아닐까 싶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대우증권 사사(社史)를 쓰게 되고, 거기서 발군을 실력을 보여줘 당시 전경련 회장이던 김우중 회장의 비서실에서 연설문을 쓰게 된다. 당시만 해도 '세계경영'을 선도한 김우중 회장 비서실에는 고졸 해커에서부터 운동권 출신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포진해 있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닮은 점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 ⓒ 권우성
이 책의 상당 부분은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밝히는 데 할애하고 있다(다른 점은 아래의 [표] 참조). 글쓰기의 공통점은 광적이라고 할 만한 독서, 열정적인 사색, 끊임없는 메모다. 차이점이라면 날카로운 논리를 구사하면서도 김 대통령은 주로 적절한 비유법을 통해 쉽게 메시지를 전달한 반면에, 노 대통령은 '한 줄의 카피'로 인상적인 메시지를 남긴 것이다.
우선 두 대통령의 글쓰기 원천은 끝없는 독서 욕심이다. 김 대통령은 퇴임 후 청남대에 책 읽는 모습의 동상이 설치될 만큼 휴가 중에는 독서삼매경에 빠졌다. 책을 읽은 뒤에는 사색을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 대통령이 되어 스스로 지킬 것을 다짐한 '대통령 수칙' 12번이 '양서를 매일 읽고 명상으로 사상과 정책 심화해야'였을 정도다.
노 대통령은 재임 중에 좋아하는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 '리더십비서관'이란 자리를 만들었다. 그 역할은 주로 국내외 책이나 논문을 읽고 요약본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었다. 외교관인 이주흠씨를 리더십비서관으로 발탁한 배경도 그가 쓴 책 <드골 리더십과 지도자론>을 읽고서였다. 윤성식 고려대 교수를 감사원장 후보로 발탁한 배경도 그의 책을 읽고서였다. 그래서 당시 청와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인사 하마평이 나올 때면 누가 무슨 책을 써서 발탁되었는지를 살펴보곤 했다.
두 대통령의 또 다른 공통점은 사색과 메모의 달인이라는 점이다. 김 대통령은 '메모광'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매사에 꼼꼼히 기록했다. 일찍이 IT의 중요성을 강조해 정보고속도로 시대를 연 대통령답게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의 기록도 중시했다. 지금은 보편화된 정부 기록물은 김 대통령이 2000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국가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기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노 대통령도 늘 가까운 곳에 손바닥 두 배 크기만한 메모지를 놓고 살았다. 그가 본 노 대통령은 '이지원'이라는 청와대 내부 전산망 안에 '실마리 파일'이라는 기능을 만들어 놓고 글감이 떠오를 때마다 메모를 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누구보다도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한 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즉 '적자생존'으로 요약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다른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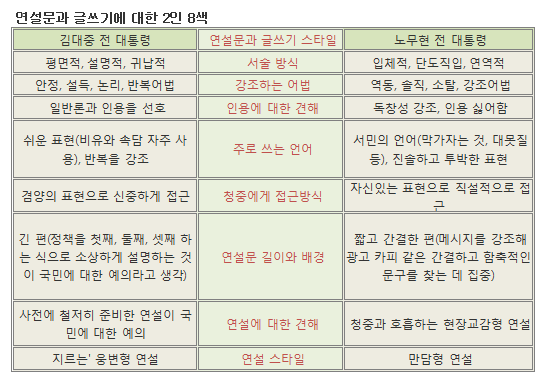
ⓒ 오마이뉴스
국민 또는 독자와의 교감을 강조한 김대중과 노무현에게 다른 점도 있었다. 정치인 김대중의 오랜 지론은 '국민보다 반 걸음만 앞서 가라'는 것이었다. 왜 하필 반 걸음일까? 정치 지도자는 국민보다 늦게 가도 안되지만, 너무 앞서가면 국민과 잡은 손을 놓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치는 또한 '타이밍의 예술'이기도 하다.
노무현은 자신의 책 <운명이다>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냥 민주투사가 아니고 뛰어난 사상가였다"고 평가했다. 또 "햇볕정책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미래를 내다보는 원대한 철학적 구상에 기초한 것"이라며 '철학이 있는 대통령'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도 인간인지라 김대중과 비교할 때 싫어한 내색을 보일 때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대중 대통령은 '반걸음만 앞서가라'고 했다"는 말을 할 때였다. 주변에서 비슷한 조언을 하면 "또 그 얘기냐"며 반박하기도 했다.
노무현의 생각은 달랐다.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눈높이'를 넘어 '역사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자도 책에 썼지만, "이승만을 찍어준 국민의 눈높이와 4·19혁명을 일으킨 역사의 눈높이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자신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인간적 대통령이었다. 강 작가는 책에 이렇게 썼다.
"어린 아이와 사진 찍을 때 다리를 크게 벌려 키를 맞추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 속에 글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답이 있다."그가 책에 풀어놓은 40가지 '글쓰기 검법'들을 여기에 나열할 수는 없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23번째 '진정성으로 승부하라'는 검법이다. 그는 "진실한 모든 말과 글은 훌륭하다"면서 '경청의 달인'이기도 한 두 대통령의 예화를 들었다.
노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시절에 국무회의 자리에서 김 대통령에게 들은 가장 감명 깊은 한 마디는 "절대로 굶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였다. 일흔이 넘은 대통령에게서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기자에게는 당시 해수부가 세들어 있던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에서 연좌시위 하던 어민들 앞에 오리걸음으로 앉아서 귀 기울이던 노무현 장관의 진정성 깃든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아있다.
이 책은 읽기는 쉽지만 요약하기는 힘든 책이다. 이 또한 저자의 '전략적 집필'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글쓰기의 영감을 얻고자 하는 이라면 <대통령의 글쓰기>를 사서 스스로 읽으며 훈련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