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진은 미국의 역사가 전쟁과 떼려야 뗄 수 없음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느끼도록 했다. 이미 그의 저서 <미국 민중사>는 숨겨진 (혹은 숨기고 싶은) 미국의 역사를 다시금 상기시켰다.
그 책을 더 쉽게 쓴 게 <살아있는 미국역사>고, 이 둘을 압축해 만화로 구성한 게 <하워드 진의 미국사>다. 그러니 <하워드 진의 미국사>는 아래로부터 시작하는 미국 역사의 최소한인 셈이다. 왜곡된 엘리트의 역사에 가려진 진짜 민중들의 역사.
"2003년 3월, 조지 부시 대통령은 사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9·11사태와 알 카에다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짓 주장을 내세우며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유엔의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이 침공을 유엔헌장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유엔의 고문반대위원회는 부시의 고문 사용을 제네바협약 위반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그러나 부패하지 않고 사람을 고문하지 않는 황제가 있나요? 전쟁과 정복을 하지 않는 제국이 있나요? 그것은 군인이 없는 군대와 같습니다. 아니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부와 같습니다. 제국이 없는 세계와 같은 것이죠." - 하워드 진, <하워드 진의 미국사> 266쪽9·11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었다. 연기로 가득한 화면 속에서 사람들은 빌딩에서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겨우 영상으로 사건을 접한 사람은 그들이 느꼈을 공포가 무엇인지 이해한다고 말하기가 죄스러울 정도였다. 빌딩에 충돌한 비행기의 승객들은 또 얼마나 무서웠을까. 빌딩 잔해 아래서 수천 명이 신음했다. 당연히 누구나 분노했고 슬퍼했다.
하워드 진은 9·11을 또 다른 시각으로 읽는다. 애도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의 정치가들은 '복수'나 '응징'을 강조했고 결국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른다. 결론은 또 전쟁이었다. 9·11을 부른 게 무엇인가. 인류의 역사 속에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앙갚음과 복수, 테러리즘과 반테러리즘, 폭력과 폭력. 끝나지 않는 도돌이표.
전쟁으로 점철된 '진짜' 미국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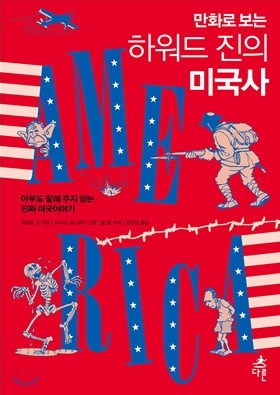
▲책표지만화로 보는 <하워드 진의 미국사> ⓒ 다른
전쟁으로 전쟁을 잠재울 수 없단 사실을 아직도 모를까.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며 아프가니스탄에 행한 무자비한 폭격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숨졌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폭격수로 복무했던 하워드 진은 "그건 테러가 아니냐"고 일갈한다. 폭격의 본질이 무차별적인 살상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다.
인디언들을 사냥한 나라에 세운 미국. 대륙에 먼저 터를 잡고 살아가던 인디언은 자신들의 숭배 대상이었던 버팔로와 운명을 같이 했다.
버팔로는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6000만 마리가 살았지만 100년도 지나지 않아 단 100마리도 남지 않았다. 야금야금 자신의 나라를 넓혀갔던 미국은 타협보다는 '사냥'을, 개척 대신에 '학살'을 했다.
이런 야만성은 고스란히 경제체제에도 흘러들었다. 잔인한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의 분노를 낳았다. 커져가는 빈부격차와 비참한 노동자들의 처우는 깊은 반감을 불러왔다. 배를 불리는 건 소수요, 굶주리는 건 다수였다.
미국은 분노를 잠재우는 수단으로 애국주의의 창궐을 택했다. 국민을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선 끊임없는 외부의 적이 필요했다. 결국 최고의 애국 행위는 전쟁이었다. 그 첫 재물은 에스파냐였고 무대는 쿠바였다. 쿠바혁명을 돕는단 표면적인 이유로 제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냈다.
"미국이 일단 쿠바에 발을 들여놓으면 누가 다시 그들을 내보내겠는가?" -호세 마르티, <하워드 진의 미국사> 45쪽참, 한 가지 웃기는 점은 전쟁에 내몰린 대다수의 병력은 흑인이었고 승리 후 기념사진은 백인들이 찍었단 사실이다. 그래서 당시 승전 사진에서 펄럭이는 성조기 밑에는 흑인 병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미국의 이빨은 라틴 아메리카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전쟁이 필요했던 미국은 세력이 넓을수록 좋았다. 접점이 커질수록 외부의 적을 만들긴 수월했다. 필리핀으로 눈을 돌린다. 아시아를 향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다.
끝까지 저항하던 900명의 원주민들의 손에는 고작 벽돌 덩어리가 들려 있었다. 그들이 밀리고 밀려 분지로 들어가자 대표를 쏴댔다. 결국 원주민들은 몰살 당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학살'을 치하했다.
"장군과 장병들의 빛나는 승리를 축하합니다. 당신들은 성조기의 명예를 드높였습니다." - 테오도어 루스벨트, <하워드 진의 미국사> 81쪽무슨 명예인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건 미국에게 전쟁은 참 좋았다. 사람들의 불평도 잠재울 수 있었고 기업은 살쪘다. 물론 전쟁으로 발생하는 부당이익이 엄청났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도 상승했지만 기업의 이윤은 비교도 되지 않게 올랐다.
엇나간 애국주의, 자랑스러운가?그럴수록 미국은 전쟁을 더 갈망했다. 미국에게 찍히면 누구든 재물이 돼야 했다. 전쟁을 수행할 희생양도 절실했다. 그러기 위해선 국가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게 애국이라고 믿도록 해야 했다. 애국이 전쟁이고, 전쟁이 애국이다. 국가의 뜻에 반하는 이들은 모두 '빨갱이'다. 얼마나 쉽고 편리한가!
징병제가 시행 중인 우리는 지금, 자신의 신념대로 총 집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어떤 대우나 손가락질을 받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징병제를 시행했던 미국에서 징집을 반대한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로 둔갑한 사례가 많았다.
그 양태에 대해 별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게다. 우리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일컫는 일부 세력의 구호가 무엇인지 들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우리의 길을 먼저 걸은 진정한 '선진국'이다.
전쟁으로 점철된 미국의 역사에서 병력 충원은 절실했다. 징병 방해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도 그 때문이다. '방첩법'도 마찬가지다. 징병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에서조차 모두 범죄가 됐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미국 법무부는 사적인 단체에게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몰래 감시하는 권한까지 줬다. 이런 단체 중 하나인 '미국수호협회'는 회원수가 30만 명이나 됐다고 한다. 무차별적인 신고로 시민들의 입을 막는 데 일조했겠지만, 그들 또한 '애국'한다는 자부심을 가졌겠지. 반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이 아이러니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문득 비슷한 현상 하나가 떠올랐다. 바로 국정원에서 '빨갱이'를 신고하는 '애국시민'들에게 나눠준다는 '절대시계'. 유치한 소영웅주의와 엇나간 애국주의의 잘못된 만남은 이른바 절대시계를 잉태했다. 인증문화는 이런 경향을 더욱 독려하는 중이다.
베트남전에서 애국이라 믿고 민간인들에게 네이팜탄을 쏟아 부은 파일럿은 수훈장과 각종 기념품, 상장들을 챙겨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결코 다시는"이라고 적었다. 그래, 아직도 절대시계가 자랑스러운가?
평화보다 전쟁을 갈망하는(듯이 보이는) 세력들은 과연 전시에 총을 잡을까, 징병을 반대하며 평화를 주창한 세력에게 매질을 할까. 사뭇 궁금해지지만,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며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엇나간 애국주의에 있어서 만큼은 미국의 역사가 우리를 근 백 년이나 앞서갔다.
덧붙이는 글 | <하워드 진의 미국사> (하워드 진 지음 / 다른 / 2013.09 / 1만6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