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는 미안하셨던지 파프리카 모종이 몇 개 남았다며 그냥 가져가라고 하셨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할머니를 의심한 죗값도 죗값이지만 돌아가시기 전 소금 넣을 자리에 설탕을 곧잘 넣으셨던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서다. 설탕으로 간을 한 음식이 맛있을 리 없지만 침침하신 눈으로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겨우내 나의 양말을 따뜻한 부뚜막에 데워주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그깟 양념 따위가 무슨 문제일까. 문제가 있다면 파프리카에서 피망이 달린 이유를 헤아리지 못하고 가격에 눈멀고 결과에 눈먼 나의 인색한 안목이었다. 그래서 나는 받지 않겠다는 할머니 손에 다시 이만 원을 쥐어 드렸다. 그리고 파프리카인지 피망인지 모를 모종 다섯 포기를 다시 주말농장에 정성껏 심었다." -(<삼백 리 성묫길>에서)<삼백 리 성묫길>(북나비 펴냄) '파프리카 파는 할머니' 한 부분이다. 봄이면 모종이나 비료 농약 등을 파는 가게 앞을 지나다 더러 만나곤 하는 풍경도 떠오르고, 최근 겪었던 일도 떠올라 좀 남다른 감회로 읽은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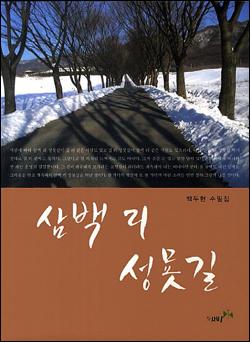
▲<삼백 리 성묫길> 책표지 ⓒ 북나비
나는 감자, 고구마, 호박, 땅콩, 옥수수, 야콘, 오이, 피망 모종 등을 주말농장에 사다 심었다. 농부가 아닌 직장인이기 때문에 주말마다 조금씩 사다 심곤했다. 너무 많아도 처분이 골칫거리인지라 남에게 조금씩 나눠줄 정도로 5포기, 10포기 이처럼 심다보니 3백 평 채우기가 언제나 고민거리였다.
그날도 나머지 땅에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며 모종 파는 곳들을 기웃거렸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파프리카를 심어보라고 권했다. 500원짜리 피망보다 7배나 비싼, 3500원짜리 파프리카를 말이다. 이에 7포기를 2만 원에 흥정해 사다 심고 파프리카 따먹을 기대에 부푼다.
그러나 웬걸~!, 파프리카에서 피망처럼 파란 것들만 열린다. 처음엔 '피망처럼 파랗게 열려 점차 노란색이나 주황, 빨강색 등으로 바뀌겠지' 기다린다. 그러나 결국 때를 놓치고 말아 썩고 만다. 심을 생각조차 없는 자길 꼬드겨 비싸게 팔은 할머니의 속내를 의심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 봄 우연히 다시 그 파프리카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 좀 험한 소리로 따졌음은 물론이다. 자신의 의심과 달리 할머니의 노안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실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그 순간 내 할머니가 생각나 할머니에게 도리어 미안해지고, 상대방을 헤아릴 조금의 배려심도 없는 자신이 부끄럽기만 하다.
"큰 나무는 바람에 꺾이고 뿌리에 뽑히는 일이 잦지만 작은 나무는 쉽게 쓰러지지 않는 법이다. 작은 나무가 강헤서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바람을 막아주는 큰 나무와 같은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작은 나무 역시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또 다른 작은 나무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치다. 모진 바람에 가지가 꺾이고 쇠약해진 몸통을 가진 나무라 할지라도 그 나무가 베푼 지난 여름의 그늘을 잊어서야 되겠는가. 올여름에는 나의 주말농장에서 또다시 파프리카에서 피망이 달리더라도 나는 기다리지 않고 냉큼 따먹을 것이다."-(<삼백 리 성묫길>에서)백두현 수필집이다. 이 글은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이런 글로 마친다. 이 수필집에서 이 글이 남다르게 읽힌 또 다른 이유는 시어머니와의 지난 몇 년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한 번씩 어머니 집에 가서 보면 행주질을 하셨다는데 씽크대는 그리 깨끗하지 못했다. 그릇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의 야무지고 깔끔한 어머니는, 너무나 그러셔서 불편하기도 했던 어머니를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살림을 대충 대충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친구분들과 어디든 어울려 다니시면서 살림은 아무렇게나 하는 어머니가 달리 보였다. 아울러 휴일에 늦게까지 잠 좀 잘까 싶으면 새벽같이 오셔서 내 집의 냄비를 잔득 꺼내놓고 반질반질 닦아 놓거나, 퇴근해 돌아오면 대청소를 해놓아 마음 불편하게 했던 지난날들이 그다지 좋지 않게 떠오르기도 했다.
당신도 살림 대충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인데, 왜 그리 깔끔을 떨어 오죽했으면 멀리로 이사 갈 궁리까지 하게 했는지 다른 일로 감정 상했던 것들도 주억주억 떠오르기도 하고. 여하간 어머니의 대충 던져놓은 듯한 살림살이들을 꺼내 다시 씻고 그러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어머니로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몇 년 후인 지난해. 언제부턴가 예전과 달리 한나절 내내 책을 읽는 것이 힘들어지더니 조급만 읽어도 눈이 흐려지고 아팠다. 노안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 누진 다초점렌즈로 바꿨다. 적응을 해야 한다고 해서 주방 일을 하면서도 안경을 벗지 않았다. 그랬더니 훨씬 잘 보였다.
"어쩐지 엄마가 요즘 집안일을 대충 하더라니! 머리카락이 있는 것도 못보고. 그럼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동안 그랬던 거야?"딸의 이 한마디에 아차 싶었다. 그랬다. 어머니가 그동안 써오신 안경이 최근 들어 맞지 않았고 그 때문에 어머니의 살림살이가 엉망이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의지와 달리. 어머니의 안경을 바꿔 드린 후 예전처럼 다시 깔끔하게 살림을 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죄스러웠다. 그 날 이후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니 그새 어머니의 등이 더 굽어졌고 걸음이 많이 느려져 있었다. 책속 수필들은 이처럼 바쁜 일상 속에 놓치고 말거나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것들과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게 한다.
이 글을 쓰는 동안 한 달 전 목격한 일이 불현듯 떠오른다.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만 작동하는 그 옆 계단을 막 내려가려는 순간 에스컬레이터가 시작되는 아득히 먼 아래에서 어떤 사람이 뒹굴었다. 순간 두 사람이 잽싸게 튀어 나와 넘어진 그 사람을 부추겨 올라오고 있었다.
넘어진 사람은 할머니와 손자 정도로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넘어지는 것을 보는 순간 '튀어나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재빨리 달려와 도와준 두 사람은 훌쩍거리는 할머니와 어린 아이를 각각 끌어안고 올라오고 있었다.
짧은 치마와 구두 등 꽤나 멋을 부린, 이십대로 보이는 두 여자였다. 그래서 그들의 재빠른 행동이 더욱 신선했다. 힐을 신었음에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는 순간 달려와 위험에 처한 두 사람들 구해준 그 두 여자가 매우 감동스러웠다.
아마도 그 두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이기심 많은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을 생각하노라면 감동이 일렁이곤 한다.
우리의 일상 혹은 주변에는 이처럼 남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열고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감동들이 많다. 나아가 내 삶의 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과 아름다운 사람들이 말이다. 이 책 <삼백 리 성묫길>처럼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소재로 쓴 생활 수필집을 가끔 찾아 읽는 이유이기도 하다. 바쁜 일상에 삭막해졌다면 이런 생활수필집이 도움되리라.
덧붙이는 글 | <삼백 리 성묫길>(백두현 씀)ㅣ북나비ㅣ 2014-5-6ㅣ 1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