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골(강원도 갑천)입춘(8월 8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머지않아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은 계절을 이어갈 것이다. ⓒ 김민수
지난 8월 8일은 입추였습니다. 입추가 지난 지 일주일여 되었지만, 계속되는 폭염과 여름휴가 끝자락인지라 아직 가을이 실감나지는 않습니다.
복사열로 도심에서는 가을 기운을 느끼는 것이 언감생심이지만, 그래도 시골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 가을이 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래도 서늘한 기운이 돌고 밤 9시가 넘어가면 풀잎마다 이슬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8월 13일, 여름휴가의 끝자락에 강원도 갑천 하대리에 있는 물골을 찾았습니다. 그저 여름인가 했는데 청춘의 초록색 사이사이 가을에 피어나는 꽃들이 하나 둘 피어난 것을 보고서야, 입추가 벌써 일주일 전에 지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입추가 지나니 가을의 전령사가 찾아왔다

▲귀뚜라미 유충가을꽃 물봉선도 피어났고, 가을밤을 깊어지게 할 귀뚜라미유충도 꽃밭을 거닌다. ⓒ 김민수
가을밤이면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제격이지요. 여름을 제철로 살아가는 매미의 울음소리가 잦아질 무렵이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매미의 소리는 때론 소음처럼 들려오지만, 귀뚜라미의 소리는 여간해서는 소음이라기 보다는 마음을 잔잔하게 하는 매력을 가졌습니다.
물봉선의 줄기를 찾아온 귀뚜라미 유충, 가을의 전령사인 셈이지요.

▲달개비(닭의장풀)흔하지 않은 빛깔의 꽃을 피우는 달개비가 한창 피어나는 가을이다. ⓒ 김민수
달개비(닭의장풀)는 여름 내내 대나무 같은 줄기를 죽죽 뻗고는 마디마다 뿌리를 내립니다. 생명력이 강해서 뽑혀진 후에도 여간해서는 시들지 않고, 꺾여진 곳에서 뿌리가 나와 또다른 하나의 생명체가 됩니다. 그 끈질긴 삶에 대한 집념을 배웁니다.
꽃 색깔 중에서 파란색은 그리 흔한 색깔이 아니죠. 흔하지 않은 꽃임에도 흔하게 여겨지는 꽃, 가만가만 바라보면 신비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물론, 달개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겠지요.

▲익모초어머니에게 이로운 꽃이라하여 '익모초'라는 이름이 붙었다. 가을을 맞이하여 꽃이 한창 피어나고 있다. ⓒ 김민수
익모초는 '어머니에게 이로운 꽃'이라서 익모초입니다. 어머니에게만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좋은 꽃이지요.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쓴맛을 가진 꽃입니다.
한 예로 무더운 여름, 더위를 먹어 식욕을 상실했을 때 익모초즙을 먹으면 회복된다고 합니다. 쓴나물이 입맛을 돋우는 데 그만이라는데, 쓴나물보다도 더 쓴 익모초즙이야말로 밥도둑이 될 만도 하겠지요. 쓴나물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는 하지만, 아직 익모초즙을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질꽃가을꽃 이질꽃의 꽃술만 확대하여 담아보았다. 작은 꽃이라도 우주 한 송이를 피워내는 듯 신비스럽다. ⓒ 김민수
이질꽃도 하나둘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질꽃은 이름은 못생겼지만, 한방에서 이질(설사)을 다스릴 때 사용하는 귀한 우리네 들풀입니다. 한방에서 사용되는 들풀의 이름은 대체로 어렵기 마련이고, 본래의 이름과 다르기도 한데 '이질풀'은 그냥 이름 그대로 이질을 다스릴 때 사용되는 풀입니다.
아마도 이질 정도는 민간인들도 쉽게 다스릴 수 있게 하려는, 이름을 붙인 이의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동시에 전염병이므로 한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누구라도 쉽게 이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했겠지요.
이질꽃의 속내를 들여다 봅니다. 작은 꽃이지만 수술이 있고 암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꽃잎마다 곤충을 안내하는 보라색 길도 있습니다. 그 작은 꽃 안에 질서정연한 세계가 하나의 우주입니다.

▲설악초원예종이지만, 하얀빛깔의 꽃들이 남은 여름의 더위를 씻어준다. ⓒ 김민수
원예종이긴 하지만, 여름에 피기 시작하여 가을에 완연하게 피어나는 설악초입니다. 설악초가 무더기로 피어 있으면 하얀 눈이 쌓인 듯합니다. 그래서 이맘때 야생의 사위질빵과 설악초는 초록의 세상에 하얀 눈이 쌓인 듯하여 시각적으로 시원함을 선물해 줍니다.
어디서 구한 것인지, 씨앗이 날라온 것인지 물골 할머니의 집 주변에는 설악초가 무성합니다. 시골이다 보니 애써 정원을 가꾸지 않아도 갖가지 들꽃이 많은데도 꽃을 가꿉니다. 어쩌면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가라!'는 명령을 간직한 생명이기에 생명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들을 심고 가꾸는 것이겠지요.
시골마을 혹은 재개발지구 길목에서 유난히 많이 만나게 되는 설악초, 그의 고향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이름만으로는 설악산이 상상됩니다. 참으로 시원하고 깔끔한 꽃입니다.

▲며느리밥풀꽃보랏빛 며느리밥풀꽃이 하얀 쌀알을 입술에 두개 붙이고는 피어났다. ⓒ 김민수
제법 유명한 며느리밥풀꽃입니다. 꽃의 생김새를 알지 못해도 이름만큼은 알고, 꽃에 대한 전설도 아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보라색 통꽃 안에 새겨진 하얀 부분은 쌀알을 닮았고, 여기서 이런저런 꽃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지요.
그 어떤 것이든 이야기가 되고 노래가 되고 시가 되려면 천천히 자세히 바라봐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천히 바라보면 예쁘고 귀한 것임을 알 수 있겠지요.
제대로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악한 것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그것과 싸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빗물은 튕겨내지만 이슬은 머금다

▲벌개미취아침이슬에 촉촉하게 적은 벌개미취가 하루를 열어가고 있다. ⓒ 김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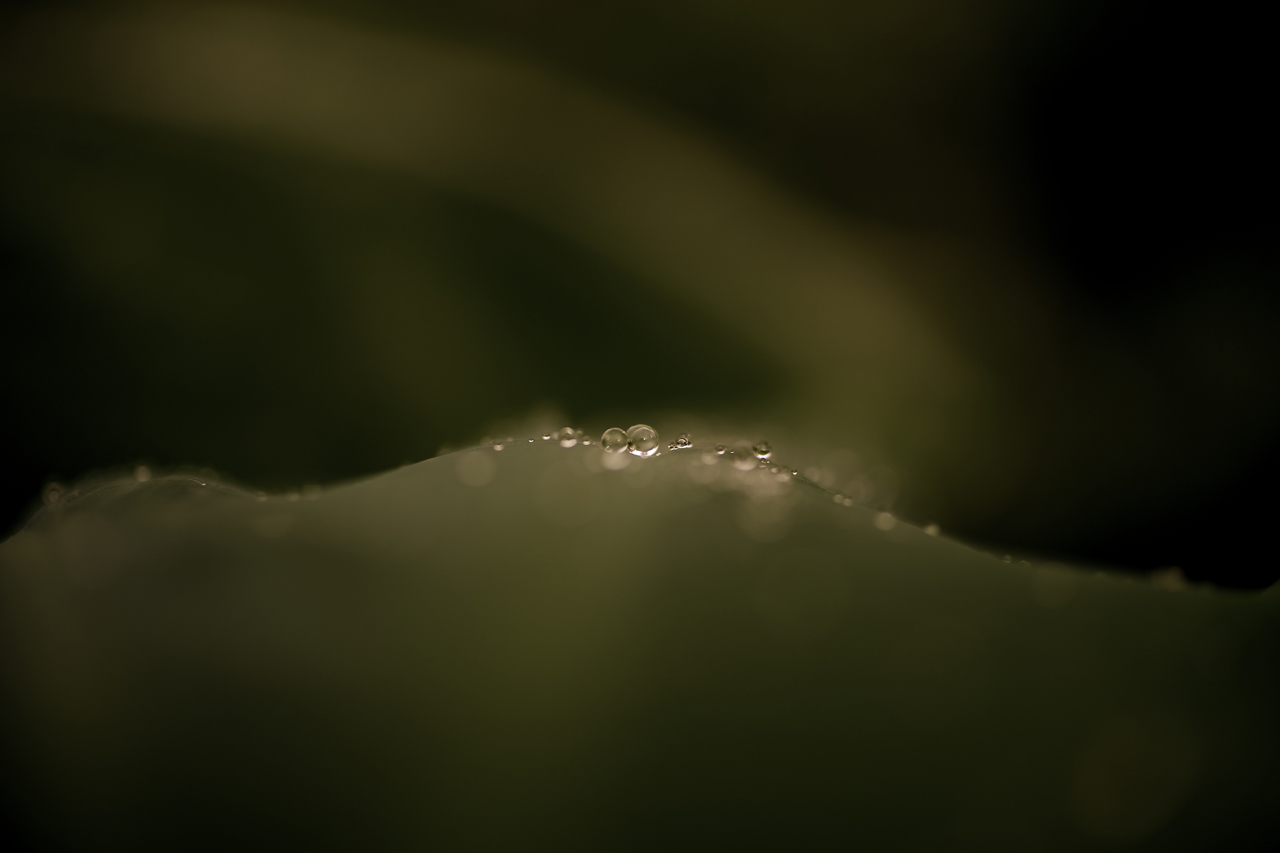
▲이슬토란잎에 맺힌 이슬, 가을은 이슬의 계절이기도 하다. 아침과 저녁의 기온차가 크고 바람이 없는 날, 이슬이 잘 맺힌다. ⓒ 김민수
벌개미취와 토란잎에 맺힌 이슬방울들, 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아침이니 선선한 기운이 남아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란잎은 연잎을 닮아서 빗물을 튕겨냅니다. 빗물만이 아니라 수분이 이파리에 머물지 못하지요.
그러나 이슬은 다릅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작은 수증기 알갱이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이슬을 만들면 토란잎도 어쩔 수 없이 이슬과 어우러집니다.
이슬은 여름에도 내리지만 깊은 숲에서나 만날 수 있고, 이슬이 지천인 계절은 역시 가을입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면 이슬 때문에 풀밭에 들어가기가 꺼려질 정도로 이슬이 많습니다. 이슬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해가 중천이니, 가을엔 신발과 바지를 다 버릴 각오를 하고 일을 합니다. 농촌에서 고무신이나 장화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신갈나무 열매(도토리)신갈나무 열매가 어느새 이렇게 잘 익었다. 산자락 개울가에 발을 담그며 놀다 물 속에 떨어져있는 신갈나무 열매를 주웠다. 비로소 가을임이 실감나는 날이었다. ⓒ 김민수
사실, 여름휴가 중이었기에 가을꽃들과 가을 흔적들에 '가을인가?'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런데 잘 익은 신갈나무 열매(도토리의 한 종류)를 주우면서 '벌써 가을이구나' 실감을 했습니다.
제가 주운 도토리는 땅에서 주운 것이 아니라 물에서 주운 것입니다. 계곡 물에서 올갱이(다슬기) 줍듯이 도토리를 주웠습니다. 그래서 도토리가 물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엔 왜 도토리가 물 속에 있나 싶었는데, 바람이 살랑 불어오니 신갈나무에서 후두둑 도토리가 떨어져 물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조금은 도토리 줍기가 덜 미안하더군요. 도토리를 양식으로 삼는 다람쥐가 물 속에 잠겨 있는 도토리까지 먹진 않을 테니까요. 하나 둘 줍다보니 우리 식구 도토리묵 한 번 쒀먹어도 될 만큼이 됩니다.
아람이 잘든 도토리나 밤을 보면 가을을 부정할 수 없는데, 밤가시는 아직 청년의 초록빛인데 신갈나무 열매는 어느새 익어 가을임을 알려줍니다. 가뭄과 폭염도 이젠 추억의 계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가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