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늦은 밤에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이었다. 중년 남성이 바로 내 앞자리에 앉았다. 감기에 걸렸는지 연신 재채기를 한다. 내가 내릴 때까지 5분 남짓한 시간 동안 거짓말 안 보태고 열 번도 넘게 "에취, 에취" 했다. 나는 슬그머니 손으로 코와 입을 막았다. 앞사람의 입과 코에서 나온 무언가가 내 콧속으로 들어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 글쎄다. 내 생각이 과대망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연구팀은 재채기하는 모습을 고속 촬영해 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재채기를 할 때 코와 입에서 크고 작은 입자들이 배출되는데, 작은 입자들은 큰 입자에 비해 200배 이상 멀리 날아간다는 것이다.
특히 5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의 작고 가벼운 물방울은 공중에 떠 있다가 에어컨이나 온풍기의 바람을 타고 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옮겨갈 수도 있다고 한다. 나는 그날 열 번 넘게 재채기하는 사람의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감기바이러스를 가득 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얼마나 많이 내 얼굴과 콧속 점막 곳곳에 닿았을지 굳이 상상하고 싶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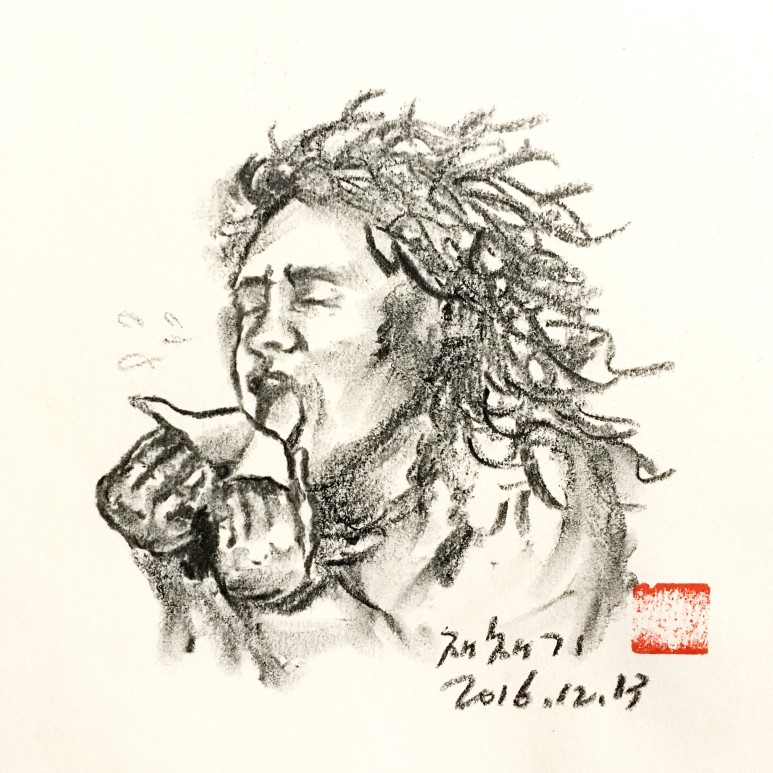
▲재채기 ⓒ 마법사
재채기는 먼지나 꽃가루 같은 이물질과 세균 따위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자동으로 일어나는 우리 몸의 방어기제다. 폐에 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기도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콧속에 들어간 작은 먼지가 코털과 점막을 건드리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된다. 히스타민은 콧물이 나오게 하는 동시에, 코에서 뇌로 가는 신경을 자극해 재채기할 준비태세를 갖추게 한다.
단 한 번의 재채기를 위해 눈, 코, 입, 뺨, 목구멍, 가슴의 근육들이 한꺼번에 적절히 움직여야 한다. 내겐 특이한 습관이 있다. 재채기가 나올락 말락 할 때 형광등이나 햇빛을 바라보는 것이다. 희한하게도 빛을 보면 재채기가 잘 나온다.
그 이유는 빛이 눈을 자극했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야 하는데, 신경 전달의 오류로 그만 콧구멍을 자극했다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콧구멍(눈)에 이물질(빛)이 들어왔으니 재채기로 내보내려는 것이다.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햇볕을 쬐어도 바로 재채기가 나온다. 이를 '광반사 재채기'라고 한다. 네 명 중 한 명은 유전적으로 이렇게 타고난다.
탈무드 격언에 '가난과 사랑과 재채기는 숨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겨우겨우 코를 달래가며 잠시 늦출 수는 있어도, 일단 했다 하면 소리든 행동이든 티가 나게 마련이다. 그만큼 격렬하다. 그도 그럴 것이 재채기를 할 때 뿜어져 나오는 공기의 속도는, 놀랍게도 시속 50~70킬로미터나 된다. 이에 비해 방귀의 속도는 고작 최대 3.6킬로미터에 불과하다. 눈물이 나오는 속도는 훨씬 느리다. 사람 몸에서 뭔가를 배출할 때 재채기보다 더 빠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
요란한 재채기이지만 그래도 낮밤은 가린다. 자면서 잠꼬대하는 사람은 있어도 재채기하는 사람은 없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재채기를 일으키는 신경세포도 함께 잠이 들어 비활성 상태가 된다. 그래서 콧속으로 먼지가 들어오더라도 재채기를 하지 않는다.
오늘 집에 오는 동안 버스 안에서 재채기를 두 번 했다. 감기 때문이다. 본의 아니게 감기바이러스를 사방에 퍼트리는 민폐를 끼쳤다. 작년부터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은 것을 뿌듯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올해를 며칠 안 남기고 골골거리게 돼 무척 억울하다. 주말마다 서울과 인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나가 몇 시간을 추위에 떤 탓이다.
아니다. 촛불집회를 탓하는 건 옳지 않다. 촛불을 들었다면 원인이 있을 터. 원인을 만든 그들 탓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니 감기는 오히려 훈장이다. 훈장은 자랑해야 한다. 이번 주말에도 이 자랑스러운 바이러스를 가득 안고 그들이 있는 곳을 향해 재채기를 한 백 번쯤 해주고 와야겠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