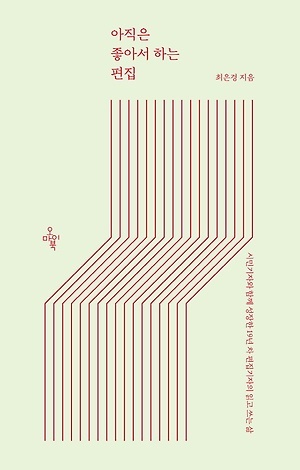
▲최은경 기자가 쓴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오마이북) ⓒ 오마이북
요즘 예능 방송에서는 연예인 출연자가 방송작가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거나, 작가가 직접 화면에 출연하기도 한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내가 방송국에서 일할 때는 작가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진행자가 말하는 걸 쓰는 작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십여 년이 흘러, 글쓰기 수업 강사의 권유로 <오마이뉴스>에 보낸 글이 기사가 됐을 때 내 이름 옆에 나란히 편집기자의 이름이 실렸다. 나는 똑같은 말을 하고 말았다. "시민기자가 쓴 글을 맡는 편집기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최은경 편집기자의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을 읽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보다 바쁘게 일하는 편집기자의 일상을 엿보았다. <오마이뉴스>의 대표 콘텐츠 '사는 이야기'는 평범한 시민기자의 투고로 만들어진다. 그들의 다양한 삶이 담긴 글을 세세히 들여다보고, 공감을 끌어내는 기사로 다듬는 이가 바로 편집기자다.
그는 글을 검토하고, 기사를 채택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보강 요청을 하고, 최선을 다해 제목을 짓는다. 편집기자는 시민기자의 글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협업'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좀 더 정확한 기사, 좀 더 깊이가 있는 기사, 좀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기사를 만들기 위해 '표현이 적합한지, 논리적인지, 근거가 정확한지' 긴장하며 함께 고민하고 있었다.
시민기자의 기사가 좋은 반응을 얻을 때 누구보다 기뻐한다. 하지만 어느 선까지 시민기자의 글을 수정, 보완해야 할지 늘 고심하고, 편집에 대한 자신의 진심이 오해받거나 전달되지 않을 때는 서운함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완급을 조절하며 여유가 생기고, 후배들을 독려하는 장면에서 '시민기자와 함께 성장한 19년 차 편집기자의 읽고 쓰는 삶'이란 부제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인터뷰 기사, 서평 기사, 여행 기사, 맛집 기사, 일기가 아닌 사는 이야기 기사를 쓰는 방법부터 글감을 잡아내는 '섬세함', 공감을 형성하는 '성찰하는 힘',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프로불편러의 시선'까지 시민기자뿐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되새겨 보아야 할 내용도 유익했다.
편집기자라는 '페이스메이커'의 존재
가장 인상적인 것은 최은경 기자가 끊임없이 시민기자와 소통하며 격려하는 모습이다. 나 또한 그의 격려로 지금까지 글을 쓸 수 있었다. 전업주부로 살다가 내 이름으로 쓴 글을 많은 사람이 읽는다는 기쁨과 열정이 잦아들어 잠시 멈칫거리고 있을 때 쪽지를 받았다.
"막 달리시다가 다시 멈춤?"
그는 내가 트렌드를 잘 알아 소재 발굴에 탁월하다고, 기사가 재밌으니 계속 쓰라고 격려해주었다. 이런 칭찬에 어떻게 키보드를 다시 두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시민기자들 역시 편집기자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기사를 쓴다는 데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끼고, 글쓰기에도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59쪽)
나 역시 <오마이뉴스>에서 첫 '청탁' 전화를 받았을 때를 잊지 못한다. 내 글쓰기가 신뢰를 얻은 것 같아 기뻤다. 자료조사도 더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터뷰도 하면서 기사를 썼다.
늘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다가, 청탁받은 주제로 생각지도 못한 글을 쓰면서 글쓰기가 한 단계 발전했다. 그리고 다른 시민기자들처럼 기사를 모아 책 <나이 들면 즐거운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를 출간했다. 내 글의 첫 독자는 물론 <오마이뉴스>의 편집기자였다.
요즘 달리기에 열심인 친구가 있다. 오십이 넘어 난생처음 달리기를 하는 걱정에, 달리기 코치가 말했다. "할 수 있는 만큼 달리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할 수 없는 달리기를 하게 됩니다." 글쓰기도 그렇지 않을까. 할 수 있는 만큼의 글을 쓰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글을 쓰게 되는 것을 시민기자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내가 어느 정도 글을 쓰고 있나 궁금한가? 그럼 당장 시민기자로 가입하고 <오마이뉴스>에 일단 글을 보내보시라. 마라톤에서 가장 앞서 달리며 바람을 맞고 속도를 조절해주다가, 뒤로 빠져주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같은 편집기자가 당신의 글을 반갑게 맞아줄 것이다. 무엇보다 <아직도 좋아서 하는 편집>을 쓴 최은경 편집기자의 다정한 소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