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걸'. 원고료 2000원에 채택되었다는 뜻이다. 최근 대여섯 개 글들이 잉걸이 되면서 남편은 나를 부를 때 '생걸'이라고 한다. 생나무나 다름없는 잉걸이라는 건데, 아마도 2000원의 가치를 두고 한 말이겠지만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불이 이글이글하게 핀 숯덩이'라는 잉걸과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은 나무'라는 생나무 글이 동급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
<오마이뉴스>에 두 번째 낸 글이 '생나무'가 되었을 때 너무도 창피했던 기억을 생각하면, 다시는 안 쓸 것만 같았다. 시간이 약인지 어느새 이제는 '경험'이 된 이야기지만. 이후, 여러 편의 기사를 올렸다. 이상한 건 똑같은 내가 썼는데 등급이 천차만별이었다는 것이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고민했다. 뉴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 잉걸이 거듭되면서 내 글쓰기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마음 한쪽에선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구체적인 피드백은 알 수 없으니 막연하기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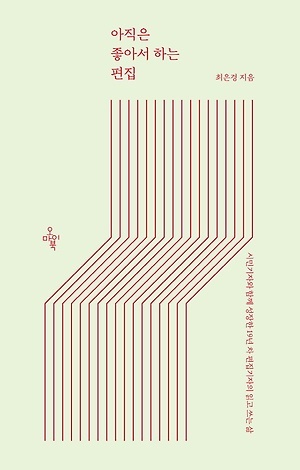
▲최은경 기자가 쓴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오마이북) ⓒ 오마이북
최근 <오마이뉴스> 편집기자가 쓴 <아직은 좋아서하는 편집>이라는 책을 읽었다. 계속되는 잉걸 채택으로 보완해야 하는 뭔가를 알고 싶은 시기에 손에 들어온 책이었다. 편집기자 입장에서의 어려움도 이해되었고 시민기자들이 들으면 도움이 될 내용들로 가득했다. 아직 새내기인 내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내 글이 진일보하기 위해 고민했던 나름의 답도 찾았다.
'내가 쓰고 싶어서 쓴 글을 독자들이 왜 읽어야 하는지, 독자들도 궁금해 할 만 한 내용인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
에세이 기사가 되려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글이 마음에 와 닿았다. 뉴스를 읽는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시의성, 감동, 재미 등을 기준으로 채택의 유무를 가린다고도 했다.
그러니까 내 '사는이야기'를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왜 들려주고 싶은지 말해야 한다는 거였다. 독자들의 궁금증에 대해 나는 알고 있는지도 물었다. 확신이 서질 않았다. 어쩌면 나는 글쓰기 자체의 즐거움에 많은 비중을 둔 건 아니었을까.
내가 쓰고 싶은 내용에 정체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슷한 삶의 이야기로 독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글이었는지. 통찰은 충분했는지. 다른 사람의 글을 읽기 위해서 내놓아야 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반성도 했다.
5단계로 나눈 시민기자의 등급에 나를 대입해 보았다. 첫 단계인 '입문' 단계는 꼭 집어 나를 지칭하는 듯한 문장도 있었다. '남의 글은 잘 읽지 않는다.' 부인할 수 없는 내 위치를 말해주었다. 글만이 아니라 기자의 등급도 잉걸인 셈이었다. 아마도 다른 기자들의 글을 많이 읽었다면 내 기사의 부족함을 훨씬 일찍 발견했을 것 같았다.
한 분야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건 너무도 분명한 일이기에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내놓은 책이 값져 보였다. 내 글쓰기도 그렇게 익어갔으면 좋겠다. 등급에 좌지우지 흔들리는 단계는 지나온 것 같다. 내 글을 읽고 편집해주는 공간에 글을 보내는 것 자체가 후원이고 응원이다.
'내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담겨있는 맛깔 나는 기사를 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