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시민기자. '내가 기자라니!' 처음엔 신기했고 당당했으며 가슴 벅찬 호칭이었습니다. 2006년, 호기심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회원가입하고 첫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기자야.' 그렇게 오마이뉴스를 잊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3년, 우리 반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저는 현직 교사입니다). '이 일은 혼자 알기 아까워, 기사로 한번 써볼까?' 용기내어 글을 써서 오마이뉴스에 송고했습니다. '이럴수가!' 채택되었습니다. 저는 이날을 잊지 못합니다. 기사로 채택되던 날, 모니터를 보며 흥분하고 학생들과 선생님들, 아는 지인분들께 자랑까지 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을 기사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쓴 기사가 '버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와! 버금이야!' 어찌나 신기하던지요. 이후로도 꾸준히 기사를 썼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고 방송국에서 학교로 취재도 왔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모두 신기해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쓴 기사가 세상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겠구나. 꾸준히 기사를 써야겠다.' 그리고 2013년 11월 6일, 수능 감독했던 일을 기사로 썼는데 제 생애 첫 '오름' 기사가 되었습니다. 오름 기사는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있는 기사입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주로 교육 분야 기사를 썼으나 점차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오마이뉴스 서평단에도 선발되어 서평을 꾸준히 쓰기도 했습니다. 돌아보건대 이때가 제 시민기자 활동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사 쓰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굳이 찾자면 제가 글쓰기에 소홀해진 탓입니다.
기사를 쓰며 글쓰기의 매력에 흠뻑 빠졌을 때 편집기자와 통화할 일도 생기고, 기사를 청탁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와 통화를 자주 했고 실제로 만나기도 했던 분이 바로 최은경 편집기자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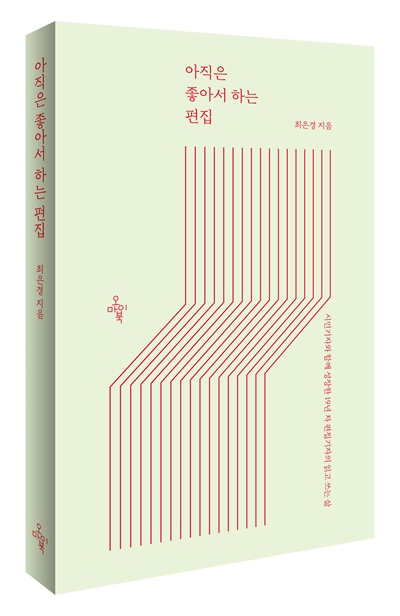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최은경 지음 ⓒ 오마이북
최은경 편집기자는 2003년부터 오마이뉴스에서 일하시며 <짬짬이 육아>,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를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일(?)로 만난 사이지만 저는 최은경 편집기자의 책을 모두 읽었고 서평도 썼습니다.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이후 2년 만에 나온 신간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을 읽으며 편집기자로서 최은경 작가의 삶과 고민을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편집기자의 생활과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시민기자들의 기사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프롤로그에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글을 읽고 편집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 제안서를 쓰거나 행사 자료집을 만들거나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것처럼 자신이 쓴 글을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업이나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쓴 글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사람들도 많다. 이들에게 개인의 일상을 어떻게 쓰면 독자의 공감을 얻는 좋은 글이 되는지, 에세이와 기사는 어떻게 다른 지 말해주고 싶었다. - 프롤로그 중
책을 다 읽은 지금, 최은경 작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위 내용이 이 책을 쓰신 목적이라면 성공하셨다고, 저도 이 책을 읽고 기사를 다시 써야겠다는 의자가 불타 올랐기 때문입니다.
얼핏보면 이 책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나 시민기자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쓰인 것으로 읽힙니다. 에세이와 기사의 차이, 기사가 가져야 할 덕목, 기사를 쓰는 기자의 기본 소양 등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 책을 통해 사람들이 기사뿐만 아니라 자신만이 쓸 수 있는 글쓰기에 도전해 보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녹록지 못한 현실 속에서 짜투리 시간을 내어 치열하게 글을 쓰는 시민기자들과 그들의 기사가 모여 책으로 나오고 그 글을 읽고 선한 영향력을 경험한 많은 이들의 사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오롯이 만난 분, 글쓰기를 하며 제 2의 인생을 접하게 된 분, 편집기자로서 좋은 기사를 처음 읽을 때의 감동이 전해져 책을 읽는 내내 저도 다시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이슈에 대한 주장성 기사는 특히 독자들의 반응이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나눠지면서 댓글 분위기가 뜨겁고, 기사 공유와 '좋아요' 횟수가 늘어난다. 그러다가 점점 더 여론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반응을 얻으며 독자들과 소통하는 그 짜릿한 경험과 희열 때문에 오늘도 시민기자들이 기사를 쓴다고 생각한다.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모른다. 그 기쁨을 느껴보고 싶다면,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 본문 중
무엇보다 글을 쓰면서 나 자신이 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글쓰기는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글쓰기 이전의 나와 글쓰기 이후의 나는 다를 수 밖에 없다. 현재는 과거의 모습을 통해 만들어지고, 미래는 현재의 모습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지 않나. 글도 마찬가지다. 씀으로써 현재의 나, 미래의 나가 모두 달라진다. 쓰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그러니 "잘 쓰지도 못하는 데 계속 써야 할 지 모르겠어요."라는 말에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 뿐이다. "그 이야기는 기자님만 쓸 수 있으니 계속 써보세요." 물론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 본문 중
아이들을 가르치다보면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또 얼마나 소홀한지도 자주 느낍니다. 저는 국어교사는 아니지만 아이들과 글 쓰는 수업을 합니다. 올해도 글쓰기 수업을 준비 중인데 마침 이 책을 잘 읽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은경 작가님은 편집기자지만 시민기자들 입장에서는 글 지도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글을 소중히 읽고 좋은 기사를 자신의 글처럼 알리려고 애쓰십니다. 시민기자와 소통이 잘 되고 기사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십니다.
기사를 그만 쓰려는 기자분께는 적당한 회유와 격려를 하며 글쓰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십니다. 글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글을 직접 쓰는 작가가 되셨습니다. 읽고 쓰면서 그만큼 시민기자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졌습니다.
교육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글을 잘 써야 한다. 많이, 자주 써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만 할 게 아니라 같이 해야 합니다. '선생님도 같이 쓰자. 같이 고민하자. 그리고 이 글을 우리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보자. 글 한편이 나를,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자"고 함께 할 때 배움은 자연스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은경 작가가 19년간 편집기자로 일하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들과 노하우가 적힌 책입니다. 230쪽의 얇은 책으로 두 시간 만에 다 읽으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간만에 최은경 작가님과 통화 했습니다.
"책 잘 읽었습니다. 19년 간의 일을 두 시간 만에 읽으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니 글을, 기사를 다시 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잘 읽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책을 보고 글을 써보고 싶어진다는 반응을 많이 듣네요. 여러 이유로 글쓰기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께 용기를 주려는 의도도 있었는데... 그렇게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글쓰기에 관련된 책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글쓰기, 기사 쓰기를 통해 세상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고 나의 글로 힘을 얻었다는 사람들의 감동적인 경험을 따뜻하게 소개한 책은 드뭅니다. 글쓰기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를 꿈꾸시는 분, 글쓰기를 지도하시는 분, 글을 잘 쓰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권합니다. 삶이 글이 될 때 내 일이 더 좋아지는 특별한 경험을 더 많은 분들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