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기사로 채택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편집기자인 나는 왜 그 이상의 내용을 시민기자에게 요구하는 걸까? 기사에 대한 내 의견이 시민기자 입장에서도 정말 필요했던 것일까? 내 판단이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할수록 자꾸 괴로워진다. 이런 진통이 나에게도, 시민기자에게도 자극이 되고 꼭 필요한 '성장통'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다. (44쪽, '듣기 불편한 말을 해야만 할 때' 중)
아주 가끔, 기사가 후루룩 써질 때가 있다. 오랫동안 손 안의 호두처럼 굴리던 이야기가 마침 그 호두 껍데기를 탁 깨 주는 경험을 만났을 때. 그땐 큰 고민 없이 글이 써지지만, 이런 일은 드물다. 반면 잘 안 풀리는 경우는 보통 둘 중 하나다. 하나는 오래 묵힌 감정이 경험 들여다보기를 방해할 때. 호두 껍데기가 너무 두꺼운 거다.
이때는 정으로 조금씩 쪼아내듯 일단 쓰고 본다. 그러다 '아무말'만 A4 7장이 나오기도 하고, 감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감이 썩은 감일 때도 많다. 다른 하나는 자료를 찾다가 논지가 달라졌을 때. 주장이 성립하기 어려워져서 심각한 고민에 빠진다. 처음부터 다시 쓸까? 아니면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기사를 포기할까?
다행히 이 과정에서 낙오된 기사는 아직 없다. 어떻게든 마무리해서 올리면 수정 방향을 제안해 주는 편집기자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쓰면서도 '썩은 감'을 느꼈던 글은 아니나 다를까 편집기자님들께 연락이 온다. 도입에 쓴 일화와 본론이 썩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시의성이 떨어졌을 때, 문체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을 때, 중언부언하며 글이 길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 공들여 쓴 글을 다루는 일이 녹록할 리 없기에 늘 궁금했다. 편집기자님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일해 오셨을까? <오마이뉴스> 최은경 편집기자가 동명의 연재기사를 묶어낸 책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에는 '시민기자와 함께 성장한 19년 차 편집기자의 읽고 쓰는 삶'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변화를 믿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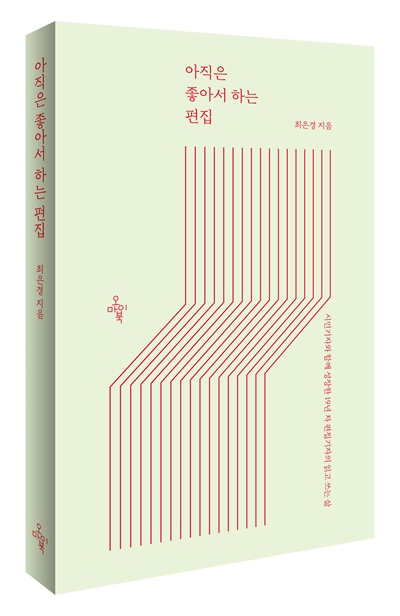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최은경 지음 ⓒ 오마이북
누군가에게 "나는 네 생각과 다르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다.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불편한 일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말을 건다는 것, 말을 한다는 것은 변화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아지길 바라서다. (50쪽, '왜 내 글을 채택하지 않았죠?' 중)
처음 전화로 수정 요청을 받았을 때는 부끄러웠다. 기자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내가 무슨…"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기사다운 기사를 쓰지 못한 내가 시민기자 자격이 없는 건 아닌가 싶었다. 그런데 이제는 전화를 받으면 오히려 든든해진다. 내 글을 좋은 기사로 만들려 애써주는 분들이 있다는 게 실감이 나고, 그 뜻이 말투 하나하나에서 전해지기 때문이다.
제안을 반영하고 나면 어김없이 글은 좋아져 있다. 상의하면서 생긴 요령은 다음 기사를 쓸 때 저절로 글에 써먹게 된다. 그렇게 용기가 생기니 다뤄보지 않은 소재와 형식에도 두루 도전할 수 있었다. 시민기자는 자기 생각을 둘러싼 껍데기를 깨고 글로 꺼내기에 바쁘지만, 시민기자가 '생각하고 쓰는 사람'으로서 한계를 깰 수 있게 껍데기를 두드려 주는 건 편집기자인 셈이다.
내가 생각하는 내 일의 의미가 언제나 하나로 고정되어 있던 것은 아니다. 처음부터 이 일의 의미를 따져가며 일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내 일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졌다. 성장의 기회도 되었다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돌아보건대 나는 그랬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 시시때때로 좋은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시민기자였다. (22쪽, '작은 이야기에서 삶을 배우다' 중)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은 기대하지 않는 만큼 마음이 편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일할 때 우리는 일에도, 관계에도 애정을 갖기 어렵다. 한 곳에서 19년이라니, 변덕이 심한 나로선 입이 떡 벌어지는 근속연수지만 책을 읽으니 그 비결을 어렴풋이 알겠다. 자신이 변화를 만든다고 믿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어디에 있든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고, 성장한다. 제목처럼 '아직은 좋아서'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이 책의 목소리는 참 인간적이다. 불안과 자책, 억울함과 자괴감, 자부심과 보람, 희열 등 많은 직업인이 협업 상황에서 느끼는 마음들을 곳곳에서 짐작할 수 있다. 부담 없는 문장으로 편안하게 풀어가는 이야기 속에 깃든 저자의 시선에 마음이 간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다. 그래서 이 책이 주는 감동은 담백하게 잘 스며든다.
나의 일상과 우리의 삶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매일 던져주는 '사는 이야기'는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글이다. 들릴 듯 말 듯 작게 들리고 보일락 말락 겨우 보이는 이야기다. (중략) 그런데도 나는 그 어떤 뉴스보다 이 작은 이야기에 마음이 쓰인다. 그 이야기를 남보다 더 잘 듣고 싶다. (23쪽, '작은 이야기에서 삶을 배우다' 중)
성장하고 싶은 마음
일하는 요령이 필요한 편집 담당자와 쓰는 요령이 필요한 시민기자들에게도 두루 도움이 될 책이다. 듣기 불편한 말 잘하기, 취재원 확인하기, 청탁 잘하기. 순간을 포착해 글감을 찾는 법, 인터뷰 기사와 서평을 쓸 때 알아야 할 것, 상처 주지 않는 글을 쓰기 위한 태도까지. 언론 및 집필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일잘러' 선배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 같다.
청탁을 잘하는 요령. "기사를 쓴 시민기자의 '뒤도 보고 옆도 봐야'" 하고 "그 글을 쓴 시민기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56쪽). 하지만 저자는 "시민기자들을 만나고 오면 없던 기운도 펄펄"(79쪽) 나는 사람이다. 이런 이가 건네는 관심이 단지 좋은 결과물이나 좋은 협업 관계만을 위한 것일 리 없다.
한 번의 좋은 경험은 반복을 부르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 더 이상 조직 안에서 나 혼자 속을 끓일 이유가 없었다. '왜 알아주지 않을까?'하던 마음이 이제는 '알아주든 말든'이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하고, 그 일을 즐기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시민기자들 속으로 들어가니 나도 좋고, 시민기자에게도 도움이 되었다. (80-81쪽, '나라는 사람의 쓸모' 중)
내가 1년 반 동안 계속 기사를 쓸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일과 사람에 '완전히 열려 있는' 마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 삶을 누군가 따뜻하게 지켜보고 응원한다는 느낌이 힘이 됐다. '알아주든 말든'이라는 진심은 통한다. 그래서 결국 누구든 모를 수가 없게 된다. 모든 일에 적용되는 진실일 거다.
갑자기 실감이 난다. 나도 사실은 시민기자라는 자부심으로 오늘이 더 뿌듯한 사람이라는 것이. 책의 부제를 따라 하면, 지금 내 삶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성장하는 2년 차 시민기자의 읽고 쓰는 삶'이다. 아직은 좋아서 하는 글쓰기다. '아직은 좋아서 하는 ○○'이라는, 이 부담 없이 끌리는 에너지가 많은 이들에게 스몄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