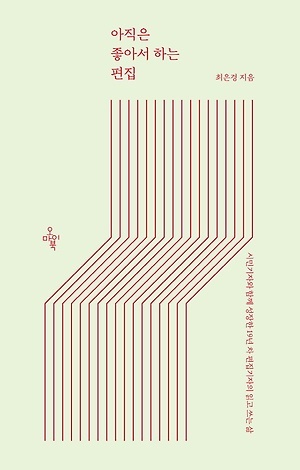
▲최은경 기자가 쓴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오마이북) ⓒ 오마이북
신문사 안을 들어가 볼 기회가 딱 한 번 있었다. 학교 다닐 때 친구의 소개로 경제신문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한 달 정도 회사마다 찾아다니며 신문에 실을 대차대조표 자료를 받아오는 일이었다.
그때 기억 속 신문사 사무실의 풍경은 일렬로 늘어선 책상들과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주변을 바쁘게 오고 가는 발들의 모습이었다. 아마도 우리나라 대표 경제지여서 대차대조표 업무를 하던 그 시기가 특히 더 혼잡했던 것 같다.
내가 시민기자로 인연을 맺은 <오마이뉴스> 기자실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오버랩되었다. 특히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단이 있어 전국에 있는 기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매달(月)이 내가 봤던 그 사무실처럼 분주하지 않을까 싶다.
내 상상과 비슷할지도 모를 <오마이뉴스> 편집기자실에서 시민기자와 함께 19년을 일하고 있는 최은경 작가는 책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을 냈다. 시민기자들이 기사를 잘 쓸 수 있도록, 편집기자들이 보다 나은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것(방법)을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책을 쓴 것 같다.
나도 좋은 기사 쓰는 법을 배우기 위해 '사는 이야기가 글이 될 때'를 읽으며 족집게 과외를 받는 학생처럼 열심히 메모했다. 특히 시민기자의 글이 어떻게 하나의 기사로 탄생하는지, 그 과정에서 편집기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시민기자제도가 있는 <오마이뉴스>만의 이야기였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요즘 사람들은 SNS을 많이 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일이 늘어나다 보니 글쓰기와 관련된 일에 관심이 많아진 듯하다. 시민기자만 해도 누적수가 15만 명이라고 한다. 이 책은 함께 일하는 편집기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도, 또 직업으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생생한 이야기다.
누구나 한 번쯤은 진로와 직업에 대해 고민해봤을 것이다. '그 과에 들어가 배우게 될 과목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면...' 또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하게 될 업무를 이 일을 하고 있는 선배로부터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비슷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집기자의 생활을 친절하게 알려 준다. 특히 책의 한 꼭지인 '편집기자의 하루'에서는 일과를 시간 단위로 나눠서 세세하게 적고 있어 시민기자인 나도 새롭게 이해하게 된 부분이 많았다.
먼저 겪은 선배만 해 줄 수 있는 격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은 이거다. 하고 싶어 선택한 편집일이라도 하다 보면 어렵고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 '그래, 그럼 앞으로 뭘 할 건데, 세상 일이 쉬운 게 어디 있어?'라는 자기검열의 말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와 괴로울 때(일을 하다 보면 3년, 5년, 10년 단위로 그만두고 싶다는 말이 있듯이) 느슨해진 마음을 조이고 계속 그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주는 조언을 던져준다. 이런 조언, 그 일을 오랫동안 하며 '아직도 좋아서 편집을 하는 선배'가 아니라면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왜 그런 리더들 멋지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심하고 있을 때 무작정 해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일깨워 주는 사람, '아, 이 상황에서 저런 멋진 말로 관점을 바꿔주는구나' 싶은 통찰력 있는 사람.
오늘도 이 일이 맞나 아닌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고민하는 후배에게도, 자기가 하는 일을 잘 선택한 게 맞나 싶은 이들에게도 그런 고민을 먼저 해 본 선배는 눈으로는 자기 책상 앞에 놓인 일을 계속 보면서 무심한 듯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해 준다.
"시민기자든 누구든 이기려고 하지 마. 편집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네 판단을 의심하지 마. 때로는 확신도 필요해. 판단이 좀 다르면 어때? 틀린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지.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