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을 '시를 읽지 않는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불리는 까닭, 시를 읽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나마 익숙함을 만들어 드리기 위하여 일주일에 한 편씩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자말] |
날개는 슬픔을 간지럽힌다
- 김미소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 다정하게 울었다
문고리가 없는 방,
거친 숨을 몰아쉬는 어깨를 들키지 않도록
문이 아닌 벽이라면 고립 아닌 은신
할머니 손에 자란 동생과
왜 차별받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진물이 흐를 때까지 붉은
얼굴을 손톱으로 박박 긁는다
이대로 방치되고 싶은데
구멍 사이를 훔쳐보는 검은 눈빛은 소름 같은 것
소름은 벌레를 바라보는 적의 같은 것
털어내 버리고 싶은 감정
벌레를 향해 살충제를 뿌리면 어둠
가장 깊고 따듯한 곳으로 추락하는 날개
(나도 같이 마셔 버렸나?)
입김 사이로 눈앞이 흐려지는
물안개의 꿈을 꾸고 있나
죽은 것들을 외면하는 생(生)
- <가장 희미해진 사람>, 걷는사람, 2022, 21쪽
시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시인을 떠올리면 우리는 먼저 정지용 시인이나 윤동주 시인을 떠올립니다.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입니다. 한용운 시인이나 김소월 시인의 모습을 떠올리기도 할 것입니다. 문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시인입니다. 이들처럼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시인이 있지만, 친일 행적이나 독재자에 대한 찬양으로 자신의 문학적 성과까지 오명에 빠트렸던 시인도 있습니다.
위에 소개한 앞선 시인들의 면모만을 봤을 때, 시인이 되는 것은 '특별한 일'임에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무(武)보다는 문(文)을 숭상했고, 문(文)의 꼭짓점에 시가 있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는 '상대적'입니다. 얻는 것이 있다면,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적이다라는 문장 안에는 짐작할 수도 없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시인의 시집을 열자마자 시 '가족'을 만납니다. 이 시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열일곱,동생들이 잠든 밤에 /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를 앉혀 두고 / 더는 함께 살 수 없다고 했다 // 스님이었던 아버지는 산속에 살고 / 엄마와 동생들과 마을에 / 사는 우리 식구들 / 함께 사는 게 아닌데'라는. 이 문장만으로도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면,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삶의 어두운 부분까지 공개하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삶의 날 모습은 나에게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고, 공개된 내용 때문에 생의 중요한 부분에서 발목 잡힐 수도 있습니다.
11월 중순 가족의 이야기가 공중파 방송을 탔습니다. KBS 휴먼다큐멘터리 <인간극장> '대추나무 사랑 열렸네'가 바로 저와 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위해 출연을 마음먹었지만, 제 아내나 아이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아주 짧은 등장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사생활을 보여주는 것에 적잖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인간극장을 찍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가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시인으로 공개적인 삶을 사는 저와 가족 구성원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졌기에,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내와 아이들이 출연하는 것에 대해선 충분한 토론으로 의견을 모았고 즐겁게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시인이 되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필연'과 만나게 됩니다. 삶을 꽁꽁 감추고 서정적인 이야기를 써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태도로는 오래 시를 쓰기 힘듭니다. 시란 결국 시인의 삶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독자의 공감은 시인의 삶이라는 울림통에서 떨림이 시작됩니다. (모든 시가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시인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감동의 깊이가 더 커지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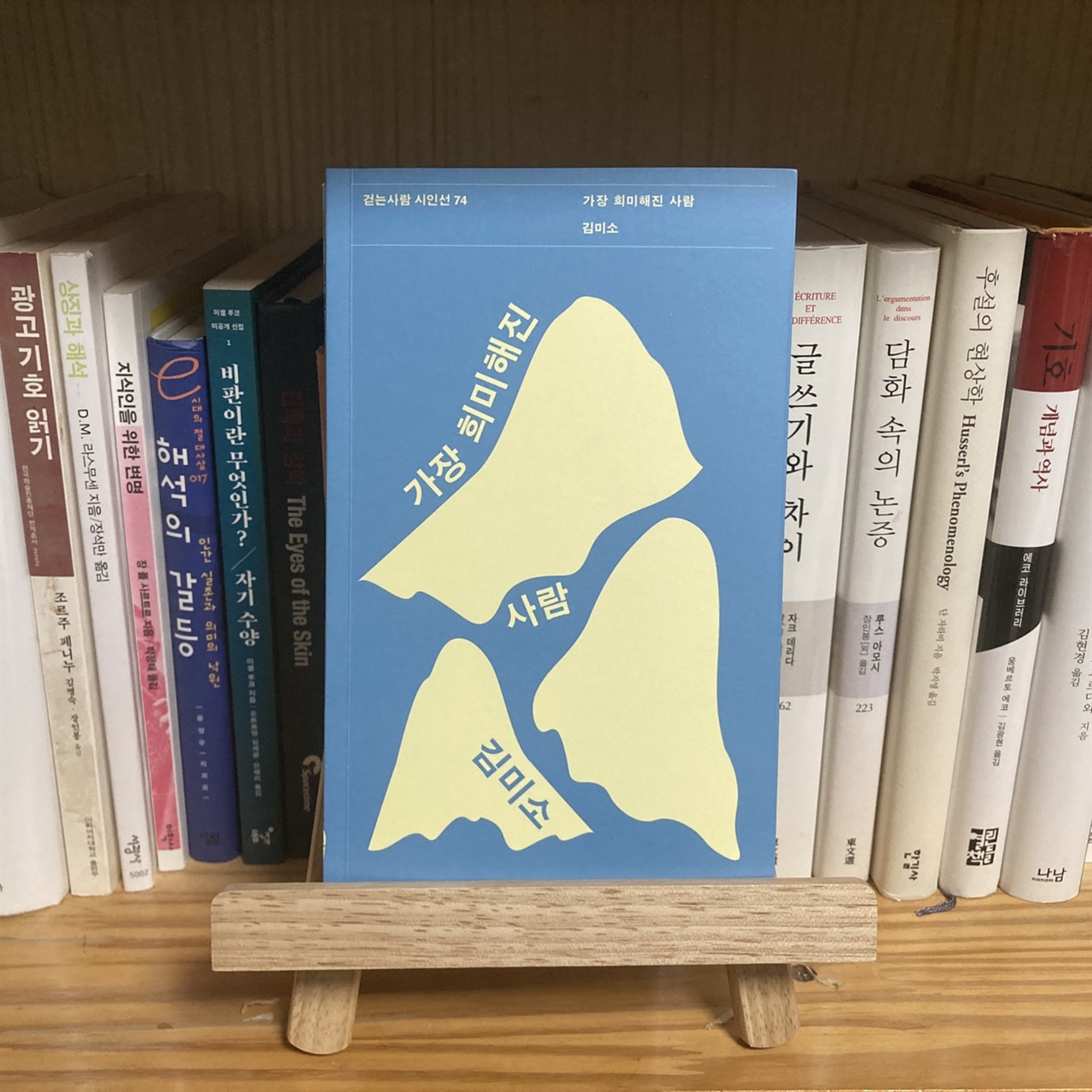
▲김미소 시인의 시집 ⓒ 걷는사람
이 시를 읽으며 첫 문장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 다정하게 울었다'부터 눈이 멈췄습니다. 왜 시인은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시의 전반부에 그의 삶의 부분이 묘사됩니다. '할머니 손에 자란 동생과 / 왜 차별받는지 이해하지 못해서...'라는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불우했던 가정환경이 시인에게 억지로라도 자신을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게 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정하게 운다'라고 다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다정한 울음이 없습니다. 울음은 그냥 울음일 뿐입니다.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될 수 없는 상황. 아무리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애를 써도 다정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처지'도 있습니다. 시 '사춘기'에서 화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괴물이라 놀리는 아이의 이름을 / 벽에 적고 빨간 줄을 긋는다 / 완벽한 거미집, 사람을 찌를 수 없으니까'
시인의 삶이란 어쩌면 '누구나 감추고 싶은 날 모습을 스스로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가장 아픈 옹이를 꺼내어 보이는 행위이기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누추한 모습을 시(詩)로 당당하게 내보일 수 있는 용기.
아이러니한 것은 이 누추한 것을 보일 수 있는 용기를 통해서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며, 이겨낼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시 '눈사람'에서 '그러나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시와 함께라면 힘낼 수 있습니다. 시인에게 유일한 힘이자 마지막 힘은 시(詩)입니다.
시 쓰는 주영헌 드림
김미소 시인은...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2019년 <시인수첩> 신인상(시)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덧붙이는 글 | 시와 산문은 오마이뉴스 연재 후, 네이버 블로그 <시를 읽는 아침>(blog.naver.com/yhjoo1)에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