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보그 가족의 밭농사> 푸른향기 출판사<사이보그 가족의 밭농사> ⓒ 푸른향기
<사이보그 가족의 밭농사> 책이 출간된 지 4달이 지나가고 있다. 출판사로부터 받은 선인세로 지인들에 식사를 대접하며 어깨가 으쓱해지는 시간도 누렸다(관련 기사:
오마이뉴스에 쓴 글 읽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https://omn.kr/22e9h).
물론 내 눈에만 그렇겠지만, 얼마나 빛이 나던지 서점을 훤히 밝히고 있는 내 책. 그걸 책방을 두 바퀴나 돌아보고서야 겨우 찾아낸 뒤 한참을 책 앞에 서있던 엄마, 그런 엄마를 바라보는 나, 참으로 감동적인 역사의 현장이 아닐 수 없었다. 이건 작가증정용 책을 택배로 받아 열었을 때, 박스 한가득 내 책들을 보며 '작가됨'을 실감했던 날보다 백만 배는 더 벅찼다.
출간 뒤 무엇이 달라졌을까? 크게 일상이 변한 건 없다. 자고 일어나니 대스타가 되었다? 그건 우리 집 고양이도 알 정도로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그런데 달라진 게 전혀 없다는 문장은... 그렇게 쓸 수는 없을 것 같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니 말이다.
태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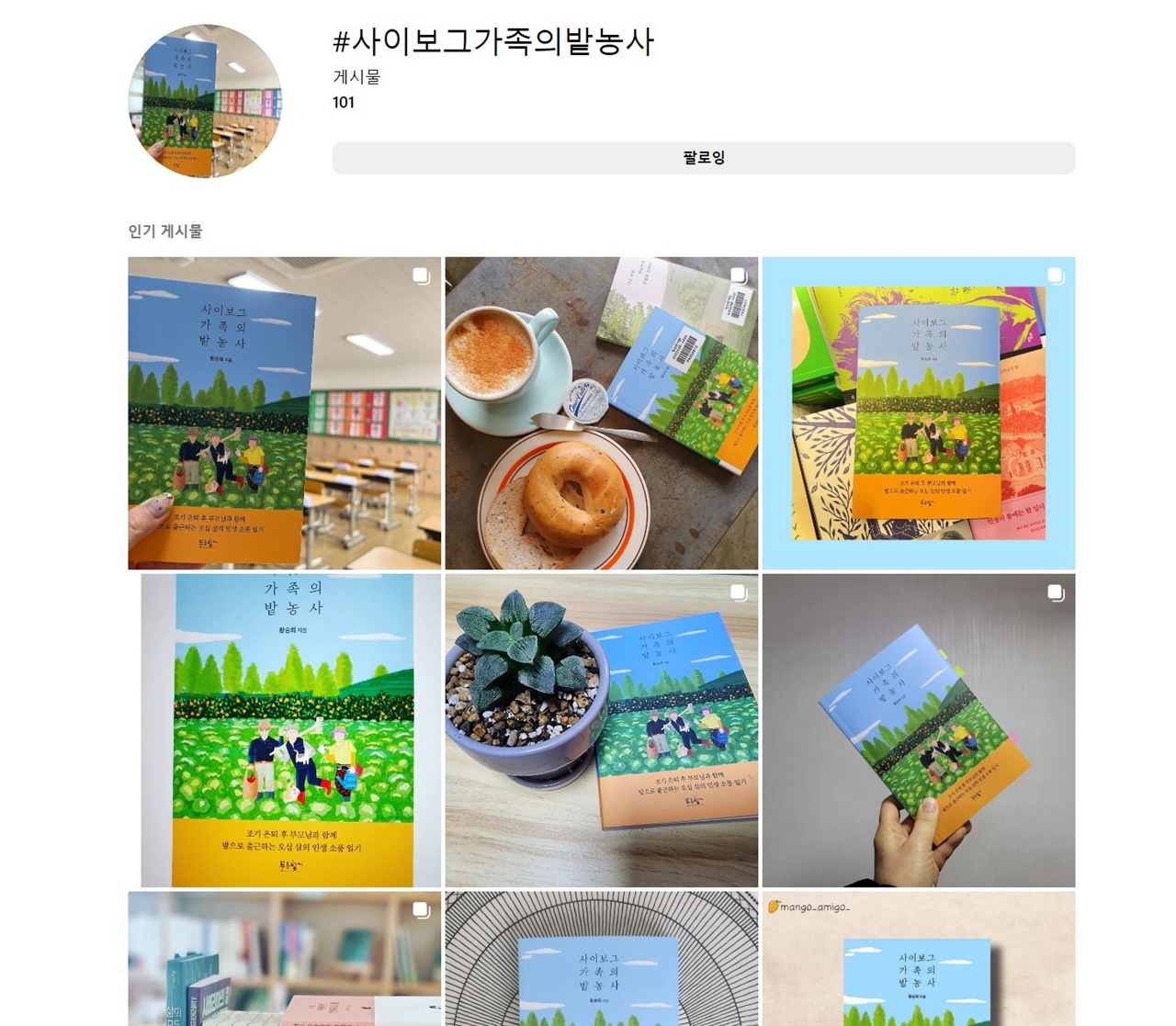
▲사이보그 가족의 밭농사하루의 시작은 책 검색부터 ⓒ 황승희
달라진 건 있다. 이전엔 별 신경 안 썼던 간단한 문법 파괴나 오타를 내고서, '나 글 쓰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될 듯...' 하며 다시 고쳐 쓰게 된다. 나는 몰랐던 사소한 상식이라던가, 누구나 아는 유명한 이슈를 모를 때, 누군가 농담처럼 건네는 '책 쓴 사람이 그걸 몰라요?'라는 반응에도 '그러게요. 몰랐네요'라는 태연함보다는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곤 한다.
포털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책 제목과 내 이름 세 글자, 황-승-희. 지구를 뚫고 솟구칠 만큼의 찬란함과 더불어 어떤 자잘하고 토실한 무게도 느껴진다고나 할까. 책 한 권에 무슨 왕관도 아니고 무게까지? 그래, 누군가는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다.
글쓰기를 시작할 때 그런 게 있었다. 내 글을 읽는 이와 내가 글을 쓴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끔 포장... 하는 것 말고 진짜 글 쓰는 사람은 응당 좋은 사람이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가짐 말이다.
소위 글 쓰는 사람이라 다르다는 칭찬 혹은 편견, 나아가 책까지 냈다는 사람이 그러면 쓰나라는 성직자 정도의 잣대를 들이대는 시선들. 이전엔 간혹 나도 했을 법한 생각들, 나라고 별수 있나.
십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글쓰기 전에 독서모임 활동이 떠오른다. 독서모임을 시작할 당시 두 번 정도 크게 놀란 기억이 있다. 첫째로는 회원들의 어마어마한 독서량에 놀랐고, 그 다음은 독서로 획득한 지식과 그 사람이 지닌 교양의 양과 질은 결코 비례하지는 않다는 사실에 또 놀랐다. 그리곤 속으로 잠깐 코웃음 쳤었다. 사실 그럴 게 뭐람? 아니, 책 낸 사람은 사람 아닌가?
어쨌든 본질은 글을 쓰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같이 들리지만, 이만큼 만고불변의 아름다운 진리인 표현은 없지 싶다. 글을 쓰고 책까지 나오다 보니, 막 훌륭한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실제로 착한 사람이 돼야겠다는 마음이 깊은 곳에서 피어올라오는 게 있긴 하다.
어쩌면 웃기게도, 이 또한 글 쓴다는 사람의 비대한 자의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한다.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산다 쳐. 그런데 과거는 어쩔 건가? 소환이 두려운 지질했던 선택들, 반듯하지 못했던 처사들... 있지, 왜 없겠어. 그래서였나?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처럼, '좋아요' 댓글에 나의 그런 흑역사를 다 아는 지인이 내 뭔가를 폭로한 대댓글을 내가 마주하고야 마는, 그런 몸서리치는 상상을 혼자서 가끔씩 한다.
이래서 죄 짓고는 못살고 도둑놈 제 발자국에 놀란다고 하나보다. 남들은 진심으로 관심 없을 텐데 말이다. 설마 그 정도로 내 책이 유명해질까 봐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K-김칫국 아닌가 싶다.
독자와의 사이버 소통
출간 후 새로운 글을 못 쓰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서평에 댓글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작업도 내게는 글쓰기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했으니 또 하나의 글쓰기라 해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후기를 쓴 분들의 글솜씨들이 너무 훌륭한 탓에, 나 또한 그저 '감사하다'는 단문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긴 댓글을 써야 했기 때문이다.
후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 나의 캐릭터와 문체를 완전히 분석해, 나보다 더 정확하게 나를 진단하는 서평이 있다. 책의 주제와 요약글은 마치 내가 쓴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 책을 읽으며 작가를 파악하게 되듯, 서평 내에 꼽은 문장을 보면 읽은 이의 성향이나 경험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가 있었다. 후기 한 문장 한 문장에 대해 댓글을 달며 답변하다 보니 마치 그 독자와 대화하는 기분도 들었다. 나름 사이버로 소통한 셈이다.
책에 대한 한 줄 평들을 옮겨 모아 적어놓았고, 서평마다 꼽은 문장들을 취합하여 랭킹을 매기고도 있다. 그래, 내가 이런 문장을 썼었다니 하며 나를 대견해하는 중이다. 다음이 궁금하다거나 나의 이야기에 위로와 힐링이 되었다는 후기에 혼자 우쭐대는 요즘의 밤이다.

▲마늘 심기 하는 같은 작업에 다른 자세. 왼쪽 엄마는 농사용 엉덩이 방석, 오른쪽 아빠는 쪼그려앉기. <사이보그 가족의 밭농사>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다. ⓒ 황승희
동시에, <사이보그 가족의 밭농사>는 아마 내 역량을 넘어선 책이란 생각을 한다. 아마 앞으로는 이 책 보다 더 좋게는 못 쓸 것 같다는 어떤 예감도 든다. 마침 배회하던 우주의 한 은혜로움이 책을 쓰던 그때 우연히 나한테 쏟아졌으리라. 그러니 글솜씨가 늘 리가 있나. 또 얼마큼을 많이 써야 글이 늘까. 어쩌면 그래서 지금 새 글을 한 문장도 못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시 마음가짐을 고쳐먹는다. 글 좀 안 써지면 어때? 글 좀 안 쓰면 또 어때? 이 책 한 권이 시작일지 또는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글은 계속 쓸 생각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스트레스는 받지 않으려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개인 브런치와 블로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