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는이야기 담당 편집기자로 일하며 더 좋은 제목이 없을까 매일 고민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더 돋보이게 하고, 글 쓰는 사람들이 편집기자의 도움 없이도 '죽이는 제목'을 뽑을 수 있도록 사심 담아 쓰는 본격 제목 에세이. [편집자말] |

▲<고요한 우연> <우리의 정원> <독고솜에게 반하면> <완벽이 온다> ⓒ 문학동네 사계절 창비
<고요한 우연> <우리의 정원> <독고솜에게 반하면> <완벽이 온다>는 최근 출간한 청소년 소설책 제목이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까? 이 제목의 공통점은? 그건 바로바로, 책 속 인물의 이름이 제목에 들어있다는 거다. 고요가 그렇고, 우연도 그렇다. 정원이도 독고솜도 완벽이도 책 속 등장인물이다.
이 중에서도 '고요한 우연'과 '우리의 정원'은 독자를 절묘하게 속인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편집자님 웃음소리 들리는 것 같고요). 고요, 우연, 정원은 각 소설을 끌고 나가는 주인공들의 이름이다.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은 다르겠지.
한번은 우연인데 우연이 반복되면 '뭔가 있다'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출판계에 묻고 싶다. 제목에 이름 넣으면 책이 좀 더 팔립니까? 내가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것은 나 역시 제목에 이름을 넣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유명인의 이름
정치 기사 제목은 정치인의 이름과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스타일이 많다. 가령 이재명 "______", 윤석열 "_____" 이런 류의 기사 제목을 아마 질리도록 봤을 거다. 선거철에는 더 많다. 때문에 정치 기사 워딩 제목이 지겹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 기사와는 상관없는 사는이야기나 문화, 책, 여행 글을 편집하는 나도 더러 이름을 붙여 제목을 쓴다.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은 방송인,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들. 슈퍼스타 이효리(언제적 이효리냐 싶은 이들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슈퍼스타다)는 시청률만 보장 하는 게 아니었다. 제목에 이효리를 넣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는 걸 경험치로 알게 되었다(물론 글 안에 이효리 관련 언급이 있을 경우에 그렇다, 없는 내용을 제목에 붙이진 않는다).
"불타오르지 않는다"는 이효리, 너무X100 공감했다
이효리가 증명한 개들의 능력, 이거 알면 못 먹습니다
연예인 이름 석 자가 들어가면 뭔가 분위기가 달랐다. 이슈가 될 때는 더 그렇다. 화제가 되는 방송이나 뉴스에 오른 유명인의 이름을 제목에 넣어주면 독자들은 반응했다.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있나?' 궁금한 마음에 한 번이라도 더 클릭해 보게 된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보자면, 마약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와 가수가 그렇다. 사람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인물 이름을 제목에 넣는, 뉴스 제목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스타일이다. 연예인뿐만이 아니다. 몇 년 전 촛불집회가 한창이었던 무렵에는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인 1위 앵커 손석희를 제목에 넣어도 조회수가 꽤 높았다.
당시 그의 이름을 제목에 넣을 때마다 나는 혼잣말로 말했다. 속으로만 소심하게 "또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예상대로 조회수가 잘 나온 날이면 또 인사했다. "덕분에 조회수가 꽤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했다'는 그의 뉴스 클로징 멘트처럼 나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제목에 썼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들릴 리 없는 말을 미안함과 감사함을 담아서 했더랬다. 감사한 마음이야 당연히 이름 석 자가 조회수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었고, 미안한 마음이 든 것은 자신의 이름이 뉴스 제목으로 자꾸 거론되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 좋기만 할까 싶어서였다.
방송국 사람들, 기자들 생리야 워낙 많이 아시는 분들이니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이해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다) 좋은 일로 자꾸 불리는 것도 쑥스럽고, 안 좋은 일로 불리는 것도 스트레스일 것 같았다. 그저 방송인이라는 이유로 말이다.
물론 아무 데다 이효리나 손석희를 넣은 것은 아니었다. 너무 많이 쓰면 독이 되기에 꼭 필요할 때만, 본문에 내용이 있을 때만 썼다. 상관도 없는 글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다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꽤 억울할 일일 테니 조심하려고 애썼다.
일반인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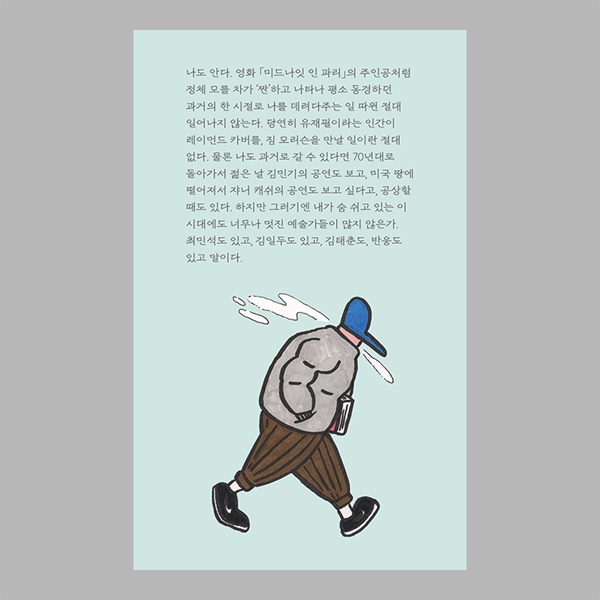
▲<책방과 유재필> ⓒ 오혜
가끔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이름을 제목에 넣은 글을 발견할 때가 있다. '그게 읽히나?' '이게 읽힐까?' 의심했다. 편집기자라서 의심하는 건가 싶었는데 다른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다. <책방과 유재필>을 쓴 저자 유재필씨 이야기다. 그는 '참 제목하고는,'이라며 서문을 열었다. '몇 년 만의 신간인데 어쩌자고 제목을 이렇게 지었나'라고. 그의 속마음을 더 들어보자.
책 제목을 고민하면서 아내에게 "이번 책은 <책방과 유재필>로 생각하고 있어"라고 말했더니, "책 팔 생각은 없구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낄낄낄.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아내라서 가능한 그런 한 방. 언젠가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 사람 이름을 누가 안다고 제목에 넣어? 이런 이름 넣어서 몇 명이나 보겠어"라고. 독자들이 처음 듣는, 생판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제목에 넣으면 관심을 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그저 우연이겠지만 구글 알고리즘이 이름을 넣은 제목에 반응하면서부터는 생각이 좀 달라졌다.
3000평의 정원을 가진 여자 최미숙
재즈 싱잉 좀 하는 60대 언니, 박영순
일반인의 이름이 들어간 제목, 이게 읽히네? 싶어서 확인해 보면 구글에서 픽한 기사였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이름을 좋아하나? 한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선배가 제목을 '오! 마이 캡틴 양영아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바꿔둔 거다. 솔직히 '이 사람 이름을 누가 안다고 제목에 이름을 넣지?'라고 생각했다.
나라면 이름을 넣지 않았을 것 같았다. 게다가 시의성이 있는 제목도 아니었다. 스승의 날 즈음에 들어온 글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왜 선배는 이름을 넣었을까.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 캡틴, 마이 캡틴'으로 끝난다. 아마도 이 문장에서 제목을 착안했을 거다.
'오! 캡틴, 마이 캡틴'에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떠올릴 독자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겠지. 그런 독자라면 글쓴이와 같은 시절을 보낸 동년배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름보다 '오! 캡틴, 마이 캡틴'에서 연상되는 영화, 그 속에서의 참 스승이 떠오를 거라는 걸 노린 제목일지도 모르겠다.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이라 그랬을까?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포털에서 읽히더라. 설마 양영아 선생님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공유한 결과는 아니...겠지?
눈길이 가는 이름

▲<조인성을 좋아하세요> 포스터 ⓒ 정가영
제목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무엇이 그렇지 않을 때도 생기더라는 걸 알게된 경험이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이름도 있는 것 같다. 학창 시절 선생님, 직장에서의 사수, '처음'과 관련된 시절 인연 등등. 나도 그렇다. <조인성을 좋아하세요> 같은 제목은 도저히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내가 유일하게 가장 오래 좋아하는 배우다).
배우 배두나의 초기 작품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가 생각나는 이 영화는 2018년 12회 대단한 단편영화제에서 관객상, 작품상, 관객상 그리고 제목상을 수상한 정가영 감독(이자 주연)의 러닝타임 19분짜리 드라마다.
조인성을 캐스팅하고 싶지만 아직 시나리오는 없는 감독의 이야기. 조인성 이야긴가 싶지만, 조인성의 이름을 팔아(?) '되든 안 되는 시도해 보는 게 중요한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드라마. 결국 조인성과 영화는 찍지 못했지만, 조인성과 전화 통화라도 해본 감독이 된 정가영의 이야기다.
'감독님이 찢었다'는 평가를 듣는데 제목 덕을 조금은 봤을 거라는 데 500원 건다. 제목상 수상은 당연한 결과인 듯. 뒤늦게마나 감독의 제목상 수상을 축하한다. 다음 영화 제목도 기대하겠다... 라고 마지막 문장을 쓰고 혹시나 싶어 찾아봤는데, 어머나.
이미 감독은 <너와 극장에서>(2018), <밤치기>(2018), <하트>(2020), <연애 빠진 로맨스>(2021), <25년 사귄 커플>(2021)까지 차곡차곡 필모그래피를 쌓아가고 있었다. <연애 빠진 로맨스>는 무려 손석구가 출연... 그와중에 영화 <25년 사귄 커플>은 왜 자꾸만 궁금해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