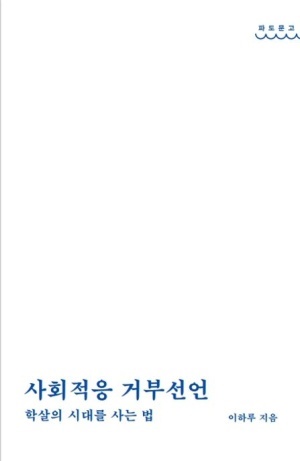
▲이하루 <사회적응 거부 선언> 표지 ⓒ 온다프레스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 우연히 돼지를 빼곡히 태운 운송 트럭을 마주한 적이 있다. 먼지인지 검불인지 모를 지저분한 무언가가 몸 여기저기에 묻은 채 아무렇게나 함부로 흔들리는 돼지들을 보며, 안타깝다고, 저기서 얼마나 무서울까 생각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그 뿐이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이내 잊었다.
정육점이나 마트에 가면 언제나 살 수 있는 깔끔하게 포장된 고기를 사와 맛있게 먹었고, 푸른 초원 위에서 유유자적 풀을 뜯고 있는 젖소 그림이 그려진 우유를 산 뒤 고소한 우유를 마셨다. 이 맛있는 '음식'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입으로 들어오게 됐는지를 깊이 생각해본 적이, 내 경우엔 거의 없었다.
예상치 못하게 마주한 동물 착취 시스템
굳이 알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어서 외면해왔던 실상들을, 한 책에서 마주하게 됐다. 이하루 작가의 <사회적응 거부 선언: 학살의 시대를 사는 법>이란 책이었다. 박정미 작가의 <0원으로 사는 삶>이란 책에 뒤이어 읽은 책이었다.
두 책 모두 히치하이킹으로 전 세계를 떠도는 이야기지만, '여행'하면 떠올릴 수 있는 낭만 같은 건 없다. 오히려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들을 들여다보고 깨닫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게 주이며, 길 위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운다는 점은 두 저자 모두 같았다.
하지만 이 작가의 <사회적응 거부 선언>이란 책은 의외로 동물권 비중이 많은 책이었다. 나는 예상치 못하게 책 속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동물 착취 시스템과 마주하게 됐다.
저자에 따르면, 돼지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트럭 안에서 공포에 못 이겨 차체를 물어뜯는 행동을 했다. 알을 낳지 못하고 육계가 아닌 이상 고기로서의 가치도 낮은 수컷 병아리들은 분쇄기에 그대로 갈려버렸다.
이 같은 공장식 축산에 의한 실상을 눈앞에서 생생히 목격한 저자는 '왜 음식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입맛을 당기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속을 게워내고 싶은 냄새가 풍겨 나오며, 나는 어떻게 그걸 여태껏 맡아볼 필요도, 기회도 없이 살아올 수 있었던 걸까.' 의문을 드러낸다. 날로 늘어가는 육류 소비 때문에 엄청난 양의 피와 분뇨, 축산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도 일어나고 있음을 전했다.
이 같은 내용들을 나는 글자로 읽는 것만으로도 불편해 몇 번이고 책을 덮었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관련 글이나 뉴스를 찾아보곤 했는데, 비용과 관리 등의 이유로 좁은 공간에서 키워지는 동물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서로를 해치는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병아리는 스트레스를 받아 서로를 쪼아대고, 돼지들 역시 서로를 물어뜯는다고 했다. 공장식 축산업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병아리 부리 끝을 자르고, 돼지 꼬리를 자르고 이빨을 뺐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설사 소, 돼지, 닭 등을 하나의 생명이 아닌 '음식'으로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철저히 인간중심적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공장식 축산에 의해 생산된 음식들이 과연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일까란 의문을 갖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또 상품을 보다 맛있게 꾸미며, 육식을 유도하는 수많은 광고를 떠올리게도 했다.
영상기록활동가이기도 한 저자가 만든, '파랑새 방랑 학교'란 영상 속 어느 남자의 말이 내내 귓가에 남아 맴돌았다.
'그들(공장식 거대 축산 기업)은 우리(소비자)에게 관심이 없다. 돈에 관심이 있다.'
임신을 해야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젖소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우유였다.
우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뭘까. 적어도 나에겐 푸른 초원 위에서 풀을 뜯는 소의 모습이다. 또는 멜빵바지를 입은 목장 주인이 젖소의 젖을 짜는 모습. 그런 평화로운 이미지였다.
무엇보다도, 나는 젖소에게서는 당연히 매일(!) 우유가 나오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건 나의 크나큰 오해이자 무지였다. 그동안 공장식 축산에 의해 길러지는 동물들이 윤리적이기 어려운 과정에서 자라고 도축된다는 사실들은, 힘들어서 외면했을 뿐 분명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유에 대해서는 별 인식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책을 읽고서 우유는 젖소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나온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
출산을 한 젖소에게서 자신의 새끼에게 먹일 우유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우유는 새끼가 아닌 인간에게로 간다. 더욱이 젖소는 인간에게 빼앗길 우유를 '생산'해내기 위해 1년, 2년, 3년... 한평생 임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인간이 행하는 강제적 방법에 의해서 말이다(물론 업계 일부에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환경 등 동물복지 축산을 추구하고, 이를 인증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도도 있다고 한다).

▲젖소(자료사진) ⓒ 픽사베이
책에서 저자는 그럼에도 인공수정이란 표현은 '강제 임신'이란 말을 순화한 표현이며 폭력을 은폐하는 표현이라 일침한다. 책에 나오는, 어떻게 '인공수정' 되는지의 상황 묘사는 끔찍했다. 젖소를 강제로 임신시키고, 출산 뒤 몇 주만에 다시 또 임신 뒤 출산.
아이를 출산한 산모들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 시시때때로 유축을 하며 무기력함이랄까, 뭔가 말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을 느낀다. 아이에게 직접 모유를 줄 때의 행복한 기분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젖소가 된 느낌'이란 표현을 쓰곤 한다. 나 역시 과거에 그랬다.
그런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난 젖소가 된 느낌을 전혀 모르는 거였다.
읽다 덮기를 반복하느라 책 한 권을 겨우 읽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마음 속 복잡한 감정은 그렇지 않았다. 이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사소하더라도, 할 수 있는 만큼의 행동부터 하는 것 말곤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 당장 고기를 끊지는 못할 지라도 저렴한 가격인 덕분에 종종 사곤 했던 공장식 축산에 의한 냉동고기 같은 건 이제 그만 사야겠다 싶다.
소비자들이 싸고 맛있는 제품을 찾으면 찾을수록, 공장식 축산업을 비롯한 거대 기업 역시도 단가를 낮추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게 꼭 동물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미안해지거나 누군가가 피해를 입거나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 생산된 것들은 소비자에게도 좋을 수 없을 것이다.
다 읽은 책을 덮으려는 순간, 책 뒷날개에 적힌 출판사 소개가 눈길을 끌었다. 거기엔 이런 문구가 있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책이 결국에는 우리를 살릴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위 글은 글쓴이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tick11)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