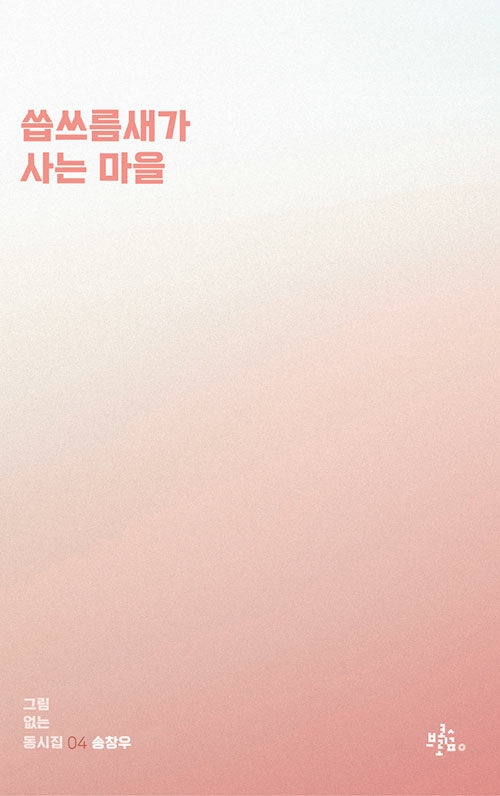
▲송창우 시인 첫 동시집 <씁스름새가 사는 마을>(브로콜리숲, 2024년) 표지 ⓒ 안준철
송창우 시인의 첫 번째 동시집 <씁쓰름새가 사는 마을>(브로콜리숲, 2024년) 표지에는 '그림 없는 동시집'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다. 그림을 넣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오롯이 동시에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려는 뜻일 수도 있겠다. 그림이 없다 보니 그림이 있는 동시집에 비해 한눈에 보기에도 얇고 가볍다. 하지만 거기에 담긴 것도 그럴까?
물을 많이 받아놓으면 발전소다
태양을 뜨겁게 받으면 발전소다
바람을 세게 받으면 발전소다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발전소다
-<발전소> 전문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가 이 시를 읽으면 어떤 기분일까? 크나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 상처를 받은 것이 오히려 상을 받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상처를 많이 받으면 발전소다"라지 않는가. 그 발전소 이름은 '사랑 발전소'가 맞춤하겠다. 송창우 시인의 동시는 동시라는 장르를 감안하더라도 짧은 편이다. 그의 시를 읽으면 시를 정말 길게 쓸 이유가 없구나, 싶어진다. 다음 시를 보자.
비가 오면
네 손을 잡아주마
바람이 불어도
놓지 않으마
눈이 와도
네 손을 잡아주마
-<우산> 전문
처음에 읽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두세 번 연거푸 읽으니 대단한 시다. 나는 하루 세 번 정도 산책을 한다.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을 들고 산책을 나간다. 그때마다 우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우산이 아닌 나를 위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시의 화자는 다르다. "비가 오면/네 손을 잡아주마"고 했다. 우산에 대한 고마움을 늘 느끼면서도 나는 이런 응원의 따뜻한 시구 하나 떠올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자책이랄까, 시인으로서의 역량 부족에 대한 부끄러움은 좋은 시(시인)를 만난 기쁨과 섞이어 기분이 과히 나쁘지는 않았다. 다음 시도 마지막 연에 이르자 나도 모르게 "아이고!"하고 신음에 가까운 소리를 흘리고 말았다.
푸른 부전나비가
노란 괭이밥꽃에 앉는다
작고 여윈
마른 풀잎에 앉다가
종지나물에 앉다가
돌멩이에 앉는다
내가 밟고 다니는 것에 입맞춤한다
-<봄날> 전문
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좋은 시를 쓰고 싶다고 써지는 것도 아닐 터다. 어떤 경험이 나를 관통해야 한다. "내가 밟고 다니는 것에 입맞춤한다"는 놀라운 발견이나 깨달음이 나에게 없다면 내가 과연 시인인가.
나는 송 시인을 잘 모른다. 하지만 시집을 읽다보니 그가 신앙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시 두세 편 건너마다 '하느님'이 등장한다. 시집 맨 첫 장에 자리한 '시인의 말'도 '하느님' 세 글자로 시작한다. 하지만 "꽃 하느님/풀 하느님/소 하느님"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과는 결이 다르거나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느님은 외로웠습니다/할 수 없이/하느님 마음 닮은 친구를 만들었어요.//꽃 하느님/풀 하느님/소 하느님//그러고 나서 하느님 모습을 닮은 친구들을 만들었지요.//서령이 하느님/재경이 하느님/꽃풀소 하느님………
-<시인의 말> 중에서
<동시 먹는 달팽이> 제 1회 신인상 수상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한 송창우 시인의 첫 시집은 예쁜 시집 주머니 속에 들어 있었다. 그걸 천천히 풀어서 나에게 전해준 이가 김영춘 시인이다. 그는 시집을 건네주며 "송창우 시인도 형처럼 제자들에게 생일시를 써주었어요."라고 말했다. 그 말과 눈빛 속에는 오랫동안 아이들을 사랑하고 시를 꾸준히 써왔지만 시집 한 권 안 내다가 퇴임에 즈음하여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 첫 동시집을 낸 후배 시인에 대한 지극한 애정이 묻어 있었다.
내 추측일뿐이지만, 다음 시는 서령이에게 써준 생일시가 아닐까 싶다.
서령이처럼 예쁜 사람
본 적이 없다
정말요?
그럼,
서령이처럼 예쁜 사람은
세상에서 딱,
하나임!
-<서령이> 전문
송 시인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었는지 여실하게 느껴진다. 서령이는 송 시인에게 "하나임!"이자 '하느님'이었을 것이다. 다음은 이번 시집의 표제시로 비교적 긴 시에 해당한다. 그중 일부다.
아침부터 "씁쓰름씁쓰름" 울어대는 씁쓰름새가 있었어. 울어대는 소리조차 씁쓰름이라니…….마을 사람들은 씁쓰름하게 울어대는 씀쓰름새를 없앨 궁리만 하고 있었지. 어른들이 총을 쏘자 아이들도 돌팔매를 던지기 시작했지. 어느 날 허리가 접혀진 마을 할머니가 말했어. "씁쓰름새가 마을에서 떠나면 씀쓰름한 일만 일어날 거야."
-<씀쓰름새가 사는 마을> 부분
이 시는 "씁쓰름씁쓰름 울어대는 소리는 산을 넘고 강 건너면, 가끔은 다르게 들릴 수도 있으니……"라고 끝을 맺는다. 세상에 진실은 하나가 아니며, 영원하지도 않다. 하지만 허리가 접혀진 마을 할머니의 말이 더 진실에 가깝다는 것은 알 수 있겠다. 송 시인에게 할머니는 또 한 분의 하느님이지 않을까 싶다.
소개하고 싶은 시가 많지만 환경, 혹은 똥과 관련한 시를 한 편만 더 소개하고 글을 마칠까 한다. 노래로도 만들어진 동시다.
닭장에서 나온 똥은 마늘 공장으로 가고
돼지막에서 나온 똥은 고추밭으로 가고
외양간에서 나온 똥은 텃논으로 갔는데
닭공장에서 나온 똥
돼지공장에서 나온 똥
소공장에서 나온 똥
그 많은 똥은 어디로 갔을까?
-<똥바다> 전문
아이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내 기분을 먼저 말하자면 '부끄러움'이었다.
"그 많은 똥은 어디로 갔을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시를 읽었으니 자주 그런 생각을 해야겠다. 시를 읽는 것은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것만 아니라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하도록 하는 사회적인 효과도 있다.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다. 정말 궁금하다. 그 많은 똥은 어디로 갔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