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렘 입숨(Lorem Ipsum)은 본래 출판과 디자인의 세계에서 텍스트의 형태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더미 텍스트다. 단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시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장 일반적인 로렘 입숨은 'Lorem ipsum dolor sit amet'으로 시작하며 굳이 번역하자면 '로렘 입숨의 고통이 여기에 있다' 정도로 별 의미는 없다. 고대 로마 시인 키케로의 <최고선악론(De Finibus Bonorum et Malorum)>에서 유래했단다. 원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Neque porro quisquan est qui dolorem ipsum quia dolor sit amen, consectetur, adipisci velit. 고통이 고통이라는 이유로 그 자체를 사랑하고 소유하려는 자는 없다'
구병모 소설가의 저서 <로렘 입숨의 책>(안온북스, 2023)은 그가 2017~2022년 사이 쓴 열세 편의 단편을 묶은 소설집이다. '~의 책'이라는 제목의 책을 만들고 싶어 최근 쓴 단편을 훑다가 마음에 드는 단어를 넣어 완성했다.
그 단편은 이 책의 네 번째로 실린 단편 '동사를 가질 권리'다. 이어 붙였을 때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소설을 쓸 수 있기를 작가는 오래도록 바랐단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소설을 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일이었다.
구병모의 모든 저서를 읽은 사람들은 그가 매번 다른 시도를 한다고 말한다. 구병모 자신도 그 사실을 인정하며 '구병모 월드'에 진입하기 좋은 책 같은 건 없다고 말한다. 이는 베스트셀러 <위저드베이커리>(창비, 2022)를 쓴 작가가 결코 청소년 소설에만 머무르지 않고 <로렘입숨의 책> 같은 단편집을 썼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구병모의 문학을 아우르는 기괴함 내지 디스토피아 같은 분위기가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자신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힌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슬프다고 한다. 그의 저서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세상이 마냥 긍정적이지 않고 조금씩 '삐딱한' 이유다. 그는 또한 '잘 팔리는' 상품 같은 책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 쉽게 읽히지 않는 만연체는 하나의 스타일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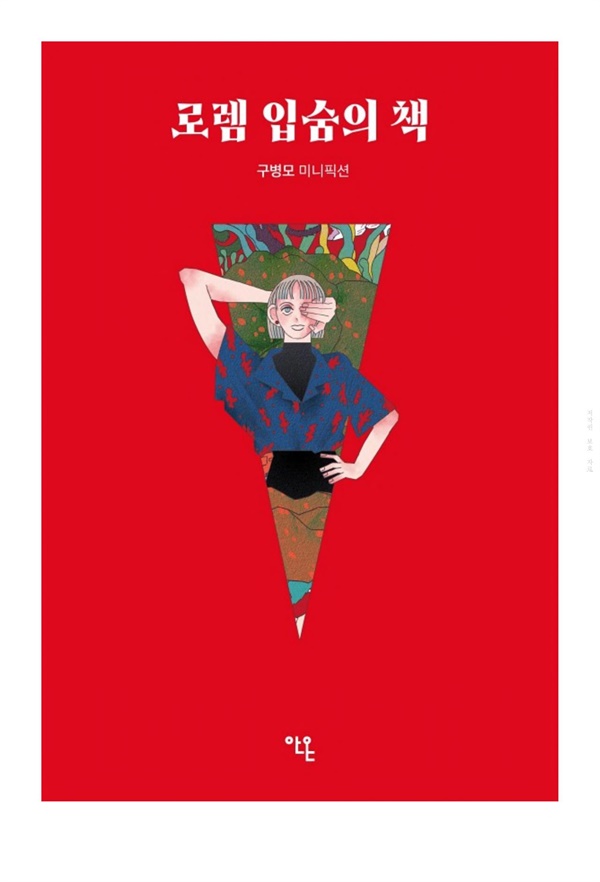
▲책 표지 ⓒ 안온북스
무의미와 의미의 경계
'누가 그것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는지는 나중 문제였다'('동사를 가질 권리', 2022)
이 단편은 말이 되지 않는 소설을 쓰는 소설가를 등장인물로 내세워 문장을 덧붙여 간다. 등장인물이 쓴 소설은 결국 연결고리가 부실한 로렘 입숨 같은 더미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구병모가 추구하는 것이다.
어쩌면 대다수의 소설가가 지향하는 바와 정확히 반대 지점이지 않을까. 우리는 이야기를 쓸 때 의미를 만들어내려 애쓰고, 이야기를 읽을 때도 그 속에서 의미를 건져 올리려 한다. 그런데 꼭 의미가 있어야 한단 말인가.
나는 뜻 맞는 지인들과 독립잡지를 만들고 있다. 첫 기획 회의 날, 손풀기로 A4 한 장을 접어 만든 6페이지짜리 작은 책자에 '릴레이 소설 쓰기'를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먼저 한 명이 첫 문장을 적는다. 다음 사람이 뒤이어 몇 문장을 덧붙인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반복한다.
그때 우린 어떻게든 말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려 노력했다. 이 문장을 덧붙이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 그 짧은 이야기를 쓰면서도, 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무의미해도 괜찮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을까? 의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면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릴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탄생할 수도 있다. 의미에 대한 집착은 이 모든 것들을 부지불식간에 막고 있는 주범인지도 모른다.

▲단편 <화장의 도시>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의 삶에 어울리는 꽃이 되어버린다. ⓒ Annie Spratt on Unsplash
구병모의 시도를 살펴보자. 처음에 실린 단편 '화장의 도시'(2021)는 다소 유치한 시도에서 탄생했다. '화장'의 한자 火를 花로 치환해 버린 상상의 산물이다. 사람을 불에 태워 장례를 치르는 관습이 아닌, 사람이 죽으면 그의 삶에 어울리는 꽃이 되어버린다는 설정. 낱말의 한 부분을 바꿔보는 작은 장난이 쏘아 올린 짧은 소설이다.
'영 원의 꿈'(2021)은 또 어떤가. '꿈'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밤에 꾸는 꿈과 미래를 향해 꾸는 꿈. 작가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장난을 쳐봤다. '이 꿈은 그 꿈이 아니고 그 꿈은…….' 소설 속, 밤에 꾸는 꿈을 팔던 '나'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게 되자 '지난날에 두고 온 꿈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았던 그 꿈의 가격은, 바로 0원.
'신인의 유배'(2019)는 '빅 픽처'라는 주제를 제안받고 쓴 단편이다. 묘안이 퍼뜩 떠오르지 않은 작가는 말 그대로 큰 그림을 떠올렸다. '계획'을 뜻하는 '큰 그림'이 아니라, 그냥 커다란 그림. 그는 나스카 지상화를 떠올린다. 페루 수도 리마에서 남쪽으로 400km 떨어진 나스카 일대에 그려진 거대한 그림들. 너무 거대해서 오직 하늘에서만 완전한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그 그림들.
거미, 나무, 벌새, 꽃 등 동식물뿐만 아니라 외계인, 그리고 나선과 같은 기하학적 문양까지. 그 그림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신에게 유배당한 '신인(神人)'을 등장시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얼핏 말장난처럼 보이는 시도가 어엿한 단편 소설들로 탄생하는 모습이었다. 그걸 보고 나는 말장난과 아재개그에 더 관대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미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탐색은 내려놓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상상력을 뻗어나가도 되지 않나. 어쩌면 의미는 추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게 아니라 나중에 돌아보니 거기에 의미가 있었어, 하는 식으로 '발견'되는 게 아닐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 문장을 쓰는 일, 하나의 선을 긋는 일인지도 모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자의 블로그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