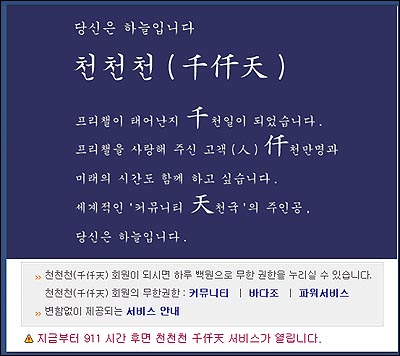
▲프리챌 유료화 서비스 '천천천' 배너광고 ⓒ
프리챌 커뮤니티 서비스 유료화 발표가 난 지 1달이 지났다. 11월 14일 유료화 서비스의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유료화에 대한 찬반 의견 표출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1주일 남은 시점에서 프리챌의 커뮤니티 대부분 운영자들은 프리챌 잔류 여부를 결정지었고, 일부 커뮤니티는 타 서비스로의 이동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유료화 논쟁 기간 기성 언론들도 지면을 통해 열띤 찬반논쟁을 펼쳤다. KINDS 검색 결과 10대 일간지는 이 기간 동안 약 30건의 관련기사를 내보냈다. 유료화 논쟁 기간 초반에는 프리챌의 유료화 사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유료화 논쟁이 본격화되던 10월 2-3주 차에는 본격적으로 찬반 논쟁에 가세했다. 국민일보는 10월 9일자 "닷컴업계 군살빼기 안간힘"과 16일자 전제완 프리챌 사장 인터뷰를 통해 간접적으로 유료화 찬성 쪽에 힘을 실어주었다. 조선일보도 17일자 기사를 통해 프리챌 쪽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유료화 찬성 쪽에 힘을 실어주었다.
대한매일 23일자 "유료화 반발 네티즌 짐 싼다"라는 기사를 통해 많은 프리챌 사용자들이 활동 공간을 이동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이 기간에는 타 업체들이 커뮤니티 이전 서비스를 해준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대부분의 기사의 말미에는 프리챌측이 타사의 회원 빼내기를 비방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짓고 있다. 왜 프리챌 회원들이 이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사들이 업체나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양측의 입장을 간단히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10월 23일 중앙일보의 "인터넷 공짜잔치는 끝났다?"라는 제하의 기사는 철저하게 업계 중심의 보도를 내보냈다.
그나마 한겨레만이 뒤늦게 10월 22일, 24일과 26일자 오피니언 면을 통해 독자들의 찬반 의견을 인터넷 사용자 입장에서 다루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한겨레의 한계도 분명했다.
구본권 인터넷 한겨레 부장이 29일자 오피니언 면에 기고한 글을 보면 프리챌 유료화의 찬반을 결국 네티즌들의 공짜심리라는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다. "돈내와 못내의 사이버 혈전"이라는 16일자 한겨레의 기사는 언론의 이번 사건에 대한 보도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사제목이다.
10월 28일 경향신문의 "지갑 열면 서비스 나아지나..."라는 기사는 네티즌들이 왜 인터넷 유료화에 반발하는지를 가장 잘 표현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공짜가 좋다. 단돈 100원이라도 못 내겠다. 이런 식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그간 프리챌 측의 서비스(각종 광고화면과 복잡한 로그인 과정)와 최근 프리챌의 입장에 대해 못마땅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프리챌의 유료화 문제는 단편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 xfreechal이 밝힌 바에 의하면 유료 서비스인 '천천천 서비스 예약'이 취소가 안 된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이용자들에게 자료의 백업을 해주지도 않으면서 경쟁사의 자료 백업 조치를 완전히 막았다고 한다.

▲프리챌 커뮤니티의 유료화를 선언한 전제완 대표이사 ⓒ 오마이뉴스 남소연
프리챌 천천천 서비스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질문이나 의견이 쏟아지고 있지만, 어느 직원 하나도 답변을 달지 않는 등 무성의한 서비스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프리챌 측이 커뮤니티 활동 보상지수를 10~300원 정도로 책정하고 이 돈을 볼모로 커뮤니티 폐쇄를 못하게 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원성을 사고 있다.
이러한 면은 전혀 짚어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일보는 지난 6일자 보도를 통해 112만개 커뮤니티가 단순히 110만개로 줄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이 기사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사가 6만 개의 커뮤니티 예약 서비스에 대해 프리챌의 입장을 그대로 옮겨 긍정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프리챌이 예상한 유료화 동참 최저수준은 현재 112만개의 10%인 11만개, 하지만 유료화를 딱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도 6만 개의 커뮤니티만이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그 중에서는 현재 유료 예약을 취소하기를 바라는 이용자도 상당수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혀 보도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보도가 단순 현상나열에 그치고 있다. 유료화 찬성이나 반대 논쟁에 임하는 네티즌들의 태도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었다. 이번 논쟁에서 일부 네티즌들의 태도는 비난 받아 마땅했다.
무조건 찬성형, 무조건 반대형을 비롯하여, 욕으로 일관하는 사용자, 돈내고 안내고의 관점에서만 입장을 피력하는 사용자, 회사 경영상태를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사용자들도 상당했다.
또한 프리챌의 유료 부가 서비스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유료 서비스인 게시판 꾸미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든지, 열린 커뮤니티를 지향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유료화 반대 커뮤니티는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 조회조차 불가능하게 한다던지, 전제완 사장의 출신학교와 같은 사적인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네티즌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모든 언론이 묵묵부답이었다.
게다가 많은 네티즌들은 다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클럽 역시 얼마 있지 않아, 유료화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연합뉴스 17일자 기사만이 이를 약간 언급하고 있다. 대부분의 신문이 업계의 이야기를 받아적기에 바빴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많은 신문들은 이번 사건에 앞서 대부분의 인터넷 유료화가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것은 업체의 입장에서 성공한 유료화일 뿐, 네티즌들의 입장에서는 부실한 유료화 서비스의 한 종류에 불과할 뿐이다. 언론이 인터넷 유료화에 대해 논하기 전에 그들의 시각자체가 그들의 독자이자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인 네티즌들의 시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편 매일경제, 내외경제, 머니투데이 등의 경제지는 일방적으로 업체의 얘기만을 받아적기에 바빴다. 경제지 답게 철저히 업체의 입장에서 사건을 보도했다. 네티즌들의 입장을 보도한 기사를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대부분의 신문이 적어도 기사를 하나 이상 다룬 반면, 뉴스 기사의 연성화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방송사의 경우에는 단 한 곳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이 기간 흔한 기사거리인 인터넷 중독 등의 부정적 기사 거리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긍정적 기사 등 새로운 사실이 아닌 기사만을 반복하여 내보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일부 연예프로그램의 다시보기 서비스의 유료화를 시작한 서울방송을 비롯하여, 문화방송과 한국방송 역시 유료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민감한 기사는 아예 취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부 인터넷 신문들이 기자회원이 만들어가는 신문의 특성을 살려 네티즌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한 것에 비하면 기성 언론들이 보여준 보도는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단순 사실의 나열과 업계의 입장에서만 보도하는 태도는 상류층을 대변한다는 신문이나 서민을 대변하다는 신문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메인 뉴스에서 명품족, 부익부 빈익빈을 경계한다고 하는 방송사도 별반 차이가 없다.
인터넷 상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문제가 제기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다. 이번 유료화는 기본 서비스의 유료화라는 점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재미 위주의 단순 사건 나열식의 보도 내용은 지양되어야 한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터넷 문화가 발달한 만큼 이제는 언론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 있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