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비
'운명으로서의 시, 이것이 시인의 약한 숨을 막지 않는다. 시인생활 45년은 그러므로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거부이다.' 칠십을 넘긴 노구임에도 이십대의 열정으로 삶과 시를 살고있는 고은(71) 시인이 <만인보>(창비) 5권을 한꺼번에 내놓았다.
1986년 1권이 나온 이후 '시를 통한 한국 인물현대사의 복원'이라는 평가를 받고있는 <만인보>. 전봉준과 김일성 등 유명인은 물론 뒷집 욕쟁이 할머니와 옆집 곰배팔 아저씨까지 이 땅의 갑남을녀를 고루 등장시킨 고은의 시편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역사라 부를만하다.
이번에 출간된 <만인보> 16~20권은 지난 97년 15권이 나온 이후 7년만에 선보이는 것으로 식민지시대에서부터 한국전쟁기 전후의 사람살이를 고은 특유의 유장한 언어로 노래하고 있다. 부제는 '사람과 사람들'. 그중 한 편을 보자.
어둑어둑한 섬진강 기슭/아버지의 뼛가루를/바쁜 물살에 뿌려 날린 뒤/소년은/노고단 쪽을 바라보았다//노고단은 구름 속//이제 열네살 준호는/어디에서도/아버지 없이 사흘 굶어 살아갈 것이다/바람은 앞에서 불어올 것이다//소년의 얼굴은 아버지의 얼굴을 빼다박았다//빨갱이 새끼/빨갱이 새끼/그 이름이 평생 따라붙을 것이다
- 위의 책 16권 중 '소년 준호' 전문.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빨갱이 새끼'라는 원치 않는 이름을 얻은 것이 어디 준호뿐이랴. 이 소년의 삶을 정면에서 바라보며 냉정함을 잃지 않는 고은의 노래는 동정과 연민을 넘어서는 뭉클한 시적 감동을 독자들에게 선사한다.
문학평론가 김병익은 "고통스러운 역사를 되새김질하고 그에 짓밟힌 만상의 인간들을 사랑하며 껴안고 뺨 비비며 삶의 진의와 세계의 진수를 손가락으로 끄집어내고 있다"는 찬사를 선배문인의 노작(勞作) 앞에 헌사했다.
회갑의 나이에 완성한 역사소설
- 백우영의 <자향> 1~5권

ⓒ 소담출판사
1970년 <한국일보>에 입사한 이래 특집부장과 국제부장, 문화부장 등을 두루 거친 백우영(60)이 회갑의 나이에 소설가로 몸을 바꿨다.
그에게 '소설가'라는 명패를 달아준 작품은 조선 중종 11년 일어난 기묘사화로 양가집 규수에서 노비가 될 위기에 처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자향(子香)>(소담출판사). 작품은 전쟁과 궁중비사 등의 식상한 소재에서 탈피해, 운명을 거부하는 한 여성과 그 여성을 돕는 민초들의 이야기를 박진감 넘치는 긴박한 문장으로 담아낸다.
이에 덧붙여 <자향>은 당대의 관혼상제 풍습과 사회상, 생활풍속, 문화 등을 폭넓게 서술하고 있어 조선의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는 교육적 가치도 높아 보인다.
기묘사화로 인해 멸문지화(滅門之禍)를 겪은 박자향은 노비로 팔리게 될 운명을 피해 마름 석 주사와 함께 몸을 피한다. 도주를 눈치챈 수문장은 추쇄포교들에게 체포명령을 내리고 석 주사는 이들에게 잡히는 몸이 된다. 하지만 자향은 노고산 산길에서 만난 봇짐장수의 도움으로 포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데….
도망치는 자향과 뒤를 쫓는 포교들의 추격전을 중심에 놓고 의리와 사랑, 시련을 넘어서는 인간의 의지 등을 세밀한 문장으로 표현해낸 백우영의 필력이 만만찮아 보인다.
"이 세상은 성실보다는 요령이, 청렴보다는 타협이, 의리보다는 아부가 더 잘 통한다고 생각해. 내 말이 틀렸는가?"라는 포교 함지박귀의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인간은 문학과 역사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공순이'에서 '여성노동자'가 되기까지
- 박수정의 <숨겨진 한국여성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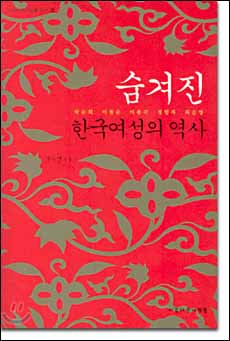
ⓒ 아름다운사람들
기자가 경남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1987년. 등교길에 야간작업을 마치고 충혈된 눈의 피곤한 발걸음으로 기숙사로 돌아가던 수출자유지역 여공들을 만나곤 했다.
우리들이 거리낌없이 '공순이'라 비하해 부르던 기자 또래의 여성노동자가 한달 내내 잔업과 철야를 해내야만 겨우 8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들의 20일치 임금을 용돈으로 쓰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졌던 기억이 있다.
르포 작가 박수정의 <숨겨진 한국여성의 역사>(아름다운사람들)는 바로 이 '공순이'들이 어떤 투쟁과 몸부림을 통해 '여성노동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는지를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다. '노동조합=빨갱이'라는 등식이 일반적이던 1970년대. 노동자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억압구조를 깨고 척박한 이 땅에 민주노조운동의 씨를 뿌린 5명의 여성노동자. 책은 이들의 삶을 밀착추적 한다.
전 동일방직 노조위원장 이총각씨와 YH무역 노조위원장이었던 최순영씨, 전 원풍모방 노조부위원장 박순희씨,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이철순 위원장, 전남제사 노조위원장을 지낸 정향자씨 등 5명 선각자의 삶은 한국의 현대사가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를 숨김없이 보여준다.
저자는 이들의 삶을 따라가며 공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연, 노동자임을 자각하게되는 계기, 의식의 성장사 등을 꼼꼼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 속에는 여성노동자를 향한 똥물투척사건, 신민당사 점거사건, 원풍모방 사태 등 1970년대 한국 노동운동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서울여성노동자회 황현숙 부회장은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인간의 소중함을 가슴에 품고, 그 소중함을 가꾸어내기 위해 서로의 어깨를 걸고 몸과 피로써 일구어낸 발자취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자랑스런 여성노동자의 살아있는 역사"라는 말로 책의 출간의미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