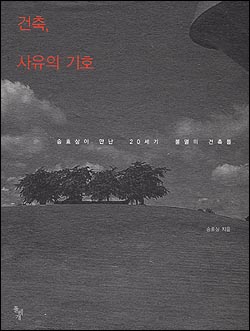
▲책표지 ⓒ
모스크바 지하철역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역이다. 1935년 최초의 열차들이 모스크바 지하를 달렸을 때만 해도 오늘날 지하철이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가 되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매일 9287개의 열차로 900만명의 사람들을 실어 나른다. 계산상으로만 보면 도시 주민 누구나 하루 한 번은 지하철을 타는 셈이다. ‘인간은 죽어서만 지하에 속하는 법’이라는 러시아 정교회의 반대 논리는 기술과 인간 상상력의 결합이 가져다 준 무한한 가능성에 이제 자리를 내 줄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삶이란 집이나 건물 등을 짓고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의 역사다. 장소와 시대에 따라 짓는 재료도 다르고 그곳에 깃들여 사는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씩 다르다. 마당과 뒷간이 있던 옛집과 대규모 콘크리트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양과 생각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집은 여전히 고단한 육체를 누이고 따뜻한 위안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것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든 짚으로 만들어졌든.
2002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승효상을 처음 만났다. 그해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승효상 건축전>이 열리고 있었다. 나로서는 건축전은 그때가 처음인지라 당연히 굉장한 인식적 경험을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런데 막상 견학 온 학생들로 가득 찬 전시실을 어렵사리 돌고 나니 손에는 몇 권의 책과, 건축이란 모형만으론 도저히 원래 가치나 감정을 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흔히 문외한들이 갖곤 하는 자기 합리화식 이해 정도만을 들고 나오는 것으로 족해야 했다. 그리고 그날의 그 책들은 영문도 모른 채 책꽂이에 오래도록 꽂혀 있어야만 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승효상의 이름을 다시 만난 것은 순전히 광고 덕이었다. 여름 내내 <한겨레신문> 하단에서 끈질기게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셈인데 이 역시 도저히 정리가 안 되는 책들 사이에 끼여 마냥 변덕스러운 주인의 마음이 선택해 주기만을 기다려야 할 운명에 처할 수도 있던 것을 단지 ‘건축이 우리 삶을 바꾼다고 믿는다’는 저자의 신념이 그럴 듯해 보였다는 이유 때문에 용케 이런 운명을 면하게 됐다.
승효상은 건축가다. 건축하면 63빌딩이나 예술의 전당 혹은 외국의 파밀리에성당이나 퐁피두센터 등 굉장한 것만을 떠올리기 십상인 일반인에게 건축가의 이름이란 시인의 이름과는 분명 다른 무엇이다. 뭐 건축은 현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술이지만 안타깝게도 일반 대중은 여전히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페터 베렌스(독일의 건축가, 베렌스 하우스, 회히스트 염색 공장 본부 건물, 바이센호프 주택단지의 주택 등 다수)의 한탄을 떠올리지 않아도 좋다. 지난 세기 지어진 대표적 건축물로 언론이 선정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의 유홍준의 집 ‘수졸당’과 ‘대학로의 문화공간’을 지었고 ‘파주출판도시’의 지휘를 맡았던 이가 승효상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아름다운 집을 보고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이 집을 누가 지었을까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건축이 우리 삶을 바꾼다”
건축가인 그가 일반인들을 위해 몇 년 동안 써온 글들을 모아 엮어 낸 것이 바로 <건축, 사유의 기호 : 승효상이 만난 20세기 불멸의 건축들>이다. 그는 집은 세우는 게 아니라 짓는 것이라고 믿는다. 짓는다는 것은 삶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 속에 사는 사람의 삶을 조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인이 만든 건축이란 용어는 우리 삶을 지배하고 변화시키는 건축의 본래적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영어의 ‘architecture’의 ‘arch’는 크다, ‘tect’는 학문 혹은 기술이라는 라틴어에 어원을 두고 있으니 직역해 ‘큰 기술’이라는 뜻으로 오히려 건축의 중요성을 더 잘 드러낸다고 믿는다.
아름다운 집에 대한 승효상의 생각 역시 단호하다. 동선이 길어 좀 걸어야 되고 대문도 나가서 열어줘야 하고 빗자루로 쓸고 걸레를 훔치며 가족의 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집이다. 쉽게 말해 다소 불편한 집이다. 승효상은 이런 집에서라야 궁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사유하게 되고, 사유를 통해 삶을 관조할 수 있다고 믿는다. 화려한 재료를 써 장식이 많고 화려한 집에서는 거주인은 왜소하게 되기 십상이고 삶의 모습은 그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옛 집이야말로 아름다운 집이 되기 위한 요소들이 그득했다. 그래서 승효상은 ‘달동네’를 자주 기웃거렸다. 그곳에서 우리 옛 흔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집이 소유와 축재의 수단도 아니고 오로지 사용할 뿐이며 사는 사람들의 꿈을 담는 공간일 뿐이다.
이 책은 승효상이 외국 여행을 통해 만난 건축물에 대한 사색의 고백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더러는 몰라서 더러는 이름은 들었지만 그저 무심함으로 지나친 건물들이 건축가 승효상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다. 비엔나 미카엘 광장에서 커피를 마시며 올려다보았던 건물이 당대 비엔나 시민들에게 그토록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바로 그 로스 하우스였다니. 승효상은 종래의 건축 개념을 뒤집은 파리의 퐁피두센터도 건축물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에 주목한다. 땅의 서쪽편의 반을 경사진 광장으로 비워 고밀도의 도시 한가운데 도시의 ‘비움’을 만들어 낸 것이야말로 이 건물을 건축사의 빛나는 성취로 거듭나게 한 정신이라는 것이다. 르 코르뷔지에의 빌라 사보아에서는 서양 문화사의 핵심을 이루는 ‘나’ 중심의 사고를 확인한다. 우리의 주거관이나 세계관과는 확실히 다른 전형적 서구 주택의 완성을 여기서 보았다.
건축사에서 로마인들이 발명한 콘크리트의 사용은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한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힌다. 재료의 사용이 장소에 구애되지 않으며 크기나 모양도 무한정이다. 오늘날 콘크리트는 건축의 필수 재료로서 콘크리트가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수사학적으로 콘크리트는 도시의 황량함, 단절의 대명사다. 삶을 조직하고 담아내는 것이 건축이라면 이는 오늘날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떤 정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년 365일이 공사 중인 서울에서 건축은 그 속에 사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춘 지 오래인 것 같다. 그래서일까? ‘승효상, 이 사람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을 책 읽는 내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