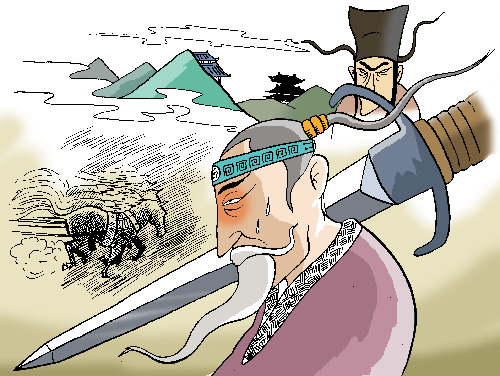
ⓒ 김상돈
더구나 머리에 꽂고 있는 주화(珠花)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비싼 것이었고, 다른 여인들의 머리에 꽂은 것도 금으로 한묶음의 산다화(山茶花) 모양을 정교하게 세공한 것으로 값비싸고 귀한 물건이었다.
“이 음식에는 독이 없어요. 다만 백일향(百日香)이 들어가 있죠.”
여인은 태연히 웃으며 말했다. 백일향이라면 독은 아니었다. 열흘 동안 죽은 시신을 썩지 않게 하고 냄새를 나지 않게 하는 십일향(十日香)은 장의(葬儀)들이 곧잘 사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백일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백일향은 일종의 향으로 바르거나 먹을 경우 백일 동안 향기가 가시지 않는다 하여 여인들이 화장(化粧)을 할 때 함께 뿌리기도 하는 것이었다. 다만 문제는 먹을 경우 오줌이나 땀에서도 그 향이 배출되기 때문에 특별히 제조된 백일향의 경우 그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이 울금향(鬱金香)이 그 때문이오?”
탁자에 앉자마자 그는 은은한 울금향을 맡을 수 있었다.
“아니예요. 제가 음식에 넣은 백일향은 보통 사람들은 맡을 수 없어요. 울금향은 소첩이 가장 좋아하는 향이죠.”
그녀는 다시 소매로 입을 가리고 약간 얼굴을 붉힌 채 웃었다. 그녀의 말은 울금향이 그녀의 몸에서 난다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었다. 담천의는 그녀를 바라 보다가 마침 주인장이 차를 가지고 오자 그녀에게 말했다.
“어쨌든 한번의 좋은 경험으로 음식이란 가려 먹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으니 나는 소저가 차려 놓은 음식을 먹지 않겠소. 주인장께서는 나에게 계사면(鷄絲面) 한그릇을 빨리 가져다 줄 수 있겠소?”
촌노는 힐끗 담천의의 앞에 앉아 있는 여인의 눈치를 보더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요. 곧바로 올리겠습니다.”
촌노는 대답과 함께 빠르게 주방 쪽으로 달아났다. 손님들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 기껏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왜 계사면을 찾는단 말인가? 여인 앞에 놓인 음식은 자신의 아내가 만든 음식이 아니었다. 왼쪽 탁자에 앉아 있는 선녀처럼 고운 여인이 우중충한 주방까지 들어와 그녀들이 가져 온 재료로 직접 만들어 내간 음식이었다.
“어차피 계사면 안에도, 그리고 지금 마시는 차에도 백일향은 들어 있을 거예요. 이곳 주인장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예요. 금두(金豆)에 대한 욕구는 누구에게나 믿지 못할 솜씨를 발휘하게 하죠.”
여인은 여전히 웃음을 띠우며 눈짓으로 김이 피어 오르는 음식을 가리켰다. 그는 찻물을 몇 모금 마시고 나서는 젓가락을 집어 들었다. 상대를 모르고, 상대의 의도를 모를 때 상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상대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들어 주게 되면 상대는 곧바로 그 의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덩어리째 구운 돼지고기를 한점 떼어 내어 먹기 시작했다. 헌데 그것을 본 여인의 얼굴에 약간의 놀람과 약간의 의혹이 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것은 그가 먹는 특이한 행동 때문이었다. 대개 사람들은 덩어리 고기를 먹을 때 고기 결에 따라 찢어 먹거나 찢어지지 않으면 칼로 썰어 먹기 마련이다. 헌데 담천의는 젓가락으로 네모반듯하게 주사위 같은 모양으로 고기를 떼어내 먹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 고기의 네모난 모양은 마치 두부를 잘 드는 칼로 자를 대고 썰은 듯 너무나 반듯했다.
“음식을 드실 때에 항상 그런 식으로 드시나요?”
“그렇지 않소. 허나 이름도 모르는 미녀 앞에서는 곧잘 이렇게 먹곤 하오.”
그제서야 여인은 그가 왜 그렇게 잘라 먹었는지 알았다. 그런 특이한 행동은 상대의 이목을 끌어들여 상대에게 쉽게 자신이 알고자 하는 것을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상대를 파악하는 데 꽤 도움을 주는 행동이었다. 큰 실례가 되지 않는 한 그런 상식에 벗어난 행동은 상대의 흥미를 유발할 뿐 아니라 호기심까지 끌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저를 몽화(夢花)라고 부르더군요. 담공자께서는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는 고개를 끄떡였다. 그녀가 몽화라는 사실은 의외였다. 화북에서 가장 뛰어난 세 미녀를 일컫는 말이 일봉이화(一蜂二花)라 했다. 그 중 가장 신비한 여인이 몽화였다. 그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그녀의 내력은 어떠한지, 심지어 그녀의 이름이나 나이까지도 알려진 바가 없었다.
‘꿈꾸는 듯 신비한 꽃’,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미녀’라고 칭송되기는 하나 그녀의 종적은 안개에 가린 듯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그녀가 처음 모습을 보인 것은 사년 전이었는데 그 뒤로 가끔 나타났다가는 사라졌다. 그녀의 미모에 반한 누군가가 탄식처럼 몽화라고 부른 것이 중원에서 그녀를 부르는 유일한 이름이 되었다고 했다.
“운이 좋아야 볼 수 있다는 몽화를 직접 만나뵙게 되니 영광이오.”
“저 역시 중원에 갑자기 나타나 이목을 집중시키는 담공자를 뵈오니 영광이군요.”
담천의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이곳에서 자신을 기다린 사람이 몽화라는 것은 뜻밖이었다. 그녀는 신비해 오히려 그녀에 대해서 부풀려지는 이야기는 많았다. 하지만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때 그의 고개가 돌려졌다. 다점의 주인장이 계사면을 가져 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를 보고는 눈짓을 했다. 같이 먹겠느냐는 뜻이었는데 어차피 주인이 가져 온 것은 한그릇 뿐이었고 또한 그냥 인사 치례에 불과했다. 그녀 역시 그 뜻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등을 돌리는 주인에게 말했다.
“계사면이 맛있게 보이는군요. 한그릇을 더 가져올 수 있나요?”
“그러문입쇼. 금방 올리겠습니다요.”
주인장은 아름다운 그녀의 말에 황공한 듯 고개를 허리까지 숙이며 부리나케 주방 쪽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녀는 상대를 배려해 같이 먹자는 예의에 답한 것이고 더 좋은 음식들이 차려져 있음에도 그와 같은 것을 먹겠다고 한 것이다.
“그럼 먼저 먹겠소.”
계사면은 사실 맛이 없었다. 육수에는 기름기가 많아 닭 비린내가 심하게 났고, 잘게 찢어 들어간 닭고기는 오래된 것인지 뻣뻣했다. 더구나 면이 거칠어 계사면 특유의 담백한 맛을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외진 다점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지 몰랐다. 그는 두세 젓가락을 먹고 나서는 젓가락을 탁자 위로 내려 놓았다.
“그대는 이것을 먹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소. 이곳 화북 사람들은 기름진 것을 좋아하지만 절강 사람들은 담백한 국물을 좋아하기 때문이오.”
그 말에 몽화는 처음으로 가는 눈매에 이채를 띠웠다. 어차피 맛이 없으니 먹지 말라는 말이었지만 그녀가 절강성 태생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다. 더구나 화북의 세 미녀로 불리는 그녀가 강남 절강성 태생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거의 없었다.
“왜 곳곳에서 당신을 주시하는가 했더니 그 이유가 있었군요.”
그녀는 그의 말을 인정했다. 굳이 부인할 것도 아니다. 자신의 억양으로 그녀가 절강 사람인 줄 알았을 것이다. 사실 말을 배우기 시작한 지방의 억양이나 말투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고치기 힘들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금릉이나 아예 하남의 개봉 쪽의 말투를 사용한다고 그녀 스스로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자신에게 고향의 말투가 은연 중 남아 있었다는 점에 놀라웠고, 그것을 파악한 그가 놀라웠다.
“그쪽에서 자라다 보니 알게 된 것 뿐이오.”
그러고 보니 그녀가 파악한 바로는 담천의도 절강과 인접한 강소의 소주(蘇州) 출신으로 금릉에서 자랐다. 그렇다 해도 세심한 주의력을 가지지 않고는 알아낼 수 없는 일이다. 그녀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이 사내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특출난 재능이 있는 사람일지도 몰랐다.
“헌데 당신은 나이도 많지 않은데 참으로 인내심이 깊군요. 인내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지요. 하지만 고통을 즐길 정도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투정을 받아 줄 사람이 아예 없거나 고집을 피울 상대조차 없이 자란다면 누구나 인내심을 가질 수 있소.”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잘레잘레 흔들었다. 그녀의 머리에 꽂힌 주화에 달린 구슬들이 부딪히며 미묘한 소리를 냈다. 이 사내는 분명 특출한 인물이다. 그 내면을 파악하기도 너무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사내는 적으로 돌려서는 절대 안될 사람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내심 안도하고 있었다.
“끝까지 제가 이곳에서 공자를 기다린 이유는 묻지 않는군요.”
“꼭 물어 볼 이유가 무엇이 있겠소? 물어 본다고 대답을 해 줄 것도 아니고 안 물어 본다고 대답을 하지 않을 것도 아니잖소. 당신이 이곳에서 나를 기다린 이유가 있었다면 내가 묻지 않아도 가르쳐 줄 것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