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5월21일 송라산 ⓒ 김선호
언제나 찾아도 좋은 것이 산이지만 오월의 산, 특히 이맘때야 말로 산이 가장 아름다울 때다. 봄과 함께 시작된 꽃들의 행진은 이제 가장 절정에 오른듯 거침없이 산을 타고 내려오는 유록의 숲속에서 더욱 고고하게 빛나는 때기도 하다. 산을 찾아간다. 멀리 있는 유명한 산도 좋을 것이요, 대찰을 낀 명산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동네산 이라면 또 어떤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벚꽃이며 목련이며 진달래꽃 등 꽃을 피우고 나중에 나뭇잎을 밀어 올리는 꽃들은 졌다. 이제부턴 순리대로 잎이 나오고 나서 꽃이 피는 것들의 세상이다. 철쭉이 그렇고 애기사과꽃이 그렇다. 때이른 더위로 일찍 피었다 낙화를 서두르고 있는 라일락도 꽃잎사이로 피어난 잎새가 푸릇하다.
하루가 다르게 푸르러 가는 오월의 산을 오른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위치한 송라산으로 가는 길이다. 가족과 함께 산행하기 좋은 산이라는 입소문을 들었던 산이다. 이즈음에 가면 많은 꽃을 볼 수 있다고도 했다.
해발 500여미터이니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동네산' 치고 또 쉽게 생각할 산은 아닌듯 했다. 다만, 유명한 산이 안 되는지라 찾는 이가 별로 없어 등산로가 몇 군데 된다는데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 대충 짐작을 하고 길을 나서야 했다.
산으로 향하는 작은 오솔길이 놓여 있어 무작정 산길로 접어들었다. 소박하다 못해 참 평범하다 싶게 생긴 산은 산길도 가파르지 않고 평평하게 이어져 있었다. 가끔 길섶에서 볼 수 있는 꽃들이 그곳에도 피어 있었다.
제비꽃과 양지꽃 냉이꽃이 노랑, 보라, 흰색의 점을 찍듯이 피어 있는 모습이 평화로왔고 그 위로 오월의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 길이었다. 이어지는 평평한 길을 가면서 무언가 이상하다 싶어 방향을 바꿔 깊숙이 들어가 보니 산 한가운데 작은 소롯길이 보였다.
등산로라고 하기엔 작고 좁은 길, 풀들이 무성한 가운데 신비롭게 뚫린 길이었다. 그 길을 따라가 보니 갑자기 환하게 트인 공간이 나오고 어르신 세 분이 보였다. 갑작스러웠다.
그런 길이 있으리라곤 생각지도 못했고 그런 곳에서 사람을 만날 줄은 더욱. 더구나, 산을 뚫고 나와보니 산 가운데가 움푹 파이고 분지를 이룬 곳에 논이 떡하니 들어앉아 있는 모습은 자못 신기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산길 끄트머리 그늘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어르신 세분은 그곳에서 논일을 하시다 새참을 드시고 계셨던 모양이었다.
주변에 농기구가 널려있고 작대기에 기댄 지게도 보였다. 논에 물이 찰랑거렸고 그 한 편엔 모판의 모가 어른 손가락 크기만큼 자라있었다. 생각해 보니 머잖아 모내기 철이었다.
"어르신, 송라산이 어딘가요?"

▲2005년 5월 1일 활짝 핀 할미꽃과 각시둥글레. 송라산엔 각시둥글레가 많이 식생하고 있다. ⓒ 김선호
농사를 짓다가 그늘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계시는 어른들께 길을 물었다. 어르신 중 한 분이 손가락을 들어 앞쪽을 가리켰다. 송라산은 민가를 두르고 있는 작은 산을 빠져나와 분지 속에 들어가 있는 논과 밭을 지난 저쪽 건너편에 제법 높다란 봉우리를 두른 채 거기에 서 있었던 것이다.
물론 제대로 된 등산로가 따로 있을 터였지만 길을 잘못 들어 헤매다 만난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었던 것 같다.
혹시 우리가 잘못 본 것은 아니었을까 싶을 만큼 비현실적인 풍경이기도 했다. 산을 빠져나와 갑자기 마주친 세 분의 어른들은 산신령이 아니었을까. 펼쳐진 다랑이 논에 풍요롭게 찰랑거리던 논물하며 그 아래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며 뻗어있던 넓다란 밭가에 핀 하얀 조팝나무 행렬이.
"이런 곳에서 논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많이 필요할텐데 물은 어디서 끌어 오지요?"
"저기 송라산 계곡에 호수를 연결해 물을 대고 있지요."
과연 파랑색 비닐호수가 산길로 연결되어 있었다. 송라산에서 다랑이논으로 흘러드는 물은 비닐호수를 통통하게 채우고 있었고 아이들은 그 느낌이 좋은지 말리는데도 자꾸만 비닐호수를 건드려 보았다.
비닐호수를 따라 가다 그제야 제대로 송라산 입구에 들어서며 뒤를 돌아다 보았다. 제법 넓다란 평야지대가 분지 사이에 들어가 있었고 분지 가장 자리에 들어선 잣나무의 진초록색이 무척이나 싱그러워 보였다. 막걸리를 들면서 다리쉼을 하시던 할아버지 세 분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유명한 산이 아니기에 그저 아름아름 입소문을 듣고 오는 등산객 외엔 마을 사람들이나 간간히 산길을 오르는 송라산은 주말인데도 한적하기 이를 데 없었다. 마치 이 넓은 산을 우리 가족이 전세라도 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어깨가 으쓱해졌다.

▲2005년 5월 1일 송라산 8부 능선에서 정상 가는 길에 핀 노랑각시붓꽃 ⓒ 김선호
하얀꽃을 다닥 다닥 피운 조팝나무는 그곳까지 따라와 풍성한 꽃을 피워 숲을 환하게 밝혀 주고 있었다. 벌써 애기똥풀꽃도 제철을 맞았는지 하얀조팝나무와 조화를 이루듯 애기똥 같은 진노랑 꽃을 피워냈다. 언젠가 가르쳐 주었더니만 그걸 기억하고 아이들은 애기똥풀의 줄기를 꺾어들고 진짜 애기똥 같은 노란즙이 나오는지 살펴보고는 했다.
숲의 나무들은 가지마다 새 잎을 피우느라 바빠 보였다. 저마다 이름도 다르고 나뭇잎 모양도 다른 나무들이 똑같이 연두색 새잎을 피우는 오월의 숲. 유록의 숲은 비릿한 숲의 향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본격적인 등산로가 시작되면서 길섶에선 볼 수 없었던 꽃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저마다 다른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닌 우리들꽃을 만날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고 걸음은 감탄사에 반비례한다.
이럴 땐 빨리 가자는 남편의 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아이들 손 이끌고 정겨운 우리꽃에 눈을 맞추고 아는 꽃은 아는 꽃대로 모르는 꽃은 모르는 꽃대로 그 꽃에 맞는 이름을 불러 주는 일이 마냥 즐겁다. 산이 제법 가파른데다 에돌아가는 산길이 이어진다.
그러니 자연 발걸음이 느려지고 호흡은 가파오지만 산길을 돌아 어느 순간 만나게 되는 보라색 각시붓꽃, 노랑각시붓꽃은 지친 발걸음에 새로운 힘을 솟구치게 해주었다.
산길 어느 지점이었을까. 오래된 무덤가에 할미꽃이 지천이었다. 책으로만 보았던 할미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무덤가를 찾았는데 하마터면 밟을 뻔 했던 각시둥글레꽃을 만났다. 그곳에서 그꽃을 볼 수 있으리라곤 기대하지 못한 꽃이었기에 기쁨은 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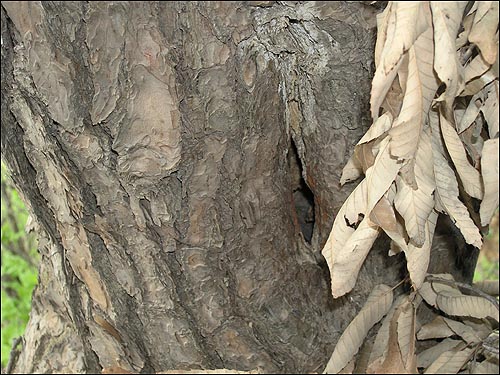
▲2005년 5월 1일 소나무에 뚫어 놓은 산새둥지 ⓒ 김선호
없는 솜씨를 부려 갓 피어나기 시작한 각시둥글레꽃을 카메라에 담았다. 주변을 둘러보니 각시둥글레가 지천이다. 양지쪽에 몇송이만 꽃을 피웠으니 다음 주에 오면 앙증맞은 종모양을 닮은 각시둥글레로 이 일대가 장관을 이룰 것 같았다.
각시둥글레를 보았으니 송라산을 찾기를 정말 잘했다 싶었는데 그 꽃은 신기하게도 산 전체에 고루 퍼져 있었다. 정상을 오르는 길까지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각시둥글레가 산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등산객의 소행인지 둥글레꽃 몇 개가 뿌리째 뽑혀 있기도 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진 않았지만 뽑힌 둥글레꽃을 흙속에 다시 묻어 주었다. 그 길은 산길까지 침범한(?)각시둥글레 때문에 조심스레 발을 내딛어야 할 정도로 각시둥글레가 군락을 이루었다.
산 중턱 즈음에선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으나 은방울꽃이 군락을 이룬 곳도 있었다. 은방울꽃 군락지를 만난 순간 어인 행운인가 싶었다. 좋아하는 꽃들이 나름대로 다를 것이지만 내 생각으로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은 은방울 꽃이 아닌가 싶다. 작고 앙증맞은 모습, 기품있는 하얀색꽃이 산길에 가득 피어나는 상상을 하며 다시 길을 오른다.

▲2005년 5월 1일 정상에 오르기까지 참 힘들었어요(아이들 뒤로 산벚꽃나무에서 하늘 하늘 꽃잎이 날렸다). ⓒ 김선호
동네 산이라고 쉽게 생각했는데 이 산은 상당히 가파른 길의 연속이다. 그 길에서 간간히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들과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웃는 낯으로 인사를 건네는 그들에게 나의 인사는 한없이 어색하다. 잊고 있었다. 그런 때가 있었다.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인사를 나누고 정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독려해 주던 때가.
언제부턴가 그런 인사들이 산속에서 사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산에 가서 그런 인사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없다. 그저 정상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물어보면 대답하는 정도의 친절은 보았지만.
누구랄 것도 없이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는 송라산이 문득 잃어버릴 뻔한 한가지를 일깨워 주었다. 산에서 만나는 당신과 나는 친구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깨닫자 어색하던 '안녕하세요'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먼저 나와준다. '안녕하세요, 송라산'.
산 정상에 올라 '야호'를 대신해 큰소리로 외쳐 보았다. 땀으로 흠뻑 젖은 몸을 송라산 정상의 바람에 내맡긴다. 바람이 어디선가 연분홍 꽃잎을 쏟아낸다. 절벽 아래 산벚꽃 한 그루가 보였다. 바람이 실어다 주는 꽃눈을 맞으며 산길을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