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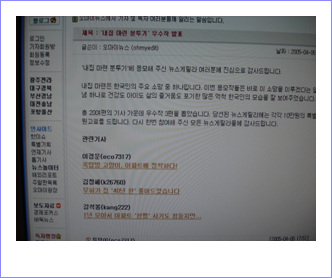
▲우수작으로 뽑힌 '내 집 마련 분투기' 응모글 ⓒ 김정혜
다음으로 기사공모를 한 것은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 부모님 자서전 대필’이었다. 그 주제를 본 순간, 나는 시아버님을 떠올렸다. 명절이나 아니면 집안일로 자식들이 모일 때면 시아버님께서는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당신 살아온 이야기를 하시기를 참 좋아 하셨다. 또 아침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주고받던 죽마고우의 부고를 접하셨을 때는 먼 허공을 바라보시며 인생무상에 며칠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셨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씀이 돈 많은 사람들이 살아생전 자서전 쓰는 그 호사스러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곤 하셨다. 그래서 나는 시아버님께 비록 제대로 된 자서전 형식은 갖추지 못할지라도, 그 흉내라도 내 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서전 대필이라는 참으로 뜻 깊은 글을 쓰게 되었다.
아버님과 함께 한 보름이라는 그 시간은 아버님의 며느리로 살아온 7년이란 세월을 다 뒤엎을 정도였다. 뜨거움으로 서서히 데워지는 가슴. 그 감동은 어느 사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으며 그 불꽃은 눈물 그리고 웃음을 만들며 영원히 내 가슴에 아로새겨 지고 있었다.
나는 <오마이뉴스> 편집부에 글을 넘기고 나서 그 글을 다시 인쇄하였다. 그리고 아버님 성함 석 자를 정성스럽게 쓰고 자서전이란 제목을 붙여 겉표지를 예쁘게 만들었다. 이번 어버이날 아버님께 선물로 드릴 참이다. 아마도 우리 시아버님은 그 어떤 자서전보다도 값지고 소중하게 생각하여 주실 것이다.

▲우수작으로 뽑힌 '부모님 자서전 대필' 응모글 ⓒ 김정혜
다음으로 ‘결혼 에피소드’공모였다. 우리집 벽 중앙에 떡 하니 걸려 있는 결혼사진.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보게 되는 그 결혼사진. 그것이 내게 말하고 있었다. 그 결혼사진의 실체에 대해서 한 번 써보라고. 결혼식 전날, 예기치 못한 불상사로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은 벌에 쏘인 것마냥 퉁퉁 부어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사진 속의 나를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럴 때마다 그 연유에 대하여 나는 똑같은 이야기를 아마도 수십 번은 더 설명한 것 같았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단 한 번도 지루하지 않았다. 그리고 듣는 이들도 한결같이 '이별여행 다녀와서 그런가. 어째 이 집에선 매일매일 깨가 한 대박씩은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 했다. 그리고 덧붙이는 나의 한마디,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거야’. 그건 바로 남편에 대한 철썩 같은 믿음이 있었기에 철없는 치기를 부릴 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남편은 당연히 나를 잡아 줄 것이라고 믿었다. 바꾸어 말하면 남편이 헤어지자고 말한다면 나는 당연히 남편의 바지가랑일 붙잡고 늘어질 것이기에. 왜냐, 우리는 부부일심동체라는 말을 무식하리만치 맹신하며 사는 부부이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이런 우스갯소리를 서로 한 적이 있다.
"내가 ‘우리 이제 헤어져’ 하는 말은 우리 오래오래 마르고 닳도록 같이 살자는 말로 해석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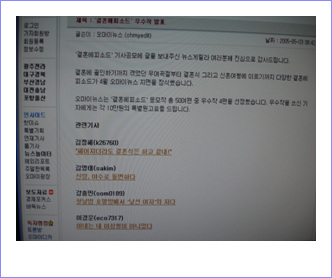
▲우수작으로 뽑힌 '결혼 에피소드' 응모글 ⓒ 김정혜
부부싸움. 그것처럼 싱거운 것은 없는 것 같다. 더더군다나 결혼생활이 횟수를 더해갈수록 부부싸움의 싱거움도 그 농도가 자꾸만 옅어져 감을 느낀다. 하여 이번 결혼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남편과 함께 그때로 시간여행을 떠나보았다.
추억. 그것은 지난 시간이기에 그 어떠한 것도 행복이라는 훌륭한 포장을 마다하지 않는 것 같다. 남편은 올해 결혼기념일에 그때 그 신혼 여행지를 다시 한 번 다녀오자고 한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오마이뉴스>가 내준 숙제를 나름대로 완성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훌륭하게 다 해낸 것 같다. 그리고 운 좋게도 다 ‘참 잘했어요’라고 별 다섯 개를 받았다. 다 우수작에 뽑혔으니 말이다. <오마이뉴스>가 다음번엔 또 어떤 숙제를 내줄지 그것이 많이 궁금하다.
덧붙이는 글 | 기사공모를 준비하면서 천금같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처 일깨우지 못한 것들을 새삼스럽게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획의 기사공모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