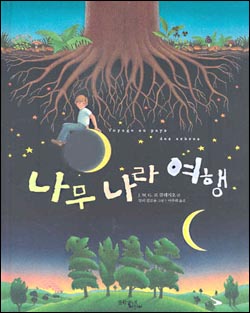
▲J.M.G. 르 클레지오 지음, 앙리 갈르롱 그림, 이주희 옮김 / 2005 ⓒ 문학동네
지은이 J.M.G. 르 클레지오는 '프랑스 문학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며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추천되는 거장이다. 클레지오의 작품세계에서 변함없이 나타나는 주제 중의 하나인 자연과 인간에 대한 통찰을 소년과 나무의 이야기로 풀어 나간다.
오래 전부터 소년은 숲 속을 거닐 때마다 나무들이 마치 말을 걸고 싶어 몸을 뒤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다. 하루는 이쪽으로, 또 하루는 저쪽으로 걷다 보면, 나무들이 꼭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물론 쳐다보면 나무들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가지를 벌린 채 수많은 잎사귀를 바람에 팔랑대며 서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무들이 한자리에 머문다고 믿게 할 속셈을 지닌 나무들의 속임수이다. 하지만 소년은 나무들은 꼼짝 않고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무들은 수줍음을 많이 탄다. 그래서 사람이 다가오면 뿌리에 바짝 힘을 주고 죽은 체하는 것이다.
나무들은 휘파람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좋아한다. 그래서 새와 매미를 겁내지 않는다.
소년은 나무를 길들이기 위해 조심조심 숲속을 걷다가, 빈터 한가운데 앉아서 부드럽게 휘파람을 분다. 한동안 휘파람을 불면 나무들은 조금씩 몸에서 힘을 뺀다. 커다란 가지가 우산처럼 조금 더 벌어지고, 느슨해진 뿌리가 천천히 땅 밖으로 나온다. 뿌리와 가지의 힘이 풀리면 숲 곳곳에서 이상한 커다란 하품소리가 들려온다.
나무를 길들일 줄 모르는 사람에게 숲은 고요하다. 하지만 새처럼 휘파람을 제법 불 줄 알면, 곧 나무들이 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심장이 뛰는 듯한 묵직한 소리, 한꺼번에 바스락거리며 가지를 뻗고 잎을 살랑거리고 줄기의 주름을 펴는 온갖 소리, 그리고 휘파람 소리가 들려온다. 나무들이 나무들의 말로 대답을 하는 것이다.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새들의 지저귐으로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새소리와 닮긴 했어도 새소리가 아니다. 나무들이 휘파람을 부는 것이다. 소년은 나무들의 휘파람 소리를 알아듣게 되었다. 나무들이 하나 둘 말을 하기 시작해서 다 함께 이야기를 할라치면, 떠들썩한 휘파람 소리와 하품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온다.
나무들의 나라에서 나무를 길들이면, 나무가 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나무들은 곳곳에, 잎사귀 하나하나에 눈이 있다.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나무들이 수줍어 눈을 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다.
소년은 되도록 부드럽게 나무들처럼 한두 개의 음을 부드럽게 불었다. 그러면 흔들리는 작은 잎사귀마다 하나씩 하나씩 달팽이의 눈처럼 천천히 눈이 열린다.
까만 눈, 노란 눈, 분홍 눈, 짙은 파란 눈, 연보랏빛 눈, 온갖 빛깔의 눈들이 빈 터 한가운데 앉아 있는 소년을 바라본다. 나무들의 눈길은 이상하리만치 부드럽다.
나무들은 제각각이다. 이름이 '위뒤뒤뒷'인 참나무는 점잖다. '퓌우우윗티윗'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작나무는 놀 궁리만 하는 나무다. 존경받는 단풍나무의 이름은 '훗'이다. 숲의 왕인 늙은 참나무의 이름은 '폐하'라는 뜻의 '우투유'이다. 나무들은 소년을 '작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윗’이라 부른다.
나무들은 언제나 이야기를 나눈다. 비소식과 날씨, 폭풍우, 숲 반대쪽에서 날아온 소식들을 주고받는다. 자작나무와 사시나무는 귀가 아플 만큼 쉴 새 없이 재잘재잘 이야기하는가 하면, 수많은 잎을 흔들기도 한다. 소나무와 주목과 수양버들은 침울하다. 개암나무와 호두나무, 밤나무는 모질고 사납다. 이따금 성을 내며 요란스레 딱딱거리기도 한다. 참나무와 단풍나무는 가장 말수가 적다. 은백양나무는 못 말리는 수다쟁이들이다.
전나무들은 숲의 파수꾼이다. 누가 다가오면 곧 비가 쏟아질 것처럼 바늘 같은 잎을 바지런히 떨며 쏴아아 소리를 낸다. 그러면 나무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고 차려 자세를 한다. 눈을 감고 가지를 움츠리고 죽은 체하는 것이다.
"이윗, 오늘 밤에 춤추러 올래?" "그럴게."
나무들의 초대를 받은 소년은 검푸른 하늘에 보름달이 환하게 빛날 때쯤 빈터에 다다른다. 나무들을 친구로 둔 소년은 무서울 게 없다. 어린나무들은 노래하고 늙은 참나무들과 존경받는 참나무는 망을 본다. 어린 나무들이 빈터에 둥그렇게 모여 노래하며 춤을 춘다. 마치 사람들처럼, 하지만 몸놀림은 느릿느릿, 흔들흔들, 뿌리 끝으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소리친다. "티위투 티위 티위투!" 제자리에서 천천히 돌아 옆에 선 나무의 가지에 가지를 부딪치고, 반대 방향으로 빙그르르 돈다.
키가 비슷한 어린 삼나무와 짝이 된 소년은 한 바퀴 돌 때마다 팔을 뻗어 삼나무 가지에 부딪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투웃 툿 툿 툿 투우웃."
이윽고 달이 숲 저편으로 모습을 감추자, 나무들의 춤사위도 멎는다. 참나무들이 온 숲에 들리도록 우렁찬 휘파람 소리를 낸다. "자, 이제 잘 시간이다!"
나무들은 하나 둘 잎사귀의 눈을 감고 잠이 든다. 소년도 잠이 쏟아진다. 소년은 빈 터 한가운데 융단처럼 깔린 이끼 위에 누워 눈을 감는다. 함께 춤추던 나무들이 내뿜은 온기로 잠자리는 훈훈하고 포근하다. 늙은 참나무가 곁에서 밤새 지켜주고, 소년은 아침 이슬이 내릴 때까지 다디단 잠을 잔다.
앙리 갈르롱의 신비롭고 독창적인 그림과 함께 이야기에 빠져 들다 보면 어느새 어른들의 무딘 마음도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과 같아져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집 책장에 고이 모셔두고 몇 번이고 손길 가는 대로 읽어볼 참이다. 그러다 보면 대충 한 번 읽어내고만 우리 딸내미도 어느 날 문득 엄마처럼 읽고 느낄 테니까. 엄마와 딸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만큼 더 우리 모녀의 영혼도 가까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