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입학식 장면, 새내기의 풋풋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 김형태
종업식과 졸업식 때문인지 2월하면 자꾸만 '이별, 아쉬움, 안타까움'이란 단어가 소금쟁이처럼 맴돌고, 한 학년 진급과 입학식 때문인지 3월하면 '만남, 새로움, 설렘'이란 낱말이 물안개처럼 피어납니다.
어느새 종점 같은 2월을 보내고, 또 다시 출발점 같은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교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2월이 마치 섣달그믐 같고, 3월이 정월 초하루처럼 느껴집니다.
3월1일, 새해 첫날 같은 기분입니다. 송구영신(送舊迎新)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이 달과 이 날을 맞이합니다. 분명 떠나보냈는데도 지난 학년 아이들이 제 눈 안에 그렁그렁합니다. 교편을 잡은 지 15년이 넘었는데도 저는 아직도 새내기 교사처럼 계속되는 만남과 이별이 낯설기만 합니다.

▲언뜻 생명이 없는 고목 같아 보이지만, 분명 새봄을 잉태하고 있는 나목입니다. ⓒ 김형태

▲감이 떨어져나간 자리가 마치 생채기처럼 남았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 김형태
오늘, 밖에 나가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고목 같은 겨울나무들, 그러나 고목(枯木)이 아니라 나목(裸木)이었습니다. 나무는 겨우내 알몸으로 추위에 떨면서도 새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 떠나보낸, 어쩌면 시간과 추억까지도 훌훌 털어버린 빈 가지라서 홑몸인 줄 알았는데,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달걀 안의 병아리처럼 그 여리디 여린 가지 끝에서 새봄이 아지랑이처럼 꼼지락거리며 부화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목련, 명자나무 등 나뭇가지마다 봄을 준비하는 꽃망울이 마치 여인의 젖가슴처럼 탐스러웠습니다.
작년 가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잎새와 꽃과 열매들을 다 떠나보내고, 더불어 나비와 꿀벌과 새들까지 모두 떠나버린 후, 하얀 된바람에 속절없이 울었을 나무…. 그러나 나무에게는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자유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꽃사슴처럼, 또는 북극곰처럼 이미 몸 안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알몸으로 혹독한 겨울을 넉넉히 이겨낸 것도 어쩌면 몸 안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서로 눈높이를 맞추며 자라는 겨울나무를 보며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 김형태

▲꼬리치며 봄을 맞는 모습이 이름 그대로 ‘버들강아지’입니다. ⓒ 김형태

▲마침내 겨울을 이겨내고 새봄을 분만하는 산수유 꽃망울, 저절로 옷깃이 여며집니다. ⓒ 김형태
새봄을 준비하고 있는 겨울나무를 보면서 큰 깨달음을 얻음과 동시에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얼마나 나무와 닮은꼴일까?' 어떤 점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1년 동안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던 아이들을 겨울과 함께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이별의 아쉬움에 젖어있을 새도 없이 새로운 아이들의 얼굴을 익히고 더불어 힘겨운 씨름을 해야 합니다.
내일이 입학식입니다. 34명의 학생을 다시 맞이합니다. 선보러가는 사람처럼 자꾸만 가슴이 콩닥거립니다. 자연에게서 한수 배웠으니, 새봄을 맞는 겨울나무의 마음가짐으로 '어린왕자'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목욕재계하고 이발도 새로 하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최대한 봄의 차림으로 '저의 새싹들'을 맞으려 합니다. 참, 자두맛 알사탕도 준비해야겠네요. 내일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에서 하나씩 나누어주면서 한 마디 할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 사탕처럼 달콤하게 지내자~."

▲‘어린왕자들’을 만난 생각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솜사탕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 김형태

▲아침이슬을 머금은 풀잎처럼 싱그러운 아이들을 봄의 눈높이로 맞으렵니다. ⓒ 김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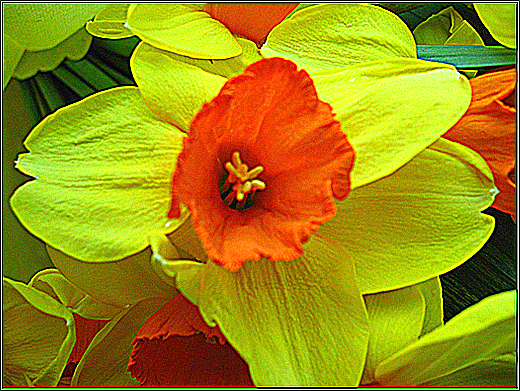
▲한 떨기 수선화처럼 아름다운 마음가짐으로 나의 새싹들을 맞이하렵니다. ⓒ 김형태
저와 새롭게 인연을 맺는 34명의 아이들도 저처럼 가슴 설레며 내일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아이들 모두 우리의 만남이 우연(偶然)이 아니고, 인연(因緣), 아니 더 나아가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필연(必然)이라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3월의 첫 단추를 끼웠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 날 한번 보았지만, 아직 한 명의 얼굴도 제대로 모릅니다. 내일 입학하는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 이름을 외웁니다. 1번 고명훈, 2번 김국환, 3번 김대규…. 그러나 웬일인지 쉽게 암기되지 않습니다. 그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일까요?
그것은 아닌 듯합니다. 자꾸만 지난해 아이들이 오버랩 되기 때문입니다. 1번 고명훈… 그러면 자꾸만 지난해 1번 강병무가, 2번 김국환… 그러면 지난해 2번 김근호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작년 아이들의 번호와 이름이 빨리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야 새로운 아이들의 번호와 이름이 쉽게 자리잡을 텐데 이렇게 진도가 느려 큰일입니다. 과연 오늘 34명의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가슴에 조금은 따뜻함이 남아 있다는 생각에 위로가 됩니다. 그만큼 지난해 아이들과 정이 듬뿍 들었다는 뜻이겠지요. 새로운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면서 지난해 아이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때는 교편을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더디지만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번호와 이름을 외우고 있습니다. 1번 고명훈, 2번 김국환, 3번 김대규….

▲새로운 아이들과 다시 손잡고 서로의 눈높이를 맞추어가며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렵니다. ⓒ 김형태
덧붙이는 글 | 미디어다음과 서울방송(SBS) 등에도 송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