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김용택 시화선집-언제나 나를 찾게 해주는 당신 | | | ⓒ 이종암 | 시(詩)는 예술의 타 장르인 노래(음악)와 그림(회화)에 깊은 친연성(親緣性)을 갖고 있다. 우리 문학사에서는 오래 전부터 '시가(詩歌)'라는 이름으로 시와 노래는 한 몸으로 불려져왔다. 그리고 중국 북송의 소동파는 당나라의 선배 시인 왕유의 시를 일러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畵中有詩 詩中有畵)'고 언급한 바 있다. 이렇듯 시 속에는 노래와 그림의 성격이 짙게 배여 있다.
시와 그림이 멋지게 결합된 시화선집을 도서출판 랜덤하우스중앙에서 나왔다. 김용택의 시화선집 <언제나 나를 찾게 해주는 당신>이 바로 그것이다. 이 시화선집은 김용택 시인이 이미 상재한 9권의 시집에서 직접 48편의 시를 가려 뽑고, 그 시의 내용에 맞춰 반구상 선종훈 화가가 그린 그림 28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아름다운 시와 그림들을 찾아 나서자.
빈들에서
무를 뽑는다
무 뽑아 먹다가 들킨 놈처럼
나는
하얀 무를 들고
한참을 서 있다
때로
너는 나에게
무 뽑은 자리만큼이나
캄캄하다 - <빈들> 전문
'캄캄하다'는 용언이 실감나게 직접적으로 다가온다. 사랑에 가슴을 베인 자의 먹먹함과 막막함이 바로 '캄캄하다'는 것 아니겠는가. "무 뽑은 자리만큼이나"이나 캄캄한 시적 화자의 마음 덩어리가 저 시커먼 무 그림이 아닐까. 한 덩이의 시커먼 무 그림은 밭고랑에 무가 빠져나온 시커먼 허공이기도 하고, "무 뽑아 먹다가 들킨 놈처럼" 너 때문에 멍하니 정신을 잃고 서 있는 시적 화자의 마음과 몸의 모양이기도 하다.
요즘 같이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좋은 시와 그림을 한꺼번에 감상하는 맛은 각별하다. 시 속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또 그 림 속에서 시가 솟아나온다.
 | | | ▲ 선종훈 그림-빈 들 | | | ⓒ 이종암 | | 김용택은 이른바 '섬진강'의 시인이다. 섬진강과 논밭에 몸뚱이를 대고 살아가는 농민들의 정서를 유장한 가락으로 잘 길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첫 시집 <섬진강>(창작과비평사,1985)은 세상에 널리 회자되었는데, 필자의 대학시절 문학개론 시간 시험 대신 리포트를 쓰기 위해 끙끙거리며 그 시집을 읽던 기억이 새삼스럽다.
누렇게 탈색된 그의 첫 시집을 펼쳐보면서 세월이 많이 흘러갔음을 느낀다. 첫 시집을 낸 시단의 초년병이었던 그는 이제 우리 한국시단의 중견으로 서 있다. 그의 첫 시집이 나온 지 20년도 더 지난 지금 변하지 않은 게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김용택 시인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섬진강과 강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시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다.
내 등짝에서는 늘 지린내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업은 누이를 내리면 등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지요
누이를 업고
쭈그려 앉아 공기놀이나 땅따먹기를 하면
누이는 맨발로 땅을 차며
껑충거렸지요 일어나보면 땅에는 누이의 발가락 열개 자국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누이 발바닥에 묻은 흙을 두 손으로 털어주고 찬 두 발을 꼭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이 가득 남실거리는 물동이를 이고 서서 나를 불렀습니다
용태가아, 애기 배 고프겄다
용태가아, 밥 안 묵을래
저 건너 강기슭에
산그늘이 막 닿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 밭을 다 갈아엎은 아버지는 그때쯤
갱기 지고 큰 소를 앞세우고 강을 건너 돌아왔습니다
이 소 받아라
아버지는 땀에 젖은 소 고삐를 내게 건네주었습니다. - <이 소 받아라 - 박수근> 전문.
우리 근대 서양화가 가운데 가장 한국적 빛깔의 그림을 그린 이로 나는 박수근을 꼽는다. 이는 나만의 억지일까. 흑백 필름 속에나 남아있을 법한 지난 60년대적 풍경 즉 공동우물터에 빨래하는 여인(아지매들), 아이 업은 단발머리소녀(누부야), 나목(겨울나무)이 서 있는 뒷골목의 풍경들은 박수근 그림의 주된 제재였다.
김용택의 위 시에는 박수근 화가가 나오지 않는다. 그냥 부제(副題)가 박수근일 따름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박수근 화가가 그렸던 그 한국적 서정을 빌려 시인의 어린 시절의 한 풍광을 우리 앞에 펼쳐놓는다. 40~50대 중·장년들에게는 누구나 어린 시절의 이런 풍경이 가슴 깊이 머물고 있다. 나도 이 시를 읽으면서 어린 시절에 수도 없이 들었던 목소리 하나가 환청으로 들려왔다. 미자네 집 담벼락에서 해 저물도록 딱지치기 하다가 어머니에게 붙들려 들어오면서 귀 따갑게 들었던 그 소리. "이노묵 소상아, 밥 안 묵꼬 뭐 하노." 아, 그 소리가 정겹다.
아래의 그림은 어떤 시의 내용과 한 자리에 놓여있는 그림일까. 사람의 한 몸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 아닌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의 몸으로 만나 서 있는 그림인가. 아무튼 이 그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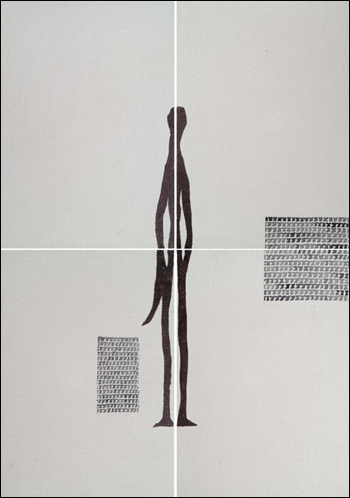 | | | ▲ 선종훈 그림-사랑 | | | ⓒ 이종암 | | 사랑을 노래한 그림이다. 이 그림의 옆 자리에 서 있는 시<사랑>의 중간 부분이다.
"당신을 잊으려 노력한/지난 몇 개월 동안/아픔은 컸으나/참된 아픔으로/세상이 더 넓어져/세상만사가 다 보이고/사람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다 이뻐 보이고/소중하게 다가오며/내가 많이도/세상을 살아낸/어른이 된 것 같습니다/당신과 만남으로 하여/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이/모두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고맙게 배웠습니다/당신의 마음을 애틋이 사랑하듯/사람 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 | | ▲ 선종훈 그림-봄비2 | | | ⓒ 이종암 | | 위 그림 옆에 자리한 시 <봄비 2>는 다음과 같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운 당신이 하얀 맨발로
하루 종일 지구 위를
가만가만 돌아다니고
내 마음에도 하루 종일 풀잎들이 소리도 없이 자랐답니다. 정말이지
어제는
옥색 실같이 가는 봄비가 하루 종일 가만가만 내린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 <봄비 2> 부분
지구 위를 하루 종일 돌아다닌 '봄비'에 대지는 놀랍게도 반응하여 생명의 잔치를 연다. 풀잎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인데, 그 봄비를 당신과 동일시하여 바라보고 있다. 내 마음에 푸른 잎과 예쁜 꽃을 피우는 당신 그리고 봄비.
시선집에는 김용택 시인의 오랜 지인(知人)인 안도현 시인이 가장 좋아한다는 시 <그 여자네 집>이 있다. 90행(行)에 가까운 이 감동적인 시는 고등학교 국어(상) 책에도 실려 있는데, 나는 아이들과 이 시를 함께 읽으면서 몇 번이나 그림을 그려보았는지 모른다. 아무튼 훌륭한 시 속에는 그림과 노래가 살아있다. 그럴수록 더 좋은 시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
|
|
언제나 나를 찾게해주는 당신 - 김용택 시화선집
김용택 지음, 선종훈 그림, 랜덤하우스코리아(2006)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