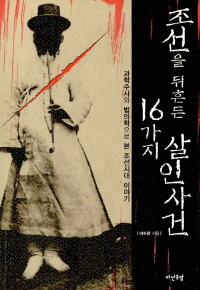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 ⓒ 다산초당
이수광의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은 독특한 접근방식으로 역사를 돌아보게 해준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모습을 통해 조선 시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돼 있는데 1부는 양반들의 살인에 관한 것이다. '책상물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양반들이 무슨 살인을 할까 싶지만, 감추어진 역사를 들춰보면 그들 역시 '욱!'하는 성질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아무리 공자 왈 맹자 왈 했어도 욕망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던 것이다.
선조 36년, 재상 유희서가 살해된 채로 발견된다. 재상이 죽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살인을 청부한 이가 왕의 아들 임해군이라는 것이다. 남부러울 것 없는 왕의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재상을 죽이라고 시켰는가? 이유는 바로 여자. 여자 때문에 참으로 기괴한 짓을 벌인 셈이다.
문제는 이 사건의 전모가 쉽게 밝혀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또 그렇지가 않다. 요즘 말로 하면 '권력형 범죄'인 탓이다. 전모가 밝혀진 지 얼마 안돼서 중요한 증인들이 살해당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진다. 임해군이 범인이라는 것을 밝힐 증거가 감쪽같이 사라진 셈이다. 그러자 임해군이 모함이라며 반격해오고 왕은 팔이 안으로 굽듯 임해군을 감싸준다. 그 결과 포도청만 쑥대밭이 되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그대로 묻혀버린다. 예나 지금이나 정의도 권력 앞에서는 맥을 못 췄던 게다.
@BRI@세종 9년에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살인사건이 있었다. 사대부의 여종이 살해된 것이다. 당시의 문화로 보면 여종이 죽은 것은 큰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전모가 세상을 놀라게 한다.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세종의 총애를 받던 집현전 응교 권채가 아내와 함께 여종을 학대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학대했기에 그리 세상을 놀라게 했을까? 끔찍하게도 오줌과 똥 그리고 구더기를 먹게 했던 게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잡혀온 권채는 '내가 뭘 잘못했냐?'며 되레 의금부를 꾸짖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글을 배울 줄은 알아도 부끄러움은 알지 못한다!" 당시 조사를 하던 이가 세종에게 고한 말이다. 그렇다. 권력 앞에서는 아부를 하면서도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는 더없이 잔악한 지식인의 면모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권채는 조사를 받다가 여종을 학대한 것은 아내라고 거짓말했던 것이다. 기막히게도, 예나 오늘이나 고위층들은 집안문제가 생기면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게다.
2부에서는 여성들의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다. 조선 시대의 여성들 또한 잔악한 짓을 저질렀는데 그 동기가 의미심장하다. 정조 14년, 양갓집의 젊은 부인 안 소사가 노파를 살해했는데 그 과정이 섬뜩하다. 한 번 꾸짖고 칼로 찌르기를 무려 열여덟 번이나 반복한 것이다. 도대체 왜 그랬던 것일까? 노파가 안 소사의 정절을 욕보이는 소문을 몇 년간 냈기 때문이다. 정절을 소중하게 여기던 여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효종 8년에 노비 연향이 주인 홍준래를 죽인 사건도 의미심장하다. 홍준래가 연향의 아들을 때려죽이자 난동이 벌어진다. 그 과정에서 노비는 주인을 죽이게 되고 이 사건은 관가에 알려지게 된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능지처참이다.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지 못하는 법률이 있던 그 시대, 정당방위일지라도 노비가 주인을 살해하면 대역죄인이 되는 것이었다. 생각할수록 안쓰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어쨌거나 이 사건은 노비들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3부는 도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임꺽정은 물론 불량배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검계, 포도청 종사관과 포졸을 사칭하며 해적질을 한 김수온 일당, 부처를 운운하며 수많은 부녀자들을 농락하고, 급기야 왕족을 사칭했던 사이비 교주 손처경 등이 소개되는데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흥미롭다. 감춰졌던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4부는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들에 대한 이야기다. 조선 시대도 나름대로 법의학의 입장으로 과학적인 수사를 했었다. CSI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선뜻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기초는 <무원록>에서 시작된다.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는 뜻의 '무원'을 제목으로 하는 이 책은 수사 지침서, 혹은 법의학 사전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갖고 시체를 조사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언제나 통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증거가 있어도 담당자가 묵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증거가 없어도 담당자가 만들 수 있었다는 말이다.
세종 때 약노라는 여인은 옥살이를 무려 10년 동안이나 했다. 이유는 주술로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진상은 이렇다. 약노가 밥을 먹여줬는데 누군가 죽었다. 증거는 없지만, 죽긴 죽었으니 심각한 용의자가 된다. 조선 시대에는 유력한 용의자라면 조사를 할 수가 있었다. 조선 시대의 조사! 사극에서도 나오지만, 그 잔인함을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나중에 약노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 주술을 해서 죽였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다.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 죽이지 않아도 문제, 죽였다고 해도 문제인 셈이다. 때문에 약노는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게다.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저자는 살인사건이라는 소재를 갖고 조선시대의 문화와 생활관, 그리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다. 더욱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교훈까지 주니 <조선을 뒤흔든 16가지 살인사건>의 무게감은 묵직할 수밖에 없다.
추리소설처럼 재밌으면서도, 웬만한 역사서에 뒤지지 않는 알찬 내용을 담았고 교과서보다 교훈적인 사실들을 또한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조선을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