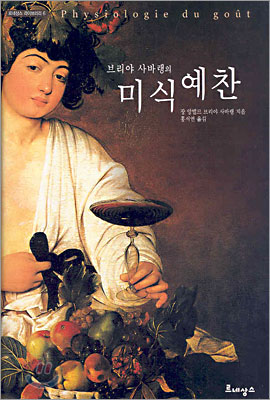
ⓒ 도서출판 르네상스
<브리야 사바랭의 미식 예찬>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전이자 '미식의 경전'으로서, 처음 출판된 지 20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프랑스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책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책의 저자는 요리사도 아니고 작가와도 전혀 무관한 법률가여서 흥미롭다. 딱딱한 법조문을 읽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틈틈이 사냥과 음악, 독서와 식도락을 즐겼던 프랑스의 한 판사가 자기 생애를 아퀴짓는 유일한 저작의 주제로 왜 하필이면 '미식법'을 선택했을까?
미식법(la gastronomie)은 인간이 식생활을 영위하는 한에서 인간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이다. 미식법의 목적은 가능한 한 가장 좋은 음식을 수단으로 하여 인간의 보존에 주의하는 것이다. 미식법은 음식물로 전환될 수 있는 사물들을 찾고 공급하고 요리하는 모든 사람을 지도함으로써 그 목적에 도달한다. (79쪽)
이처럼, 그에게 있어 '미식법'이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비싸고 맛있으며 몸에도 좋은 고급스런 요리를 먹는 방법'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도모하고 삶을 영위하는 수단으로서 음식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식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인간과 세계를 들여다보는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하고 넓은 창문으로서 미식법을 고른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셈이다. 그가 살았던 시공간이, 모든 지식을 체계화하려는 계몽주의 백과전서파의 야심 찬 기획이 드높았던 18세기 후반의 프랑스와 맞물리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렇게 여겨진다.
그래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거의 모든 분야로까지 뻗어나간다. 미각, 식욕, 소화작용과 같은 생리학의 수준에서부터 음식 재료의 분류, 분석, 조리법 등을 다루는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불의 발견에서 레스토랑의 탄생에 이르는 식생활의 역사에서부터 음식이 휴식과 잠과 꿈과 죽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철학적 성찰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종횡무진이다.
그런가 하면 음식과 관련하여 저자 자신이 체험한 일화들과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모아 놓은 책 맨 뒤의 '모음집'에서는 유머러스한 저자의 문학적 풍미까지 맛볼 수 있으며, 체험에서 우러난 경구들을 모아놓은 책 맨 앞의 '잠언'에서는 촌철살인적인 저자의 기지에 감탄하게 된다. 이 책이 단순히 미식법을 주제로 한 '백과사전'으로 불리기보다는 미식법의 '경전'이라고 상찬을 받는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터이다.
사실, 이 책의 저자가 스스로 미각 쾌락을 주관하는 열 번째 뮤즈인 가스테레아 여신에게 매일 경배를 드리는 열렬한 신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먹는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다른 동물로부터 인간을 구별 짓는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라고 믿는데 그치지 않고, 우주 전체가 가스테레아의 제국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진지한 통찰과 일상의 세심한 발견들을 담고 있는 이 책에는, 지나친 열정에 사로잡힌 독실한 경배자들이 가끔 저지르는 무리한 억측과 주장들도 눈에 띈다.
이를테면, '말을 잘하는 기술과 잘 먹는 기술 사이에는 언제나 깊은 동맹관계가 있었다'라는 통찰은 참으로 빛나는 것이지만 '언어가 생겨나고 발달된 것은 바로 식사 도중이었다'라는 단언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새로운 요리의 발견은 새로운 천체의 발견보다 인류의 행복에 더 큰 기여를 한다'라는 주장에는 누구라도 고개를 끄덕이겠지만 '요리는 모든 기술들 중 문명 생활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기술이다'라는 주장에 쉽게 동의할 독자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저자의 이러한 지나친 단언과 주장도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는 어느덧 별 저항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은 고풍스러운 멋이 담긴 은근한 유머와 쾌활하고 낙천적인 세계관이 글의 갈피마다 새겨져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익숙한 양념으로 알맞게 간을 하고 먹기 좋게 잘 익힌 음식이라면, 비록 그것이 낯선 것이라도 우리 입에서 술술 잘 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뉴질랜드에도 '먹을 수 있는 우주'가 내 앞에 가득 펼쳐져 있어
그렇다. 음식에 관한 한 대단히 보수적이었던 나는 여기 뉴질랜드로 이민 와서 한동안은 한국 음식만 고집했었다. 집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외식을 하더라도 내 입에 익숙한 한국 음식만 찾아다녔었다. 그러다가 이곳의 낯선 풍경에 조금씩 눈이 익어가고 이곳의 익숙지 않은 언어에 조금씩 귀가 뚫리면서, 내 입도 조금씩 조금씩 이곳의 음식을 맛보며 낯선 음식들에 맛을 들여갔던 것이다.
낯선 땅이기는 했지만,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기는 했지만, 이 책 <브리야 사바랭의 미식 예찬>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 뉴질랜드에도 '먹을 수 있는 우주'가 내 앞에 가득 펼쳐져 있었던 것이다.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 같아 꺼렸던 양고기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고, 가스불에 통째로 굽는 뉴질랜드식 소시지 구이도 즐겨 먹게 되었으며, 향이 너무나 강해 입에 대지도 못했던 코리앤더도 지금은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라도 입맛을 다시며 아쉬움을 달래야만 하는 음식들이 있는 것이다. 두릅과 멍게처럼 내가 고국에 두고 온 음식들, 여기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들 말이다. 특히 입맛 도는 봄철이면 그런 향기로운 음식들이 더욱 간절해진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도리가 없다. 슈퍼에 가서 두릅 대신에 아스파라거스를, 멍게 대신에 초록입 홍합을 사와서 대신하는 수밖에.
덧붙이는 글 | <브리야 사바랭의 미식예찬 (Physiologie du goût)>
ㅇ 장 앙텔므 브리야 사바랭 (Jean-Anthelme Brillat-Savarin) 지음
ㅇ 홍서연 옮김
ㅇ 도서출판 르네상스 펴냄
ㅇ 2004년 11월 25일 초판 1쇄
ㅇ 값 2만5000원
이 기사는 인터넷서점 YES24의 독자리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