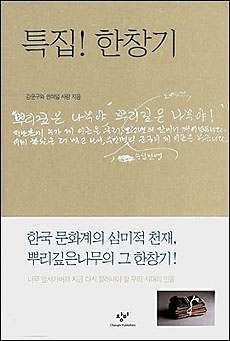
ⓒ 창비
말 혹은, 생각만으로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추억(기억)한다는 것은 구체적이지 못할 경우가 많다. 말과 생각이란 손에 잡힐 듯 또렷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허망하게 터져 버리는 비누거품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기억을 가장 효과적으로 남기는 방법은 글로 기록하는 게 아닐까.
여기 그 성향과 지향, 철학이 각기 다른 59명이 '글'로 기록한 기억 속에 뜨거운 화인(火印)처럼 살아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의 이름은 한창기(1936~1997).
지방 명문 고등학교를 나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면서도 판·검사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한국지사를 설립하고, 잡지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뿌리깊은나무>와 <샘이깊은물>을 주도한 사람. 구두선이 아닌 실천으로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고민한 사람.
바로 이 한창기를 가까이서 지켜본 지인들이 사후 11주기를 맞아 생전에 그와 함께 나눈 기억의 편린을 깨알같은 글씨로 채워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름하여 <특집! 한창기>(창비). 일평생 '잡지쟁이'로 살았던 이를 추모하는 책답게 그 제목과 형식도 '잡지풍'이다.
앞서 그의 생을 대충 뭉뚱그려 요약했지만, 이는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렇다면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창기의 어떤 면이 이처럼 적지 않은 이들로 하여금 그를 '흔쾌히' 추억하게 했을까? 59명 필자 중 하나인 설호정의 견해를 빌린다.
'몇 세대 앞선 선진적 업적을 남긴 언론-출판인이었으며, 미시적인 관찰력으로 머리카락에 홈을 파듯이 글을 쓰는 문화비평가였으며,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생동하는 광고 카피를 쓰는 카피라이터였으며, 심미안이 빼어난 격조 높은 문화재 수집가였으며… 국어학자가 울고 가는 재야 국어학자였으며….'언론-출판인에 문화비평가, 카피라이터에 문화평론가, 거기다 국어학자까지. 한 사람 안에 이처럼 폭넓은 프리즘이 존재한다는 것이 믿기 어렵다. 하지만, <특집! 한창기>의 출간에 관여한 59명 필자는 암묵적으로 아래와 같은 동의를 내리고 있는 듯하다.
"한창기라면 그럴 수 있다."
이제는 전설로 남은 <뿌리깊은나무>와 <샘이깊은물>1976년 <뿌리깊은나무>를 만들면서 "역사의 물줄기에 휘말려 들지 않고 도랑을 파기도 하고 보를 막기도 해서 그 흐름에 조금이라도 새로움을 주는 창조의 일을 문화 쪽에서 거들겠다"는 창간사를 통해 군사독재에 대한 은유적 저항을 보여준 한창기.
뒤이어 1984년 <샘이깊은물>을 내면서는 "이 문화잡지는 이른바 '여성지'가 아니라 '사람의 잡지'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일'에 관심이 많은 남자들도 탐독할 잡지입니다"라는 세련된 성(性)정치학적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의 눈은 이미 앞선 시대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수십 명의 필자가 수십 가지의 시각으로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며 쓴 글을 모은 것이기에 <특집! 한창기>를 한마디의 말로 정의해 규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이들 모두는 한창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 하여, 이 책의 재료는 '그리움'이다.
수록된 원고 하나 하나가 모두 빼어나지만, 기자가 특히 눈여겨본 글은 강운구가 쓴 '한창기 사진', '열여섯 가지 금기를 무시하고 태어난 위험한 잡지'라는 제목으로 쓴 윤구병의 회고, 소설가 안정효가 쓴 '키보이스의 한글 탐험' 등이었다. 젊은 시절 한때 한창기를 사장으로 모신 김당 기자의 '천상천하 유아독종의 편집자' 역시 인상깊었다.
이제는 '전설'로 남은 <뿌리깊은나무>와 <샘이깊은물>의 해묵은 표지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것도 반가웠다. 이는 <특집! 한창기>가 독자들에게 주는 덤이 아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