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 ▲ 옥스포드스트리트의 어느 쇼핑몰 깔끔 쌈박한 현대식 빌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은지 150년이 훨씬 더 지난 낡은 건물이다. 서울에는 50년 된 건물이 몇 개나 있더라? |
| ⓒ 이중현 | 관련사진보기 |
영국인의 역사의식이웃나라인 프랑스가 별별 혁명과 전쟁을 거쳐 가며 피로써 민주주의를 획득하는 동안, 바다로 고립된 영국은 이렇다 할 유혈분쟁도 없이 딱 한방의 명예혁명으로 자연스럽게 의회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대륙의 다른 나라들이 끊임없이 변화와 창조를 모색하는 동안, 영국은 전통과 옛 것을 굳게 따르는, 어리석지만 올곧은 방식을 택하여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세계 곳곳을 정복하여 방대한 식민지를 통치하던 과거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영광스러웠던 탓인지 역사에 대한 영국의 집착은 대단하다. 새로 지은 건물에 일부러 석탄 검댕을 묻혀 수백 년쯤 되어 보이게 한 국회 의사당부터 런던 시내에 있는 다른 건물들까지 다들 그 나름의 역사성을 힘껏 뽐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 쓰러져가고 있다.
가정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곳 사람들이 '플랫(flat)'이라고 부르는 아파트는 참으로 고색창연하다. 현관의 초인종부터 시름시름 다 죽어가는 소리를 내면서 가슴을 아리게 하더니, 좁다란 나무 층계는 한번 오르내릴 때마다 우렁차게 삐걱댄다.
천장이 높은 것 하나는 괜찮았지만 이 나라 사람들 평균 신장이 250센티미터쯤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쓸데없이 너무 높다. 반면에 얇은 벽면은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아서 밤 10시 이후에는 음악은 물론 샤워조차 할 수 없고, 인류 최초의 좌변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꼬질꼬질 때가 낀 물건에는 수십 년 묵은 듯한 소변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데서도 사람이 사는구나"라는 내 말에 친구 상기는 "야, 그래도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했어. 여기 사람들은 집 안에서 신발 신고 살잖아. 청소하는 데만 한 달 걸리더라"고 답했다. 그래도 카펫(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닥에 깔린 회색 부직포) 정도는 그냥 말아다 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 보니, 가난한 유학생이 보증금 떼먹힐 일 있느냐고 갑자기 신경질을 부린다.
나중에 방을 빼게 될 때 집주인이 중개업자를 데려와서는, 저 닳을 대로 닳아 문드러진 테이블과 카펫, 찬장을 꼼꼼히 검사하고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견되면 가차없이 보증금에서 제한단다. 우리 나라에서라면 웃돈을 주고 가져 가래도 거들떠보지 않을 저런 허섭쓰레기들이 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사람보다 더 상전이 되고 있단다. 화내서 미안하다고 금방 사과는 하더라만, 상기의 표정에는 집에 대해 뭔가 말 못할 맺힌 것이 많아 보인다. 안쓰러워서 더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하겠다.
여기 사람들의 삶이 다 이럴 텐데 어디다가 하소연을 할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잘 사시던 집일 텐데, 그 정도의 작은(?) 불편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양아치 취급을 당하는 땅이 아닌가.
대영박물관? 영국박물관?
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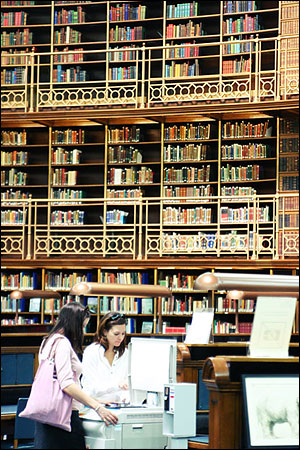
|
| ▲ 박물관 내부에 있는 영국 도서관 책 속에 파 묻혀 있으니 얼굴도 예뻐 보일 수 밖에.. |
| ⓒ 이중현 | 관련사진보기 |
아침 식사로 치즈 향이 물씬 나는 초밥을 꽉꽉 우겨넣고 있는 내게 상기는 오늘 어디로 가겠느냐고 물었고, 나는 예정대로 "대영박물관"을 외쳤다.
학술 연구의 전당이자 배움의 보고. 지역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전 세계 그 어떤 박물관보다도 고른 소장품을 가진 세계 최대의 박물관.
옛것 좋아하는 영국인들이 꾸며 놓은 박물관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와 전통의 산실 아니겠나. 입장료도 공짜다 보니 박물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런던에 처음 왔다면 대영박물관을 빼놓을 수는 없다. 그래, 로제타 스톤. 창세기전의 라시드 왕자가 이름을 딴 로제타 스톤을, 오늘은 직접 한번 봐 줘야겠다.
"대영박물관? 오! 대영박물관 좋지. 신기한 유물들이 참 많아 거기는. 난 거기서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냐면 말이야"하는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나, 대영박물관이라는 말에 상기의 반응은 더없이 시큰둥하다.
"도둑놈들한테 대영은 무슨…. 그냥 세계박물관 영국지부지…."대영제국의 박물관이라는 곳에 영국의 문화재는 별로 전시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조각을 비롯, 온동네에서 훔치고 약탈해온 문화재 일색이니 '도품박물관'이라 불러야 한다는 아주 전형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나는 대영박물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마다 항상, 우리야 어차피 남의 나라에 대해 배우는 입장인데 도품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는 생각을 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한다. 사방이 바다로 고립된 후진국 섬나라 일본은 삼국 시대부터 중국과 우리의 기술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면서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양반입네 눈 파란 오랑캐와는 교류하지 않겠네 하던 조선은, 결국 서양의 문물을 배워 익힌 일본에 주권을 내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았던가.
영국인들 역시 남의 역사라도 그저 파묻어 두는 일이 없다. 대영박물관이 세계의 박물관이 된 것은, 우리 것도 소중하지만 남의 것도 소중하다는 의식이 있어서 보여 줄 것도 많고 설명할 것도 많은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남의 나라로부터 배우려 하는 자가 가지게 될 것도 많으리라는 점만은 틀림없으니까.
대영박물관 한번 가 보지 않은 나의 이런 실용적 사대주의에 대해, 대영박물관에서 버스 두 정거장 거리에 사는 유학생 상기의 반발은 거세다.
브리튼섬과 북아일랜드만을 다스리던 영국은, 전세계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네 나라 이름에 건방지게 'Great'를 붙여서 'The Great Britain'이라 칭하기 시작했단다. 이 와중에 근대 이후로 착실하게 영국을 따라가던 일본은 'Great'라는 말에 가치를 크게 두어, 경외와 존경의 대상으로 '대영제국'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이 우리 나라에까지 건너오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대일본제국'이라는 말도 대영제국의 영국을 일본으로 바꾼데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상기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 모진 고초를 겪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대영제국이니 대영박물관이니 하는 말은 결코 써서는 안 된다고 핏대를 높인다. 이 녀석이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외국에 나오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아침 먹다 말고 나누는 이야기치고는 대단히 격조 높은 토론소재로다.
큰사진보기

|
| ▲ 2006년 월드컵을 앞두고 잉글랜드인들의 기대를 한 껏 모았던 웨인 루니 |
| ⓒ 이중현 | 관련사진보기 |
영국 와서 타워브리지랑 웨인 루니도 보면서, 그리스 이집트 바빌론 유물도 같이 볼 수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목소리와, 어디 니가 거기 가서 훔쳐온 물건들을 직접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올지 한번 두고 보자는 목소리가, 다 떨어져 가는 현관 문짝을 나설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경상도 사나이들, 고집 하나는 국제적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slrclub, 쁘리띠님의 떠나볼까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은 지난 2006년 6월~8월에 다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