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친근한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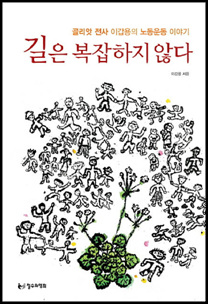
▲<길은 복잡하지 않다> 겉그림. ⓒ 철수와 영희
나는 골리앗 전사 이갑용을 서너 번 만났다. 한홍구 교수가 "대한민국 최대의 국민MT"라고 불렀던 지난 5월 30일, 그는 부인과 딸, 부인의 대학원 동기 몇 명과 함께 경복궁 현대해상 앞에 있었다. 그 뒤 두어 번 더 만났지만 늘 뒷자리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거나 가만히 술잔을 채워주는 정도여서 그가 노동 역사에 혁혁한 이름을 남긴 골리앗의 전사 이갑용이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길은 복잡하지 않다>라는 책을 쓴 뒤, 제목과 표지가 정해지면서 철수와 영희 출판사에 다니러 왔을 때에야 나는 비로소 그가 책의 저자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그는 늘 골목길 어디서 만나도 친근하게 목례를 하거나 안부를 묻는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와 전혀 다르지 않았기에 놀라움이 더 컸으리라.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게 심겨진 그릇된 편견의 소산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반공이 국시였던 시절, 반공포스터를 그릴 때마다 뿔 달린 괴물이나 긴 손톱을 가진 갈고리 같은 붉은 손으로 남한을 움켜진 형상을 북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노동운동가는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슈퍼맨이나 외계인 같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자신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전까지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노동자는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폭력적이고 거친 사람, 뭔가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내 그 어리석었던 생각과 편견은 소위 노동운동의 골수분자급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뼈아픈 반성을 거듭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이 가늘고 심성이 고운 사람들을 노동운동의 최전방으로 내몬 사회적 병폐와 부조리 불합리성을 철저히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소금꽃>의 저자 김진숙, 코스콤의 정인열, 기륭전자의 해고 노동자들, 그들은 하나 같이 여리고 고운 품성을 타고 난 사람들이었다.
눈물도 많고 남의 어려움을 보면 그냥 넘기지 못하는 그들은 우리네 아름다운 자연과 꼭 닮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한 줄로 줄을 세워 뒤에서 모진 채찍질을 하며 앞으로 앞으로만 내달리게 만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는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바로 이런 내 생각 자체가 편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겠다.
내가 바로 노동자이듯 노동운동의 전설적인 인물인 골리앗 전사 이갑용이 친근하고 편안한 우리의 이웃인 것은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노동운동이 이갑용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진실을 깨우치게 됐다.
이갑용의 글이 감동적인 것은 그가 뛰어난 노동운동가여서라거나, 울산 동구 구청장 재직 당시 수많은 개혁을 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뒤로도 피할 길이 없었고 골리앗이 거기 있어서 올라갔다"는 진실한 고백과 계급이나 권위의식과는 애초 거리가 먼 그저 평범한 이웃 모습을 하고 있어서다. 그리고 그런 이웃 모두가 자신이 노동자임을 인식하고 함께 할 때 노동자의 삶이 사람다운 삶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 알았던 걸 그때 알았더라면'이라는 후회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지금 알게 된 사실에 눈감지 않는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민주노총이나 조직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갑용의 실명 비판과 내부 고발적인 글은 뼈아픈 비판이 되겠지만 그 질책을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내부 개혁을 시작해야 노동운동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그들 자신이 더 잘 알것이다.
지금 알았던 걸 그때 알았더라면… 골리앗 투쟁을 떠올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다. 노동자들의 삶이 갈수록 강팍해지니 다시금 고공 농성이 잦아진다. 한진 중공업 김주익은 골리앗에서 목을 맸고, 기륭전자 여성들은 망루에 오르고. 옥상에 오르고 철탑에 올랐다. KTX여성 노동자들은 서울역 철탑에 올라 자신들이 일했던 기차가 드나드는 걸 봐야 했고, 콜트 콜텍 노동자들, 로케트전기 노동자들도 오랜 시간 좁은 고공 농성장에서 짐승처럼 싸웠다.
그뿐인가? 미포조선의 노동자는 회사 굴뚝에 올라가 손발이 얼어 터진 채 내려왔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한때 음식을 공급하던 밧줄을 스스로 끊으며 하늘에서 죽을 각오를 했었다. 그리고 망루에 올랐다가 타 죽은 용산의 철거민이 있다. 우리 모두가 사는 한 하늘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지금 이 사간에도 어디에선가 배낭을 짊어지고 눈물을 삼키며 하늘로 하늘로 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땅 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짐들을 혼자 짊어지고, 천근 같은 발걸음을 떼고 있을 사람들. 김주익이 골리앗에 혼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되는데 누가 거기에 위원장을 혼자 두었는가"라고 화를 냈다.
골리앗에 올랐던 경험 때문에 그 위에 혼자 있는 게 어떤 것이란 걸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골리앗에 올랐던 때 고립감과 절망감, 그리고 분노 때문에 내 한 몸 여기서 던지겠다는 동지들이 있었다. 동지들을 감시했던 덕에 다행히 일이 나지 않았지만, 혼자였다면 아마 뛰어내렸을 것이다. 김주익이 혼자 골리앗에서 지냈던 추석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골리앗(고공 농성)에 오를 거라면 계획을 잘 잡아야 한다. - 책 내용 중
나라면 그 길 위에서 어떻게 했을까?
처음엔 노동운동 이야기를 담은 글의 제목이 왜 <길은 복잡하지 않다>인지 의아했고 제목이 글의 내용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며 노동운동의 외길을 꿋꿋하게 걸어 온 이갑용의 노동운동 이야기를 그보다 잘 드러낼 제목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길이 아무리 여러 갈래여도 길 위를 걷는 사람은 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책을 통해 알게 된 내부의 부패나 변절 계급의식 패거리 짓기 등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흔들림 없이 외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며 끝없는 자기 성찰과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잘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노동자의 정체성을 자각한 내 자신에게 자문해 본다. '나라면 그 길 위에서 어떻게 했을까?' '뒤돌아서거나 멈춰서거나 곁길로 방향을 틀어 가지는 않았을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스치며 한홍구 교수가 반가움을 담아 전한 인사말이 떠올랐다.
이 책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조직도 없는, 그렇지만 싸움의 근육이 울퉁불퉁 살아있는 투쟁으로 노동운동을 바로 세우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찬 한 노동운동가가 지금 어디에선가 하늘로 오르는 사람들에게 바치는 눈물로 쓴 기록이다. 이 책을 덮으며 나는 역사에서 길은 단 한 번도 복잡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길은 복잡하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했을 뿐이다.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언제나 주저하고 남과 나를 분리 비교하려 하고 손익을 따지다 결국 실천하지 못하고 머릿속만 복잡했던 내게 섬광처럼 스치는 말 한 마디가 나를 길 위에 서게 할 힘이 될 것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