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위당 장일순 잠언집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 김익록 엮음 ⓒ 시골생활
오늘은 1990년 입추
산길을 걸었네
소리 없이 아름답게 피었다 지는
너를 보고 나는 부끄러웠네
무엇이 부끄러웠을까. 원래 꽃이 소리 없이 피었다 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 걸. 일제치하의 윤동주 시인이 하늘을 바라보며 잎새에 이는 바람 한 점에도 부끄러움을 느꼈다 노래했는데 무위당 장일순 선생은 꽃 한 송이의 피고 짐을 통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꼈단다. 그의 삶에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낄 일을 하지 않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데도 부끄럽다고 한다.
세상에는 수없이 부끄러움을 느낄 행동을 하고도 떳떳한 양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는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부끄럽다고 한다. 무위당 장일순 선생의 잠언집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비가 되고 깨달음을 갖게 하고, 성찰을 주고 위로를 주는 짧은 글들이 무위당의 서화와 함께 실려있다.
'무위당', '조 한 알' 장일순. 그의 책을 곱씹으며 몇 번이고 읽고 나서 그가 누군지 알기 위해 찾아보았다. 사실 이름은 들어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해 알고 있는 건 많지 않았다.
그의 이력을 보면 그저 평범하게 살아왔던 사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사회운동가 활동을 하였고, 정치활동을 하기도 했다. 1970년대엔 유신독재에 대한 투쟁을 하다 감옥에 가기도 했다. 80년대엔 스스로 자신의 호를 '조 한 알'로 칭하면서 자연복구를 주장하는 생명사상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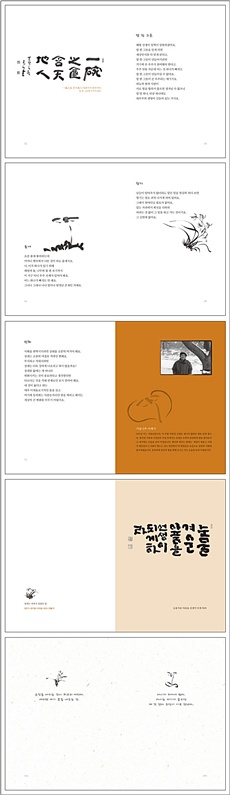
▲책속에서 볼 수 있는 장일순의 서예와 글. 보고 있으면 생각하고 편안해진다 ⓒ 시골생활
그러나 그는 감시의 눈초리 때문에 많은 글을 남기지는 않았다. 대신 서예 글씨를 남겼다. 그의 서예는 그만의 자연스러움이 절로 묻어난다. 만년엔 사람의 얼굴을 담은 '얼굴 난초' 작업을 했다. 표지의 그림도 바로 그 평안하게 웃는 '얼굴 난초' 모습이다.
무위당이 세상과 이별한 지도 16년.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기리며 그를 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잠언집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도 그 일환으로 나온 책이다. 책 속엔 그의 행적과 말씀과 인품을 엿볼 수 있는 짧은 글들과 서예와 서화가 조용한 미소처럼 때론 큰 깨달음의 말씀처럼 독자들을 대하고 있다.
거지에게는 행인이
장사꾼에게는 손님이 하느님이다.
그런 줄 알고 손님을 하느님처럼 잘 모셔야 한다.
누가 당신에게 밥을 주고 입을 옷을 주는지 잘 봐야 한다.
학교 선생님에게는 누가 하느님인가? 그렇다, 학생이다.
공무원에게는 누가 하느님인가? 지역 주민이다.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하느님이고
신부 목사에게는 신도가 하느님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장사꾼, 교사, 공무원, 대통령, 목사나 신부는 그들이 섬겨야할 하느님은 안중에도 없다. 하느님처럼 섬기는 게 아니라 군림하고 비재하고 부리고 있다. 장일순은 우리 사회의 그런 모습을 짧은 말로써 반성하게 한다. 느끼게 한다.
그의 말은 거창하지가 않다. 일상생활의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 못난 것들에서 잘난 것, 그러면서 깨지고 업어지고 상처 입은 것 모두를 소중히 여긴다. 공해문제나 환경문제의 원인도 나로부터 찾는다. 인간이란 존재도 자연의 하나일 뿐이고, 그러기에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일체가 되고 하나가 되는 속에서 생명의 모습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말과 글을 보노라면 자신을 한껏 낮추고 겸손해함을 볼 수 있다. 모두가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시대에 그는 낮추고 낮추며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것에서 진실함을 본다. '잘 쓴 글씨'란 짧은 글에 그런 마음은 그대로 드러난다.
추운 겨울날 저잣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파는 사람이 써 붙인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군고구마'라는 글씨를 보게 되잖아.
그게 진짜야.
그 절박함에 비하면
내 글씨는 장난이지.
못 미쳐.
그에게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고 고귀한 것은 삶의 진실성이고 절박함이다. 그런데 그의 그런 말들이 가슴에 와 닿는 건 삶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런 그를 두고 전 한양대 교수인 리영희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사회에 밀접하면서도 사회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면서도 본인은 항상 그 밖에 있는 것 같고,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고, 밖에 있으면서도 안에 있고, 구슬이 진흙탕 속에 버무려 있으면서도 나오면 그대로 빛을 발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없겠죠.'
그러나 이것 보다 다 공감 가는 말을 김지하 시인은 이렇게 들려준다.
'하는 일 없이 안 하는 일 없으시고, 달통하여 늘 한가하시며 엎드려 머리 숙여 밑으로 밑으로만 기시어 드디어는 한 포기 산속 난초가 되신 선생님.'
그의 말을 옮겨놓은 책은 조용하다. 그러나 울림이 있다. 작은 울림인 것 같은 조금만 마음을 기울려 들으려하면 큰 울림이 되어 얼얼하게 한다. 책장을 덮어도 다시 열고 싶어진다. 마음이 각박해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지 망설여질 때 장일순의 말을 들어보자. 조용, 조용한 그의 말을.
덧붙이는 글 | 한 포기 산속 난초 같은 사람, 장일순 잠언집 <나는 미처 몰랐네 그대가 나였다는 것을> /김익록 엮음 /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