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콜 소리에 잠이 깬다. 6시 40분, 이른 아침이지만 방은 환하다. 지난 밤 책을 읽다가 전등을 켜놓고 잠이든 까닭이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배인 습관인지라 별로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형광등을 켜놓고 잔 탓에 숙면을 취하지 못했노라고 혼자 투정을 부려본다. 찌뿌드드한 몸을 이끌고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한다. 제법 아침부터 덥지만 늘 그렇듯 온수로 샤워를 한다. 샤워 시작과 동시에 켜놓은 수도꼭지를 7시 30분이 넘어서야 잠근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얼굴에 스킨로션을 바르고 있자니 더위가 느껴진다. 에어컨을 켠다.
집을 나서 10분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요즘은 거의 매일 시내버스로 약1시간 걸리는 도서관으로 향한다. 버스를 타며 차벽에 새겨진 글자를 유심히 본다. 그 버스는 천연가스로 운행한다는 작은 안내문이 새겨져 있다. '이제 한국도 제법 친환경적인 사회가 되었다'고 뿌듯해한다. 도서관에 도착과 동시에 1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커피자판기에 넣고 달콤한 밀크커피를 뽑아든다. 1회용 컵에 담긴 커피를 마시고, 도서관 열람실로 들어선다.
채 더위가 느껴지기 전에 에어컨이 가동된다.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시작되었건만 긴팔 옷을 걸치지 않으면 한기가 느껴질 정도다. 이렇게 에너지 낭비와 함께 시작된 하루 일과는 온종일 크게 변할 것이 없다. 자판기에서 역시 1회용 컵에 담겨 나오는 커피 몇 잔을 더 마셨다는 것과 온종일 노트북 컴퓨터를 위해 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아, 또 하나 빼놓은 것이 있다. 화장실을 드나들며 "1장(4원)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힌 곳에서 뽑아 쓰는 몇 장의 티슈 말이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나의 일과이다. 두 세 시간에 불과한 아침 시간에 나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는가! 물론 가끔 에너지 남용에 대한 자기반성을 하곤 한다. 특히 커피 자판기 앞에 설 때면 컵을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는다. '귀찮아서…'라고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긁적이는 것으로 에너지 낭비에 대한 반성을 어느새 까마득히 잊는다.
환경의 내용을 담아 재생지에 인쇄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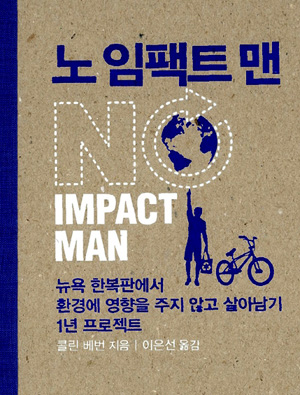
▲<노 임팩트 맨> 표지 ⓒ 북하우스
누군가는 이런 나의 일상을 비판하겠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나와 비슷한 정도의 에너지 낭비를 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임팩트 맨'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임팩트 맨이 뭐냐고? 콜린 베번의 저서 <노 임팩트 맨(No Impact Man)>에서 'no'를 제외하면 바로 우리 스스로의 이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 임팩트 맨, 바로 환경에 어떠한 '충격'도 주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다. 고로 우리는 '환경에 충격을 가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대개의 책이 그렇듯 이 책 역시 그 제목에는 적지 않은 뜻이 담겨 있다. 저자인 콜린 베번은 '노 임팩트'가 산술적으로 성립하는 개념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기초적인 수학, 예컨대 '1-1=0'이라는 등식이 보여주듯, 환경 문제도 '마이너스 임팩트 + 플러스 임팩트 = 노 임팩트'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그러한 생각에 항변한다.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문제였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늘려 서로 상쇄할 수 있을까? 적어도 1년 동안 나쁜 일보다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따라서 이 책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내가 몇 안 되는 우리 가족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대한 줄이면서 살았던 한 해 동안의 이야기이다."(33~34면.)저자가 "철학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환경의 문제는 수학의 등식과 같이 성립할 수 없다. 우리는 왜 이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 저자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것이다. 예컨대 1회용 종이컵을 이용해 커피를 한 번 마신 자가 환경을 생각해 다음 날 유리컵에 커피를 타서 마신다고 해서 종이컵 사용이 없었던 일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아마도 '엎지른 물'이란 표현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다른 것은 차후의 문제로 삼더라도 우리가 읽는 책은 어떠한가? 사실 이 문제는 <노 임팩트 맨>을 읽는 사람이라면 직관적으로, 아니 촉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손에 쥐는 순간, 우리가 그 동안 읽었던 책과는 사뭇 다른 촉각이 전해져오기 때문이다.
저자는 영문판의 제작후기에서
"이 책은 염소를 쓰지 않고 100퍼센트 재활용한 종이와 판지로 제작되었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밝히는 바이다"(302면)라고 말하고 있거니와, 한국어 번역판 역시 저자의 뜻에 따라 재생지에 인쇄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뭔가 책을 쥐는 느낌이 다르다. 내가 책을 처음 쥐었을 때 느낌은 '골판지에 인쇄했나?'였는데 그 느낌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손에 쥘수록 정감이 가고, 글을 읽는 동안 눈도 상당히 편했다.
실패했지만 도전 그 자체가 아름다운 기록이 책은 다리 열 개, 꼬리 하나 가족의 친환경 생존기이다. 그런데 이들 가족의 구성이 상당히 독특하다. 작가 본인은 투덜이고, 아내는 모피 쇼핑광이다. 어린 딸은 아직 종이 기저귀를 사용해야 할 만큼 어리다. 게다가 환경 따위에는 관심도 없을 강아지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바로 뉴욕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역사 저술가가 아내와 딸, 강아지 한 마리와 함께 환경에 어떠한 충격도 주지 않기로 작정하고 1년을 보낸 기록이다.
게다가 이들의 프로젝트 도전기는 어떤 면에서는 무모해보이기도 한다. 몇 번을 읽어도 웃음이 나는 이 문장은 함께 읽어볼 만하다. 저자는 '노 임팩트 맨'이 되기 위한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를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기'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비행기와 자동차는 물론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는다. 자전거와 삼륜차, 킥보드를 타고, 가까운 거리는 두 다리로 부지런히 걷는다. 그래도 못 가는 곳(처가)은 가지 않는다."(뒤표지 안쪽면)만약 출가한 딸이 환경보호를 위해 친정에 오지 않겠다면 우리네 부모님들은 뭐라 말씀하실까, 혼자 생각을 하자니 웃음이 먼저 나온다. 저자의 표현대로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도 있고, "허세"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밝힌 대로 우리가 낭비하는 에너지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도전은 정말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그것이 실패로 귀결되었더라도 말이다.
이 책은 성공한 프로젝트의 기록이 아니라, 실패한 기록이다. 왜 아니겠는가? '노 임팩트 맨'이라는 말처럼 환경에 아무런 충격(영향)을 주지 않고 산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그렇지만 그것이 실패한 것일지라도 그 '도전'은 그 자체로 정말 아름다운 것이며, 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적지 않다.
한가지 더 밝혀두고 싶은 것은 <노 임팩트 맨>의 저자는 끊임없이 환경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환경에 관한 한 아마추어다. 본래 역사 저술가인 그가 이 책을 쓰며 환경에 대해 공부하고, 또 환경 보존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는 과정은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이 책을 읽고 난 뒤 내 일상은 크게 변하고 있다. 에어컨 전원을 켤 때에도,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망설이게 된다. 나의 변화가 지구의 환경보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으나 그 첫 걸음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자, 이제 '임팩트 맨'이란 우리의 이름에 '노(No!)'를 붙여보는 것은 어떤가.
덧붙이는 글 | 콜린 베번의 체험기인 <노 임팩트 맨>은 6월 17일 영화로도 국내에서 개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