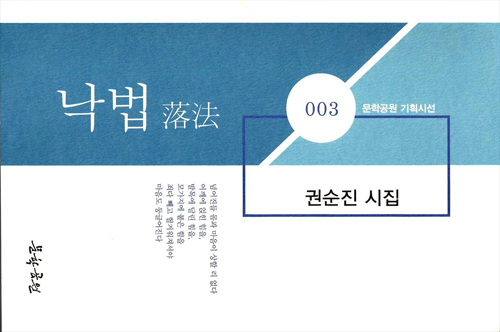
▲권순집 시집 <낙법>의 표지 ⓒ 정만진
새장 안의 새와 눈을 마주치는 것은참 민망한 일이다작은 구멍 하나 내어주지 못하는 일은더욱 가련하고새의 눈이 가슴에 와 박혀손바닥만큼 그물을 벗겨낼 때얼른 날아가 주지 못하는 새를바라보는 몇 초 동안은나도 새와 함께 불구가 된다절름발이 앵무가 된다권순집 시인의 첫 시집 <낙법>에 수록된 시 '피안의 새' 전문이다. 시에서 새는 인격체이다. 시인의 눈에 새의 눈은 곧 사람의 눈이다. 그러나 시인은 새를 위해 '작은 구멍 하나 내어주지 못하는' 그런 '민망한' 사람이다. 그래서 스스로 자학한다. 갇혀서 날지 못하는 새나, 가련한 그 눈을 바라보기만 하는 인간이나 '불구'이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늘상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고만 살 수는 없다. 시인은 새장 안의 새를 바라보며 가슴아파 하지만 '피안' 안으로 내가 함께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만 '몇 초 동안'이나마 새와 같은 마음이 되고, 절름발이가 되는 것이다. 그래도 그 '몇 초'의 시간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에 권순진은 시인이다.
시 '유도(留島)'도 절창이다. 전문을 읽어보면 아래와 같다.
김포에서 강화도 가는 뱃길을비집고 들어가다 보면둥둥 떠다니는 외로운 한 섬유도를 만난다분단의 틈바구니에사람 모두 떠나버리고이제는 백로와 뱀의 천국인,백로는 뱀의 새끼를 잡아먹고뱀은 백로의 새끼를 잡아먹는,서로가 서로의 밥을 위해새끼를 까야만 하는 유도의 비애지금 그곳 그들의 안부가 궁금하다.유도라는 한 작은 섬을 노래하고 있지만, 사실은 분단 조국에 대한 애달픈 읊조림이다. '분단의 틈바구니'란 표현이 직설적으로 그런 심상을 나타내주고 있지만, 시 첫머리에 등장하는 '비집고 들어가다 보면'이란 구절부터 그 의미가 심상하지 않다. 유도는 강화도 뱃길 어느 지점쯤에 있는 섬인 듯한데, (배도 아닌) 시인이 그 물길을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 한반도가 바로 그렇다. 태평양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올라오면, 오끼나와와 일본해협, 그리고 대마도와 제주도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야 한다. 중국과 한반도 사이로, 아니면 일본열도와 한반도 사이로 그렇게 '비집고' 들어와야만 정박할 수 있다.
비행기를 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런던이든 뉴욕이든 직선으로 날아서는 오지 못한다. 강대국들이 쳐놓은 그물망을 피해 '비집고' 비행을 해야만 착륙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틈바구니'에 우리는 '외롭게'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혹 현재적 생존을 위해 후손들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 보아야 한다. '밥을 위해' 새끼를 사지로 내모는 '비애'의 주인공은 아닌지 말이다.
리서치앤리서치가 2011년 2월에 실시한 전국 경제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 조사를 보면, 통일을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제인의 69.7%가 '통일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차근차근 통일비용을 적립하여 후손들의 영원한 행복을 담보해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내게 안겨올 통일비용 부담이 더 심각하다는 인식이다.
이것이 '분단의 틈바구니'에 '사람'이 '모두' '떠나버'린 형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 서글픈 일은, 시에서는 시인이 있어 그들의 안부를 궁금해하지만, 과연 분단조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안부는 그 어떤 누가 있어 털끝만큼이라도 궁금해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권순진 시인은 문단에 등단한 지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했다. 40대 후반에 시인의 이름을 얻었으니 이른바 '늦깎이 시인'인 셈이다. 그러나 왕성한 활동을 통해 늦은 출발을 모두 상쇄했다. 계간 <詩하늘> 편집동인, 계간 <스토리문학> 부주간 활동과 대구일보에 '권순진의 맛있게 읽는 시' 연재가 바로 그것이다. 이제 첫 시집을 발간한, 대기만성형의 무게감을 지닌 시인 권순진의 창작활동에 대구 문인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