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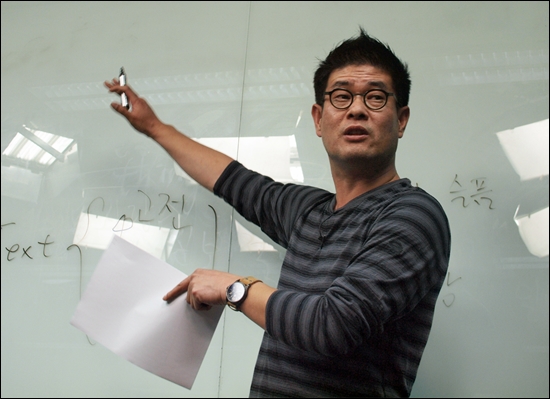
|
| ▲ 강신주 박사가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 강의실에서 '철학 고전읽기' 강의를 하고 있다. |
| ⓒ 김동환 |
관련사진보기 |
"우리가 보통 도가의 노장사상이라고 해서 노자와 장자를 한데 묶는데 사실 노자와 장자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100명짜리 강의실이 촘촘하게 메워졌지만 고정관념을 가로지르는 강신주 박사의 질문에 대답하는 수강생은 없었다. <철학 VS 철학>의 저자 강신주 박사는 지난 21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오마이뉴스> 강의실에서 열린 '강신주의 철학 고전읽기' 여섯 번째 수업에서 장자의 철학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노자와 장자의 차이에 대해 "노자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찾으려 했고, 장자는 '길은 자기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박사는 이날 강의에서 <장자>와 <사기> 등의 내용을 인용하며 "장자는 소통(疏通)이라는 개념에 집중했던 철학자이자, 인간은 항상 자유롭게 살아야 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요약했다.
장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유로운 영혼'장자는 중국 전국시대 송나라 출신의 철학자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여러 사상가들과 그 학파들을 일컫는 제자백가 중에서도 도가로 분류된다. 장자는 그 철학의 심오함과 매력 때문에 폭넓은 사랑을 많이 받는 철학자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장자를 너무 좋아했던 독일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직접 <장자>의 영역본을 독일어로 번역한 일이나, 부버의 번역을 통해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장자를 즐겨 읽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강 박사는 강의에 들어가며 수강생들에게 <사기열전>을 통해 철학자 장자를 소개했다.
"장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사기>에 나옵니다. 초나라 위왕이 장자가 재주 있다는 말을 듣고서 재상으로 모시려 귀한 선물을 주며 극진히 대우하는데 장자는 시큰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준) 천금은 큰 이익이고 재상은 존귀한 자리이다. 그렇지만 당신은 도시 밖의 예식에서 희생으로 쓰인 소를 본 적이 없는가? 수 년 동안 배불리 먹인 후에, 그 소에게 무늬가 있는 옷을 입히고 조상의 묘로 끌고 간다. 그 순간에 그 소가 자신이 단지 버려진 송아지이기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즉시 나가라. 나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국가를 가진 자의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더러운 도랑 속에서 즐겁게 헤엄치면서 놀겠다. 평생토록 나는 벼슬살이를 하지 않고 나의 뜻을 유쾌하게 할 것이다.'강 박사는 "사마천이라는 역사가의 눈에 비친 장자는 국가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인간은 항상 자유롭게 살아야 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왕에게 맞서는 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정약용이 지은 국가 행정지침서인 목민심서(牧民心書)의 목(牧)은 말이나 소를 키울 때 쓰는 글자입니다. 사람들을 마소로 보는 감각이 목민심서에 있는 거지요. 얼마나 오만합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소예요? 이런 시각에게 장자는 '니가 뭔데 나를 길러. 쓸데없는 소리마라'고 일갈하는 겁니다. 장자적 시각에서 보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거나 생산력을 증진시키거나 경제를 발전시키는 건 마치 잡아먹을 소에게 잘 입히고 잘 먹이는 것처럼 결국에는 국민들을 써먹기 위함이라는 얘기지요. 국가가 요즘 애 낳으라고 합니다. 연금보험도 내야하고 세금도 필요한데 이대로 가면 낼 사람이 없으니까요. 말하자면 '소'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너희들이 필요한 소니까 너희들이 키워줘!'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지요.""길은 걸어가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장자>는 이러한 장자의 사상이 담긴 책이다. 지금 출간되어 있는 <장자>는 위진(魏晉)시대의 사상가 곽상이 편집한 것으로, 총 33편 6만 4606자로 이뤄져 있다. 33편은 <내편>, <외편> 그리고 <잡편>으로 나뉘는데, <내편>에는 7편, <외편>에는 15편, 그리고 <잡편>에는 11편이 실려 있다.
강 박사는 "<내편>에 속하는 7편은 전국시대 중엽에 살았던 장자 본인의 사상을 나름대로 충실히 반영하고 있지만 <외편>과 <잡편>은 장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사상적 영향을 받은 장자 후학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종의 논문집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장자>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며 만들어진 만큼 다양한 사상적 경향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읽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자는 특히 소통이라는 개념에 집중했던 철학자입니다. 소통(疏通)은 마음을 '터버린다'는 의미의 '소(疏)'와 타자와 '연결한다'는 의미의 '통(通)'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타자와 연결되기(通) 위해서는 마음의 선입견을 터버려야만(疏) 한다는 것이지요. <장자>에서 '허(虛)'나 '망(忘)'이란 개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강 박사는 마음에서 모든 선입견을 버린다는 것과 <장자> 제물론에 등장하는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이라는 구절을 장자 사상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로 꼽았다.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 구절은 '길은 걸어가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원문에서는 물위지이연(物謂之而然 : 사물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된 것이다)라는 말과 대구를 이뤄 쓰였다.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이라는 구절은 장자 사상의 핵심을 압축하고 있으면서 장자와 노자 사이의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찾아가지요? 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도행지이성(道行之而成)은 내가 걸어가야 길이 만들어집니다. 도가 무엇인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타인과의 관계에 미리 정해진 정답은 없다"
도가 무엇인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강 박사는 <장자><지락>편에 있는 노나라 임금과 바닷새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노나라 임금이 바닷새를 사랑해서 이 새를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술을 권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양을 잡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새는 어리둥절해하다가 사흘만에 죽어버렸어요. 저는 사랑이 함께 있으면 기뻐하는 마음과 사랑의 대상에 대해 알려고 하는 마음이 합쳐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나라 임금은 바닷새와 함께 있는 것이 기뻐서 잡아두기는 했는데 바닷새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았어요. 이건 노나라 임금이 혼자서 바닷새와 사랑하는 방법을 미리 정해두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셈입니다. 바닷새와 나는 다르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시도했어야 하는 것이지요."강 박사는 "흔히 알려진 '조삼모사'의 예도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삼모사는 <장자><제물론>에서 유래한 말로, 송나라에 가족의 양식까지 퍼다 먹일 정도로 원숭이를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르는 원숭이가 너무 많아 힘에 부친 그가 하루는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이제부터 아침에 셋, 저녁에 넷 주겠다고 하자 성을 내던 원숭이들이 아침에 넷, 저녁에 셋을 주겠다고 하자 기뻐했다는 내용의 고사성어다.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는 보통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을 지칭할 때 쓰이곤 합니다. 하지만 원숭이를 기르는 사람이 원숭이를 정말 좋아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원숭이가 너무 많아져서 그가 원숭이들에게 줄 수 있는 도토리의 양은 하루에 일곱 개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곱 개를 가지고 계속 제안하면서 원숭이들과 합의점을 만들어갑니다. 노나라 임금은 자기 식으로 그냥 밀어붙였지만 원숭이 키우는 사람은 밀어붙이지 않아요.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강 박사는 "타인과의 관계 역시 도를 구하는 것처럼 정해진 정답, 정해진 방법이 없다"며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관계에 임해야만 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