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과 에세이와 인문학 같은 도서는 자주 찾아서 읽어보지만, 시는 거의 읽어보지 않는다. 왠지 모르게 '시' 하면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읽어봐야 할지 잘 모르겠고, 그냥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방식 그대로 시를 마음으로 읽기보다 분석을 해야 읽을 수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추리 소설, 에세이, 라이트 노벨 같은 종류의 작품은 언제나 읽는 작품이라 전혀 알지 못하는 작가의 작품도 흥미가 생기면 쉽게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시집 같은 경우는 도무지 쉽게 읽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는다. 시가 아름답다는 것은 알지만, 그 아름다움을 가슴으로 잘 느낄 수가 없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시를 읽을 때마다 한 번도 시를 그 자체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다. 언제나 시가 쓰인 역사적 시기와 배경을 토대로 시를 분석하고, 어떤 낱말이 어떤 함축적 의미를 가졌는지 분석하면서 시를 읽었다. 시를 시로 읽는 게 아니라 풀어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래서 시는 아직도 다가가기 어려운 문학이다. 지하철역의 스크린 도어에는 항상 이름 모르는 작가들의 시가 쓰여 있지만, 그냥 눈으로 대충 읽기에 시와 공감을 나누지 못한다. 분명, 나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책 읽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시 읽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시는, 아직 너무 먼 존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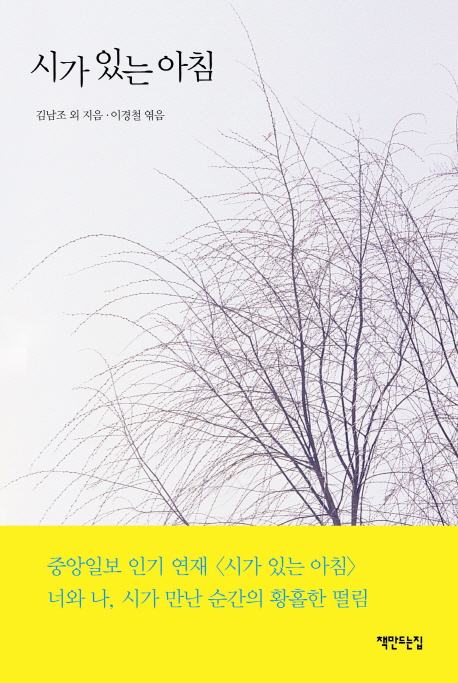
▲시가 있는 아침 ⓒ 책 만드는 집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시를 얼마 전에 읽게 됐다. 이번에 내가 집어 든 시집은 <시가 있는 아침>이라는 이름의 시집으로 다양한 시인의 시를 읽을 수 있는 시집이었다. 조금씩 시를 읽다 보니 작년에 내가 유일하게 읽은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가 떠올랐는데, 놀랍게도 그 시기도 9월이었다.
작년에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의 시>를 읽은 이유는 어떤 책을 읽다 언급된 윤동주의 시가 그냥 먹먹하게 느껴져서 시집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고개를 창문으로 돌리면 보이는 하얀 구름이 수놓아진 파란 가을 하늘은 사람이 가진 감성을 살며시 꿈틀거리게 한다.
그런 가을의 맞이하는 시기였기에 나는 그동안 전혀 손을 대지 않던 시집을 읽었다. 시집에 적힌 모든 시를 한 번에 다 읽지 않고, 천천히 시 한 편을 읽으며 소위 말하는 '문학청년' 흉내를 냈다. 과거 중·고등학교 시절 때처럼 시를 분석하지 않고 시를 시로 읽는 기분은 새삼 다르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이후 나는 시를 읽지 않았는데, 올해도 9월에 들어서 우연히 <시가 있는 아침>이라는 시집을 읽게 됐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이 시집은 한 작기의 시를 엮은 시집이 아니라서 다양한 작가의 시를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의 시를 천천히 감상할 수 있었다.

▲아침 해를 바라볼 때 ⓒ 노지현
최근에 나는 다시 아침 해가 뜨는 풍경을 촬영하고 있다. 여름에는 너무 일찍 해가 뜨고 그 빛이 뜨거워 사진을 찍지 않았지만, 가을로 접어들면서 햇빛이 부드러워지는 동시에 가을 하늘과 아침 해가 만드는 풍경은 다시 카메라를 집어 들게 했다. 위 사진은 바로 어제 찍은 아침 풍경이다.
이번에 읽은 시집의 제목에도 '아침'이 들어갔는데, 참 잘 지은 제목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아침 해가 뜨면서 때로는 붉게, 때로는 옅은 주황으로 물들이는 아침의 풍경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문학적 감성이 눈을 뜨는 듯하다. 시를 모르더라도 아침 사진 한 장에 시 한 구절 쓰고 싶은 욕심이 든다.
그래서 나는 <시가 있는 아침>의 시를 아침마다 읽었다. 비록 내가 사람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풍경을 찍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상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글을 적지 못하지만, 아침마다 무거워지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여유를 주는 동시에 따뜻함을 주고자 시를 읽었다.
솔직히 시를 읽어도 잘 모르는 시가 많았다. 그냥 글자를 읽고, 여백을 읽고, 그려진 일러스트와 실린 사진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때때로 텅 빈 공간에 그림이 그려지는 시도 있었지만, 나에게 있어 '시'는 여전히 '시'가 아니라 분석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는 듯했다. 참,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이 시를 읽고, 시에서 감동할 수 있을 때는 진짜 어른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아픔을 알아야 소주의 맛을 알 수 있다는 일부 사람들의 말처럼, 시 또한 문학을 읽는 작은 소년에서 어른이 되어야 시를 시로 느끼면서 그 풍경을 심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나라는 사람은 나름 책을 많이 읽고, 나름 풍경 사진을 찍고, 나름 때때로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히고, 나름 피아노를 치면서 내 마음의 풍경을 떠올리는 나름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아직 시는 좀처럼 그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시를 읽는 동안 하나 됨을 느낄 수가 없었다.
시집 <시가 있는 아침>은 눈을 뜨면 보이는 아침 풍경에 작은 감성을 더해주었지만, 나는 시에 적힌 깊은 감성에 취하지 못했다.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만화책에서 종종 보았을 가을바람에 긴 머릿결을 나부끼며 웃는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뿐이니, 어찌 문학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냥 오늘도 어른이 되지 못한 채, 가을 하늘 아래에서 때때로 읽고 싶어지는 시 한 구절을 읽는다.
<가을 앞에서> - 조태일이제 그만 푸르러야겠다.이제 그만 서 있어야겠다.마른풀들이 각각의 색깔로눕고 사라지는 순간인데나는 쓰러지는 법을 잊어버렸다.나는 사라지는 법을 잊어버렸다.높푸른 하늘 속으로 빨려 가는 새.물가에 어른거리는 꿈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노지현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 <노지의 소박한 이야기>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