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20, 30대 청춘을 1980년대와 보낸 한국 시인들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개인의 잘못은 아니다. 시대가 그랬다. 독재와 전횡을 거듭하던 부도덕한 정권은 결 고운 마음씨를 가진 젊은 시인이 등장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 야만의 시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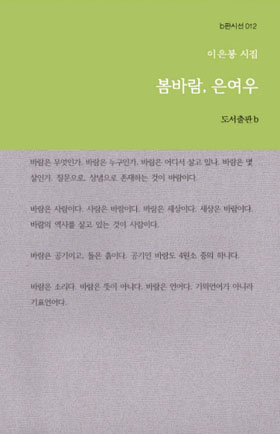
▲이은봉 신작 시집 <봄바람, 은여우> ⓒ 도서출판b
이은봉(63)도 그 시대와 무관할 수 없었다. 날을 세운 풍자와 거친 시어가 그의 작품 속에서 꿈틀거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출간된 첫 시집 <좋은 세상>이 그랬다.
붉은 피와 푸른 청춘이 시집 속에서 갈등했고, 불의와의 반목 끝에선 불꽃이 튀었다. 시집의 제목은 "좋은 세상은 아직 멀었다"는 역설이었다. 그때 이 시인의 나이 서른 셋이었다.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무엇이 너를 키우니> <첫눈 아침> <걸레옷을 입은 구름> 등 여러 권의 시집이 이은봉의 머리를 거쳐 손끝에서 탄생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대학교수가 돼 학생들을 가르쳤고, <실사구시의 시학> <시와 생태적 상상력> <화두 또는 호기심> 등을 통해 문학평론도 병행했다.
바로 그 이은봉이 새로운 시집을 들고 독자들과의 만남을 청했다. 이름하여 <봄바람, 은여우>(도서출판b). 기자가 만난 이번 시집은 갑년을 넘긴 노시인이 부르는 '이순(耳順)의 노래'처럼 들린다. 여기서 노시인이란 '늙은 시인'이란 의미가 아니다. 아래와 같은 시에서 보이는 '한소식 한 승려'와 같은 목소리를 들어보라.
봄바람은 둑길가의 민들레 씨앗털이다등 떠밀지 않아도 절로 날개를 파닥거린다민들레 씨앗털은 지금 촉촉이 젖고 있다초록강아지들 흥건히 껴안고 있다- 위의 책 중 '봄바람' 일부 인용.봄에 부는 바람을 '파닥이는 날개'로, '초록강아지'로 표현한 감각을 보자면, 이은봉은 아직 젊다. 기자가 '노시인'이라 칭한 것은 사물의 본질과 세계의 운행법칙을 읽어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시어의 세련됨과 풍부함을 이야기한 것이다.
사람 좋은 웃음 뒤에 숨긴 서늘한 시심(詩心)

▲잘 웃는 시인 이은봉. ⓒ 이은봉 SNS
이은봉은 문단에서 '잘 웃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어지간해선 얼굴 찡그리고 화내는 법이 없다. 시종여일 빙그레 웃는 낯이다. 그 웃음 속엔 서늘함과 따스함이 동시에 담겼다. 깊숙한 생의 내부를 꿰뚫어보는 견자(見者)의 미소. 아래 시 '각시탈'은 그의 웃음에 관한 것이다.
티내지 않으려고 씨익, 웃다 보니웃는 모습, 어느새일상이 되어버렸다평범해지려고 씨익, 웃다 보니웃는 표정, 벌써익숙해져버렸다...'티내지 않으려', 혹은 '평범해지려' 웃었다는 이은봉의 시적 고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는 시를 쓰는 자의 고통과 눈물을 숨긴 채, 평범을 거부하고 비범함을 지향하며 살아온 사람이다. 그의 제자인 기자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 하나다.
<봄바람, 은여우>에 실린 노래 중 가장 매혹적인 건 '정취암 언덕에서'라는 부제가 붙은 '구름바다'다. 이 시의 마지막 두 연은 이은봉이 웃음 뒤에 숨긴 서늘하면서 뜨거운 시심을 구구한 설명 없이도 알게 해준다. 그는 '이순의 노래'만이 아닌 '고희의 노래'도 기어코 부를 사람이다.
가까운 것은 늘 먼 것을 꿈꾼다생사의 나뭇가지는 지금 희망의 산으로 가고 싶다생사의 바깥에서 저 스스로 꿈이 되는 산이제는 잿빛 옷의 구름바다를 데리고 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