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5일 연휴가 코앞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랜만에 만날 부모와 형제, 친구의 얼굴을 떠올리며 웃음 지을 시기. 그러나 저마다의 사연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한국의 현실이다.
이는 지속되는 경제 불황과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탓이 가장 클 터. 위와 같은 문제에 휩싸여 귀향을 미루고 홀로 쓸쓸히 추석을 맞아야 할 청년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2권의 시집을 소개한다. 내년 추석에는 이런 '가슴 아픈 기사'를 쓰지 않게 되기를.
이방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조선 <하멜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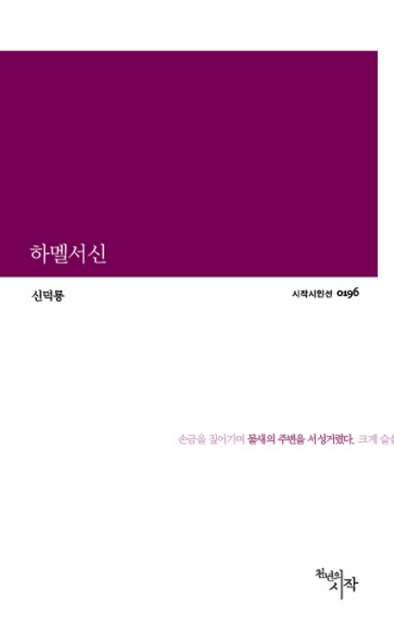
▲신덕룡 시집 <하멜서신> ⓒ 천년의시작
1653년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은 풍랑으로 인해 제주도 근방을 표류하게 된다. 의도하지 않게 도착한 조선 땅. 1668년 제 나라로 돌아가기 전까지 15년간 하멜은 향수병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방인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열패감과 상실감. 시인 신덕룡은 이 '뿌리 뽑힌 자'의 심경을 한 권에 시집에 담았다. 이름하여 <하멜서신>(천년의시작).
이게 무슨 일인지 도대체 설명할 길 없습니다.누구 하나 눈길 건네는 이도 따라오는 기척도 없는데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넓은 들판을 가로질러 가도 가도 언제나 제자리, 떠난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위의 책 중 '풋잠에 들다' 중 일부.그렇다. 제 살던 익숙한 공간을 떠나온 자에겐 모든 것이 낯설다. 그래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된다. 고향을 타의에 의해 박탈당한 자의 서러움. 이것을 어떻게 필설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신덕룡은 푸른 눈을 가진 네덜란드인의 심경을 묘사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향 상실'의 곤혹스러움을 노래하고 있다.
30대 초반에 등단해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다가 지천명을 넘겨서야 본격적인 시작(詩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신덕룡의 시에서는 풋내가 나지 않는다. 젊은 시인들의 특장이라 할 패기와 결기가 부족한 건 흠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대신 그에겐 시간이 농익힌 노장의 능수능란이 있다. 바로 그 힘이 지탱하고 있는 시집이 <하멜서신>이다.
그래서다. 신덕룡의 이번 시집에선 '미친 자의 지팡이' 혹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을 젊음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문장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귀향하지 못하고 실업의 나날을 살아가는 청년들, 부모를 만나도 웃을 일이 없는 20~30대를 다독이는 노래. 그것들이 명절을 서럽게 맞는 이들을 위무한다. 아래와 같은 시다.
활짝 열어젖힌 방문으로자울자울 밀려드는 흰 달빛들낫과 호미를 쥐고 누웠다. 베어낼수록 더 깊게 뿌리내리는 것들에 대해 골똘했다. 자꾸만 길을 잃었다.청춘이란 심장을 열어 주위에서 펄떡대는 모든 핏방울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시기. 그러니, 그 과정에서 젊은이들은 가끔 아니, '자꾸만 길을 잃'어도 좋다. 그것은 청년만의 고통인 동시에 특권이기에.
위에 인용한 신덕룡의 시 '낫과 호미'는 실패와 절망은 잠시잠깐 길을 잃게 할 뿐이지, 길 자체는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은유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해서, 먼저 철든 이가 이제 철들어 가는 후배를 위해 부르는, 보기 드문 위로의 노래라 칭해도 좋을 듯하다.
회갑을 넘긴 신덕룡이 시에 관해 품은 가없는 젊은 열정을 본 동료 시인 염창권은 "누군들 생의 근원에서 들려오는 손짓에 목매지 않을까"라고 했다. 신덕룡에게 놓치면 아팠을 '생의 근원'은 시가 아니었을까?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기에 그리운 시절 <아흔아홉 개의 빛을 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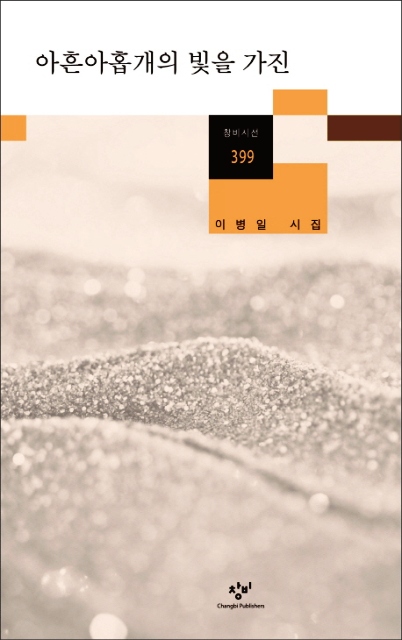
▲이병일 시집 <아흔아홉 개의 빛을 가진> ⓒ 창비
서른다섯 이병일에게 시란 무엇일까? 언제나 '경제'가 최우선에 서는 한국사회의 실생활(?)을 위해 시는 이병일에게 무엇을 주었고, 주고 있으며,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어찌 보면 한심하지만, 다른 측면에선 심각하고 아프다.
전라북도 진안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생활하는 이병일은 그 스스로가 '고향을 떠난 사람'이다. 대부분의 '지방 출신 서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간난신고(艱難辛苦)의 삶을 살아갈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수십억 원 복권당첨이나 거대한 유산을 물려줄 부자 아버지란 애당초 시인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환경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시를 쓸 이유도 없다. 해서, 이병일의 시집 <아흔아홉 개의 빛을 가진>(창비) 역시 쓸쓸하다. 예컨대 이런 것이다.
이제 나는 어둡고 축축한 신발장 안에서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검은 흉기가 되었다...(중략)나는 이생에서 내생으로 너무 많은 길을 운반한 죄로다시 탄탄한 근육을 가진 짐승으로 환생했던 거다.- 위의 책 중 '검은 구두의 시' 중 일부.어둡고 습한 신발장 안.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낡은 구두가 자신과 다름없음을 노래한 시에선 도시의 에탄올 냄새가 난다. 시인이 떠나온 고향땅 마른 흙의 향기가 완벽하게 거세될 수밖에 없었던 세월이 구구한 부연 없이도 자연스레 읽힌다.
시를 쓰는 그도 '존재의 시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년' 중 하나임을 자각하는 순간,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병일은 아래와 같은 시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대신하고 있다. 또래 청춘들의 아픔을 기꺼이 함께 앓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말라서 죽는 것들은발가벗은 채로 은혜로운 것들의 생각에 젖는다그때 나는 아침에만 반짝거리는 유서와그 밑에 떨어진 절벽을흙빛으로 닦으며흰빛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다.- 위의 책 중 '나는 믿는다' 중 일부.'말라서 죽는 것'들 가득한 '절벽'에서도 '흰빛'을 보는 사람 이병일. 그래서다. 시인은 어쩔 수 없는 낙관주의자. 그 도저한 낙관이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이들의 어깨를 다독이고 있다. 눈물겹지만 보기 드문 진경이다.
<하멜서신>과 <아흔아홉 개의 빛을 가진>. 2016년 추석. 이 2권의 시집을 아직도 절벽같은 타향의 길 위에서 떠돌며 제 방으로도, 아버지의 집으로도 가지 못한 청춘들에게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