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
자대 배치, 사격에서 희비 엇갈려]
진주에서 서산으로 가는 여정, 설렘 반, 두려움 반이었다. 2개월여 훈련과 교육을 마치고 군 생활의 본격적인 첫걸음을 뗀 셈이었다. 그 걸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아야 했다. 주위를 두루 살피면서 건너야 할 텐데, 가볍게 내달려서도 안 됐고, 빠른 적응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무겁게 걸음을 옮기는 것도 안 될 일이었다. 뭐든 눈치를 봐야 했다.

▲경례는 군인으로서 기본예절로 통했다. 신병이라 간부는 물론이고, 일병, 상병, 병장 부대 전 구성원이 눈에 보이면 경례를 해야 했다. 경례 공식은 이랬다. 선임 눈을 마주한다는 기준으로 사무실에서 반드시 한 번, 생활관에 돌아가서 또 한 번 경례를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생활관에선 좀처럼 자유롭게 활보하기가 부담스러웠다. ⓒ MBC
2015년 7월 16일, 서산에 왔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근무하게 될 부대. 이 부대에 이번에 배치받은 신병이 나 혼자뿐이라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이목은 고스란히 부담이었다. 일병 이상 선임들은 주의사항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첫째, 말끝에 '요'를 절대 붙이지 말 것. 둘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돼도 "예"라고 반문하지 말 것. 셋째, '필승' 구호 붙여서 경례 철저히 할 것. 이상 세 가지가 중점 교육 항목이었다.
"예?"가 아니라 "잘 못 들었습니다?"군대 내에 말은 모두 '다, 나, 까'로 통일해야 했다. '요'라도 튀어나오면 선임에게 지적받기 십상이었다. 또 바깥에선 상대방의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예?"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보통이나 군대에선 "잘 못 들었습니다."라고 말꼬리를 올리며 물음조로 말해야 했다. 사회에서의 언어 습관을 모두 내려놔야 했다.

▲"잘 못 들었습니다"에 대한 의문. ⓒ NBA mania 갈무리
경례는 군인으로서 기본예절로 통했다. 신병이라 간부는 물론이고, 일병, 상병, 병장 부대 전 구성원이 눈에 보이면 경례를 해야 했다. 경례 공식은 이랬다. 선임 눈을 마주한다는 기준으로 사무실에서 반드시 한 번, 생활관에 돌아가서 또 한 번 경례를 해야 했다.
이 때문에 생활관에선 좀처럼 자유롭게 활보하기가 부담스러웠다. 복도에 다니는 병사 모두가 선임인데, 보이는 족속 경례를 해야 함은 물론, 경례도 중복되게 하면 안 됐다. 동일한 사람에게 두 번 경례하면 신병일 땐 어쩌다 넘어가 줘도 민폐에 해당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오후 6시에 일과가 종료됐다. 선임 여럿이 나를 대동하고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데려갔다. 밥 먹는 것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었다. 선임과 같이 먹으면 숟가락을 들기 전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말해야 할 것, 또 식사 시간 전후로 해서 선임을 만나면 '맛있게 드셨습니까" 물어볼 것, 식탁 위에 팔 내리지 말 것.
이 세 가지가 지켜야 할 핵심이었다. 참으로 번거로운 일이었다. 팔 좀 내려서 자유롭게 먹으면 어디 덧나는가. 군인 정신과는 별 상관도 없어 보이는 게 예절이란 명목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또 맛있게 드시라, 드셨냐 묻는 것도 식사를 주제로 삼아 안부를 전하면서 선임과 후임간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한다면 이런 인사치레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허나 그 안부라는 건 일회성에 불과했고 안 해도 될 말을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다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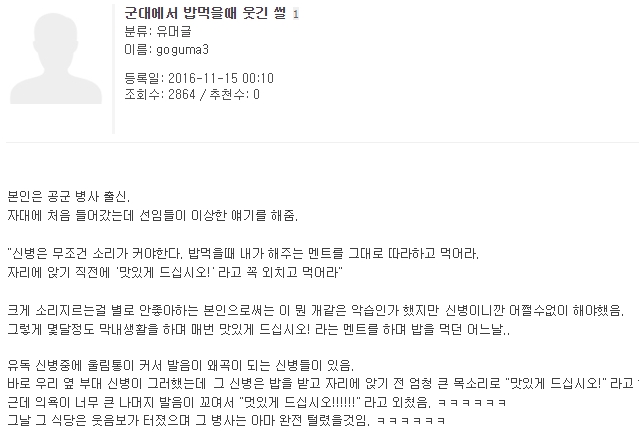
▲"맛있게 드십시오"에 대한 의문. ⓒ 뽐뿌 갈무리
'실례'될 것, 참 많았다생활관에 들어섰다. 이전에 주의받은 대로 눈에 보이는 즉시 경례를 했다. 신병이기에 생활관에서 가장 막내일 터. 보이는 대로 경례하는 게 답이었다. 생활관 끄트머리 막내 전용(?) 생활관에 짐을 풀었다. 공군은 동기 생활관으로 운영됐다. 예컨대, 이병은 근기수끼리 지내는 식이다. 시설은 전원 일인 침대였다. 훈련소 때(관련 기사:
병영 현대화? 70년 전 미군 막사만도 못하다)를 상기하면 상전벽해였다.
지내게 될 생활관에 선임들이 몰려들었다. 백 단위가 되지 않는 소규모 부대에 한 명이 새로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가 어떤 얘인가, 말은 잘 듣게 보이나, 또 사고 안 칠 것 같은가, 이런 것들을 살피려 선임들이 왔다 갔다. 그러고선 선임들끼리 이 신병은 이런 얘인 거 같다식의 인물평을 늘어놓는 경우가 허다했다.
선임들 기수도 알아둬야 했다. 선임 여럿이 같이 들어오는데 최선임보다 아랫선임에게 경례를 먼저 하면 그것도 실례였다. 경례를 건너뛰거나 대충하면 바로 맞선임이나 선임들끼리 뒷얘기가 오간다는 게 생활관의 정설이었다. 결국 내가 잘하질 못하면 맞선임도 욕을 먹고, 선임들은 이를 빌미삼아 뒷얘기를 오고갈 것이었다.
막내일 땐 조용히 있는 게 상책이었다. 말 한 번 잘못해서 얘기가 퍼지고 퍼져 생활관 대부분의 선임들이 아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를 목격한 터다. 이런 신상 비평을 당할 바에야 침묵이 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었다. 또 신병은 말이 너무 많아도 안 된다는 얘기를 위에서 전해 들었다.
'막내는 조용해야 한다'는 이런 암묵적인 시선이 군대에서 배양됐는지도 모를 일이다. 말도, 행동도, 걸음걸이도 어느 것 하나 신경 안 쓸 게 없었다. 사실, 악습이란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 강제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악습이 서려있다. 한편으로 군대에 적응한다는 건 이런 악습에 순응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했다.
[관련 기사][24개월 병영 기록 ①] 병사 봉급인상도 중요하지만 이 광경부터 봐야[24개월 병영 기록 ②] 병영 현대화? 70년 전 미군 막사만도 못하다[24개월 병영 기록 ③] 훈련소 잔반 처리하면서 "껍질, 뚜껑" 외쳤던 까닭[24개월 병영 기록 ④] 가족에 보내는 편지인데... "힘들다는 말은 쓰지 마라"[24개월 병영 기록 ⑤] 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아버리는 훈련소 '동기부여'[24개월 병영 기록 ⑥] 훈련병은 왜 기를 쓰고 훈련을 받으려 했을까[24개월 병영 기록 ⑦] 훈련병은 '메르스' 상황 알아선 안 된다?[24개월 병영 기록 ⑧] 성 경험을 '격려' 소재로 삼은 조교, 심각하다[24개월 병영 기록 ⑨] 자대 배치, 사격에서 희비 엇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