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란사의 벽화는 불과 30여 년 전인 1983년에 그려졌다. 기암괴석 위에 자리한 백화정은 1929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만든 부여고적보존회라는 어용 단체에서 건립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7쪽)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낙안과 벌교를 오가는 도로에 아스팔트가 깔리기 시작했다. 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오가던 흙먼지 길이 갑자기 아스팔트가 깔린 신작로로 바뀐 것이다. 포장 공사가 끝난 도로 양 옆에는 각종 유실수가 심어졌다." (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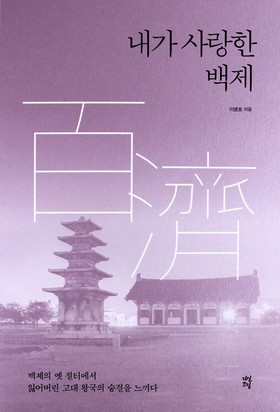
▲겉그림 ⓒ 다산초당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지기로 일하는 이병호 님은 <내가 사랑한 백제>(다산초당 펴냄)라는 책을 쓰면서 이 땅에 있던 백제라는 나라하고 얽힌 옛이야기를 풀어낸 길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책은 백제 유물이나 역사 이야기만 다루지 않습니다. 전시관장이나 글쓴이가 전남 순천 낙안마을에서 보낸 어린 날 이야기를 비롯해서, 학문길을 걸은 나날, 학예사 일을 하며 새롭게 배운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줍니다.
발자취를 살피니 '낙안민속마을'은 나라에서 1983년에 문화재 마을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해에 이르기 앞서까지는 그저 깊은 시골자락이었고 마냥 조용한 곳이었다지요.
나라에서 왜 그곳을 민속마을로 삼았는지 속내를 알 길은 없습니다만, 1986·1988년에 두 가지 큰 운동경기를 치를 셈으로 미리 관광마을로 삼으려고도 했을 텐데요, 흙길이 아스팔트길로 갑작스레 바뀐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본 '앞으로 전시관장이 될 어린 시골아이' 마음에 어떤 싹이 하나 텄구나 싶어요.
문화란, 삶이란, 역사란, 사람이란, 여기에 마을이란 무엇인가 하는 궁금한 마음이 생겼으리라 봅니다.
"백제 유물의 아름다움을 말할 때 보통 세련되고 귀족적이며 우아하다는 평가를 한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백제 유물들을 전시했을 때 그러한 평가를 할 만한 것은 오직 사비기밖에 없다. 서울 풍납토성이나 석촌동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나 금속공예품, 공주 무령왕릉을 제외한 웅진기의 유물들은 그러한 미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73쪽)
"하나의 절터에서 나온 유물이지만 미술사학계에서는 불상이나 도자기에만 관심을 갖고, 고고학계에서는 토기나 기와에만 관심을 기울였으며, 건축사학계에서는 기단 등 건물터만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다."(133쪽)
글쓴이는 우리 옛 발자취를 더듬는 길을 걸으면서 백제하고 얽힌 유물이나 자료나 책은 거의 없다시피 한 모습을 낱낱이 느낍니다. 아마 백제만 이러하지 않겠지요. 고구려도 가야도 이와 같을 테고, 발해나 부여도 이와 같지 싶어요. 더 앞선 발자취를 놓고는 더 아무런 실마리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무령왕릉 발굴 당시 ⓒ 다산초당

▲유리 구슬 ⓒ 다산초당
절터 한 곳에서 나온 유물을 놓고 학계는 저마다 한 가지만 바라보거나 살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지 싶기도 합니다. 학계는 저마다 전문으로 삼는 한 가지를 깊이 파고들려 하는 터라, 바로 옆 갈래 학문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을 수 있어요. 학계뿐 아니라 사회 곳곳이 갈래갈래 떨어진 채 좀처럼 못 어우러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라면 미술사학이나 고고학이나 건축사학 한 가지만 다룰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한 갈래만 다룰 수 없지요. 깊이 살필 한 가지를 두더라도 우리 삶터를 둘러싼 모든 실마리를 함께 바라보거나 마주할 적에 비로소 깊은 한 갈래를 더 잘 살필 만하다고 봅니다.
"박물관의 수준은 진귀한 소장품이나 웅장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큐레이터의 실력에 달려 있다."(175쪽)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목간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놀랍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다. 목간 연구자들은 목간 한 점을 보기 위해 천 리 길도 마다 않고 달려가는데 박물관 수장고에는 이미 발굴됐음에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판독조차 하지 않은 목간이 남아 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190쪽)
<내가 사랑한 백제>는 여러 옛 발자취 가운데 백제 하나를 붙잡으려 하면서, 백제를 둘러싼 숱한 사람과 삶을 함께 살필 적에 비로소 백제를 백제답게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지 싶습니다.
백제하고 맞물린 일본 옛 발자취를 살핍니다. 백제하고 이웃한 여러 나라를 살핍니다. 백제에 앞서 있던 나라를, 백제를 이은 나라를,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백제 터에서 살아온 사람을 모두 살핍니다.

▲사비기 회백색 토기 ⓒ 다산초당

▲여러 가지 기와. 정암리 가마터 ⓒ 다산초당
역사란, 점 하나가 아니라 점을 하나하나 모아서 이은 줄 하나일 테니까요. 백제라는 점 하나 앞뒤로 사람이 있고, 이 숱한 사람은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빚습니다.
유물이란, 권력이나 돈이 있던 사람이 남긴 물건에 그치지 않겠지요. 어느 한때 사람들 마음을 고이 담아서 아끼던 숨결이 흐르는 이야기꾸러미이지 싶습니다. 작은 기왓조각 하나로, 지나온 살림을 읽습니다. 작은 그릇조각 하나로, 지난날 알뜰살뜰 가꾸던 살림살이를 헤아립니다.
"이미 누군가 손을 댔다는 얘기다. 아마 (1910년대) 야쓰이 팀의 소행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야쓰이가 그것을 발굴했을 때 어떤 유물들이 나왔고, 어떤 자료를 남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것이 백제의 고이왕이나 근초고왕의 무덤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 (252쪽)

▲글쓴이가 학예사로 일하며 유물을 포장하던 모습 ⓒ 다산초당
<내가 사랑한 백제>는 너무 터무니없다 싶도록 한국에 없는 백제 발자취를 살피는 길에 지난 일제강점기에 일본 학자가 망가뜨리거나 가로채거나 숨긴 유물이나 유적지 이야기도 함께 들려줍니다. 처음부터 이를 알 수는 없었을 테지만, 작은 조각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살피는 길에 비로소 얄궂은 꿍꿍이하고 손길을 깨달을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
잊힌 역사나 유물일 수 있지만,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역사나 유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너무 바쁘거나 힘든 탓에 무엇을 잊거나 잃거나 빼앗겼는지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자료 정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누군가 새로운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내가 생각하는 박물관은 그런 일을 하는 곳이다." (277쪽)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고적 조사 사업은 철저하게 일본인이 기획하고, 일본인만 참여한 일본인을 위한 학술 활동이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식민지의 고고학자들은 고고학이라는 서양의 근대적 학문을 동원하여 조선총독부의 식민정책을 뒷받침했다. 그들은 운 좋게 한반도의 고적 조사에 참여하여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누렸다. 그 때문에 1945년 패전 후에도 일본의 학계나 국가기관의 요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288쪽)

▲궁남지에서 바라본 부여 시가지 ⓒ 다산초당
백제 옛자취를 살피면서 오늘 이 나라 모습을 돌아봅니다. 백제사람이 살아온 나날을 되새기면서 오늘 이 나라가 앞으로 뒷사람한테 물려줄 살림살이를 생각합니다. 임금이나 절이나 빗돌에 얽힌 이름을 좇는 역사 연구를 넘어서, 이 땅에서 마을을 이루고 고을을 가꾸며 서로 오순도순 어우러지던 너른 삶터를 되짚는 손길을 헤아립니다.
제국주의 군홧발은 이 나라에서 백제 옛자취를 엉성하게 흔들어 놓으려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 발자국을 얼마나 알맞거나 올바르거나 슬기롭게 가꾸려 하는가를 생각할 노릇이지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오늘자취'를 참다이 갈고닦을 줄 알아야겠다고 여기면서 책을 덮습니다.
덧붙이는 글 | <내가 사랑한 백제>(이병호 / 다산초당 / 201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