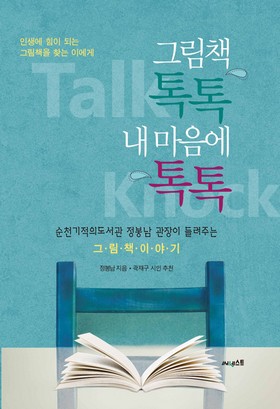
▲겉그림 ⓒ 써네스트
아이들이 매우 어렸을 적에는 무릎에 앉히거나 품에 안고서 그림책을 읽어 주곤 했습니다. 큰아이부터 글을 깨쳐서 스스로 읽을 줄 안 뒤로는 그림책을 읽어 줄 일이 드뭅니다. 아이 스스로 읽으며 아이 스스로 헤아리고 즐겨요.
그러나 짐짓 모른 척하면서 소리를 내어 그림책을 읽으면 아이들은 어느새 곁으로 다가옵니다. 제법 큰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읽어 줄게' 하고 말하지 않고 그냥 소리를 내어 읽으면 말결에 이야기에 책에 끌려서 찰싹 달라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말 마음을 담아 전해 준 책들은 아이들이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책 읽어 주다가 울었잖아요. 그래서 안 잊혀져요. 그때 참 좋았어요. 살면서 힘들 때는 그 책 생각해요." 하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고백이 이보다 더 고마울 수 있을까요. (57쪽)

▲그림책하고 놀기 ⓒ 최종규
순천에서 기적의도서관 지기로 일하는 분이 <그림책 톡톡 내 마음에 톡톡>(정봉남, 써네스트, 2017)을 써냈습니다. 순천으로 책방마실을 가서 이 책을 만났습니다. 도서관지기로 일하는 정봉남 님은 도서관지기로서 온갖 행정을 맡기도 해야 할 테지만, 도서관 책손인 아이들을 맞이하여 그림책을 읽어 주는 일을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아이를 곁에 앉히고, 또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또는 아이하고 나란히 바닥에 드러누워서 그림책을 소리내어 읽어 본 분이라면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눈이 그림책을 지켜보면서 여러 귀가 우리 말소리를 듣는 자리란 대단히 싱그러우면서 즐거운데다가 사랑스럽지 싶어요.
그림책 함께 읽기란, 이야기 한 자락을 펼쳐서 서로 마음으로 즐겁게 하루를 돌아보도록 북돋우는 놀이요 배움이라고 느낍니다. 아이는 그림책을 앞에 놓고서 줄거리를 받아먹고, 줄거리를 읊는 소릿결을 받아들입니다. 어른은 쉽고 단출하면서 깊고 너른 줄거리를 새롭게 되새기고, 아이 눈높이에 맞도록 말마디를 가다듬는 길을 새삼스레 돌아봅니다.
1994년 칼데콧 영예 도서에 오른 이 책은 어두워진 마음에 자그마한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그림책입니다. 등불 하나하나가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작은 불꽃이라고 여기면서 온 정성을 다해 불을 켜는 페페, 그 아이가 우리들의 마음에도 반짝 불을 밝힙니다. (86쪽)
햇살 같은 이야기와 따사로운 색감의 그림들, 아이들의 표정, 책에서 나는 냄새, 책을 읽고 난 뒤의 떨림 같은 게 내 안에 모아진 겨울의 양식인가 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오래오래 곱씹으며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일, 책읽기는 그래서 즐거운 체험입니다. (114쪽)

▲책방마실. 그림책 누리기. 그리고 순천 마을책방에서 <그림책 톡톡 내 마음에 톡톡>을 장만하기. ⓒ 최종규
<그림책 톡톡 내 마음에 톡톡>은 도서관지기로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읽은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때로는 슬프게 읽은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때로는 판이 끊어져 더 만나기 어려운, 다시 말해서 아이가 그 그림책을 장만해서 집에서 더 자주 보고 싶으나 새책집에서 더 다룰 수 없는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열 해 남짓 시골집에서 아이들하고 그림책을 읽는 어버이로서, 제가 즐기는 그림책을 도서관지기 이웃님은 어떻게 즐기셨나 하고 맞대면서 이 책을 읽어 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스무 살이나 마흔 살을 넘더라도 저는 꾸준히 그림책을 즐기려고 생각하기에, 제가 머잖아 할아버지가 되어도 어떤 그림책을 손에 쥐면서 기쁘게 삶을 되비출 적에 슬기로운 어른으로 하루를 지을 만한가 하고 그리면서 이 책을 읽습니다.
소년은 숲으로 가 바구니를 짜기 시작하고, 그날 밤 바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저씨들처럼 바람이 선택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희미한 달빛 속에서 모든 나뭇잎들이 소년에게 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마지막 장면에선 내 마음에 눈물 한 방울이 또로록 떨어집니다. (191쪽)
"나는 모든 색깔을 좋아해. 볼 수는 없지만 소리와 냄새와 맛과 촉감으로 세상 모든 색깔을 느낄 수 있거든. 너도 눈을 감고 느껴 봐!" 우리도 눈을 감고 봄빛 환한 세상의 색깔들을 온몸으로 느껴 봐요. (222쪽)

▲아이하고 그림책 함께 읽기 ⓒ 최종규
동화책도 그림책도 줄거리로만 읽을 수 없습니다. 그림책은 짧은 글에 펼친 그림으로 담아내는 이야기 얼거리입니다만, 멋진 붓놀림만으로 그림책을 읽을 수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림책은 누구보다 어린이한테 맞추는 책인 터라, 아무 낱말이나 말씨를 섣불리 담아낼 수 없는 책이기도 해요. 가장 쉬우면서 부드럽고, 가장 맑으면서 따사로우며, 가장 고우면서 사랑스러운 말을 살려서 담아낼 책이 그림책이기도 하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얼거리에서 이야기 재미를 톺아보고 줄거리에 흐르는 생각을 새롭게 엿봅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버린 할머니는 낯설고 힘든 일을 자청해서라도 손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 능력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304쪽)
누구는 고독을, 누구는 친밀감을, 누구는 관계를, 어떤 이는 존재의 가치를 느낄, 넉넉한 해석의 자유가 가득한 책. (400쪽)

▲<그림책 톡톡 내 마음에 톡톡>을 쓴 정봉남 님 두 손. ⓒ 최종규
아이들하고 그림책을 읽다가 까르르 웃기도 하고, 눈물방울 또로록 떨구기도 하는 도서관지기란 얼마나 살가울까 하고 생각합니다. 관장·사서 같은 이름을 떠나 다 같은 '책지기'로서, '책님'으로서, '책벗'으로서, 그림책 읽는 기쁨하고 보람하고 뜻을 곰곰이 짚고 싶습니다.
그림책을 짓고 엮어서 펴낸 뒤에, 이 그림책을 아이하고 읽는 까닭이라면, 아이한테 가르치면서 어른으로서도 새로 배울 사랑을 다시 그리려는 뜻이지 싶습니다. 지식을 가르치는 그림책이기 앞서 사랑을 가르치는 그림책이라고 느껴요. 정보를 알려주기 앞서 사랑을 노래하는 그림책이라고 느낍니다.
우리는 그림책 하나를 두고두고 되읽으면서 뭇생각을 받아들이거나 가꿉니다. 외로움도, 넉넉함도, 어깨동무도, 나눔도, 웃음꽃도, 눈물나무도, 그림책 하나를 발판삼아서 사이좋게 주고받습니다. 그림책을 만나려고 톡톡 두들기듯 다가섭니다. 그림책에 깃든 이야기밥을 먹으려고 마음을 톡톡 두들겨서 엽니다.
덧붙이는 글 | <그림책 톡톡 내 마음에 톡톡>(정봉남 / 써네스트 / 2017.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