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부터 오리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대체 누구야? 왜 내 뒤를 슬그머니 따라다니는 거야?"
"와, 드디어 내가 있는 걸 알아차렸구나. 나는 죽음이야."
죽음이 말했습니다.
- 볼프 에를브루흐의 그림책 <내가 함께 있을게> 중에서

▲<내가 함께 있을게> 중에서 ⓒ 웅진주니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소식을 거의 매일같이 접하고, 주변 지인들의 부고를 자주 받으면서도, 심지어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서도 죽음은 내게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언제나 남의 일입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라야 그나마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며칠 지나고나면 이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함께 있을게>에서 볼프 에를브루흐가 그린 것처럼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 당장 내일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휴가 때 물놀이를 갔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죽음은 그림자처럼 삶을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은 좀처럼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는 순간 자체가 두렵기도 하고 죽음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한편으론 죽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일인데 굳이 죽음을 미리 생각해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말하기를 피하게 되는 주제이지만 어떤 면에선 죽음은 모든 삶의 종착지입니다. 때문에 죽음을 이야기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삶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해 볼까요?100% 적중률로 할 수 있는 예언이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죽을 것이다'입니다. 하지만 '언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선 누구도 정확히 대답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조차 죽음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 않기에 종종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곤 합니다. 언제 어떻게 죽게 될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때론 이렇게 죽으면 좋겠다 등을 상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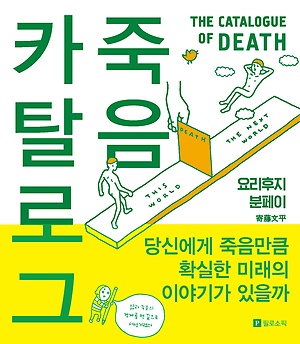
▲죽음 카탈로그 표지 ⓒ 필로소픽
이런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수없게 무슨 소리냐', '왜 죽을 생각을 하느냐' 등 어이없다는 반응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한 명 만났습니다.
죽음에 대해 궁금해하다가 <죽음 카탈로그>라는 책까지 낸 요리후지 분페이라는 일본인 작가입니다. 저자는 답이 없는 질문이기는 하나 누군가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작은 힌트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책에서 저자가 보여주는 죽음은 생각만큼 어두운 것도, 그렇다고 마냥 유쾌한 것도 아닙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익살스러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죽음의 모습', '죽는 때', '죽는 장소', '죽는 원인', '죽음에 담긴 이야기' 등을 덤덤하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그림이 곁들여진 작은 죽음 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금기시되는 죽음을 새롭고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우리를 안내합니다.
죽음의 모습, 시기, 장소저자는 죽음의 형태를 개성 있는 그림에 짧은 글을 곁들여 총 29가지로 요약해 보여줍니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살아 있는 세계 '현세'와 사후의 '내세'를 '죽음'이라는 경계가 나누고 있는 모습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혼이 빠져나간다'는 전세계 공통적인 개념에서부터 죽으면 '가까운 섬에 간다'고 생각하는 파푸아뉴기니, 죽으면 '파리, 귀뚜라미, 새, 나비' 등이 된다는 각국의 민간신앙에 이르기까지 세계인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죽음의 모습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죽음이 어떤 모습일 거라 생각하시나요?
"나는 죽음의 형태들 가운데 죽으면 가까운 섬에 간다는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의 생각을 가장 좋아한다. 모두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면 평온하고 행복할 거라고 상상하니 기분이 좋아졌다. 누구든 죽음을 기분 좋은 일로 인식해야 살면서도 즐겁다. 죽음의 형태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죽으면 모두 고통스러운 세계에 간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지옥도 있지만 균형을 이루듯이 천국도 있기 때문이다."(52쪽)
다음으로 저자는 언제 죽음이 찾아올까에 대한 생각을 말해줍니다.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나 우리나라도 100세 시대라는 말을 흔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말한 몸의 수명, 즉 노화 속도를 생각해보니 그리 기쁘지는 않습니다. 수명은 늘지만 노화 속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자가 말하듯 언제 죽어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달로, 더 살고 싶은 기분이 더 이상 일지 않는데도 몸은 살아 있는 일이 생겨났다.(중략) 들짐승은 잡아먹힌다든지 부상을 입는다든지, 죽음의 시기를 몸이 결정한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죽음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다. (중략)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삶을 멈춰야 할지 생각해두어야 할 것 같다."(68쪽)
한편, 이어지는 죽는 장소에 대한 통계를 보면 삶이라는 것이 참 덧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서 많이 죽는지 살펴보면(일본의 경우) 매년 집 밖에서보다 집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집 밖에선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고, 집 안에선 익사와 질식 사망자가 가장 많다고 하네요. 우리 나라에서도 이런 자료를 누군가 만들어주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사망 가능성을 낮추려면 가급적 이런 장소는 피하세요'라는 조언이 담길 수 있겠습니다(일본에선 어디를 피해야 할지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도 죽음도 '어떻게'가 문제어떻게 죽고 싶은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먼저 죽은 사람들의 이미지입니다. 저자는 "죽음의 이미지는 죽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실제 및 작품속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부처, 예수에서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 아돌프 히틀러, 잔 다르크, 피카소, 빨간모자의 늑대,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에 이르기까지. 여러 삶과 죽음의 이야기들에 나를 넣어보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죽을까 생각해 봅니다.
죽는다고 할 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거나, 두려워하거나, 도망치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론 고통에서 해방되는 일이라 여기거나, 순순히 받아들이고 평온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기도 한다네요.
내가 지금 죽는다면? 억울하기도 하고, 남겨진 가족들이 걱정스럽기도 해 순순히 받아들이며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동시에 살아왔던 지난 순간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저자의 말에 공감이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 사람 안에 있던 추억, 감정 등 온갖 것들이 응축된다. 죽음과 마주하는 것은 자신의 삶과 마주하는 것이다."(146쪽)
"'당장 할 수 있는 거라곤 오늘은 카레가 맛있게 됐다', '이 성공은 그때의 실패 덕분이었다' 하는 식으로 생활 속에서 일어난 일을 잘게 바수고 연결해 자기방식대로 차곡차곡 개어가는 정도가 아닐까. 그리고 가끔씩 죽음 편에서 지금의 자신을 돌아본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이 짓눌리지 않도록 가능한 한 똑바로 죽음을 향해 매일의 삶을 차곡차곡 개어간다."(148쪽)
결국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최근 훌륭한 정치인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으로 많이 슬펐습니다. 죽음은 역시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분이 삶을 통해 남겨준 유산을 생각하며 저자가 말한 것처럼 '삶이 짓눌리지 않도록 가능한 한 똑바로 죽음을 향해 매일의 삶을 차곡차곡 개어'가야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기자의 개인블로그에도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