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편집 <뱀>과 장편소설 <밤의 고아>로 인상적인 문학세계를 선보인 윤보인 작가가 장편소설 <재령>으로 오랜만에 문학으로 돌아왔다.
작품 첫 구절의 언급대로 <재령>은 서울에서 뉴욕으로 그리고 재령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이다. '재령'이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화자인 '나'의 할아버지의 고향인 황해도 재령을 가리키는 지명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남자의 이름이기도 하다.
언젠가는 갈 것이지만 아직은 갈 수 없는 곳이라는 황해도 재령이라는 공간은, 당신을 알고 싶고 언젠가는 더 많이 알 수 있을 테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재령이라는 남자와 탐구의 대상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 두 가지 대상은 작가의 페르소나인 화자의 시선으로 보자면 역사성과 인간성에 대한 본질적인 탐구의 통로이기도 하다. 이 탐구는 문학이라는 문을 통과한다는 점에서는 트로이 전쟁 후 긴 시간 방랑의 여정을 지나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려는 율리시즈의 귀환 문학과도 통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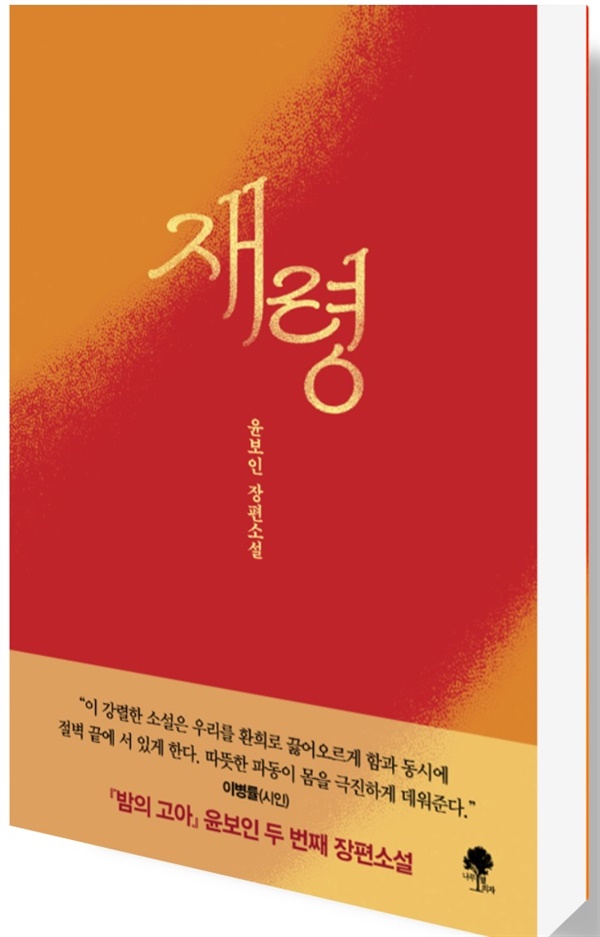
▲<재령> 윤보인 작가의 장편소설 ⓒ 나무옆의자
<재령>에서 작가는 두 가지의 서술방식을 취하는데 첫 번째는 사주명리를 바라보는 시각을 서술하는 씨줄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재령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인 날줄의 이야기이다.
<재령>은 오랜 시간 점을 치는 기능적인 기복의 한 형태로 폄하되거나 음지의 학문으로 취급되어온 사주명리학을 새롭게 보여주는 시선을 제공한다. 모든 학문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양면성이 있다. 과학도 그러하고 종교도 그러하다. 이것들의 긍정성을 잘 살리면 인류에 보탬이 될 것이고 부정성이 드러난다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많은 이들이 괴로울 것이다.
과학기술 물질문명이 주도하는 시대에서 사주명리, 토정비결, 풍수, 역학 등은 그것의 본질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공식적인 사회 속에서 숨어들거나 길흉화복의 기능적인 면을 부각하고 이용하는 이들에 의해 왜곡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시대의 운세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는 영역에 있었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와중에도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았다.
이 존재감의 본질과 가치를 찾는 눈은 외적 성공이나 지위에 기대는 것이 아닌 내용 자체를 파악하는 인격의 시선에 달려 있다. 이 인격의 시선은 작가의 시선이기도 하다. 사주명리학이 음지의 학문이면서도 오랜 기간 여전히 생명력을 잃지 않는 것은 작품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통찰력과 신뢰, 겸허함을 잃지 않는 소수의 지혜자가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통찰의 내면적 인격을 지닌 작가의 시선은 화자를 통해 재령이라는 사랑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구체화한다. 박재령이라는 인물은 나라는 화자가 서울에서 몇 분 간격으로 태어난 쌍둥이 오빠가 젊음을 꽃피우기도 전에 저 세상으로 떠나고 부모님은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큰아버지가 살고 있는 뉴욕으로 가게 돼서 만나게 된 남자이다.
박재령은 큰아버지로 이어지고 큰아버지는 할아버지로 이어진다. 이들 직업은 모두 다를 것이나 내면적으로는 모두 운명과 삶을 이해하고 공부하고자는 하는 존재들이다. 나라는 화자는 공통적으로 이 세 존재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넓히려는 존재인 셈이다. 즉 이 이해는 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구체성을 지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 삶에 대한 인문적 탐구이기도 하다. 박재령이라는 '재령'과 할아버지의 고향인 '재령'은 겉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나라는 화자는 쌍둥이 오빠의 죽음과 아버지 형제들의 각기 다른 삶과 운명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사색한다. 그녀가 이 이해를 넓히기 위해 사주명리를 도구로 삼은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일지도 모른다. 사주명리는 결코 완성된 학문이 아니고 한 인간의 이해를 통해 단순한 길흉이나 성공의 여부를 기대는 기능적인 도구로 머물 수도 있지만 소수에게는 운명과 삶에 대한 상관관계를 극복하는 지혜의 도구일 수 있다.
<재령>은 사주명리라는 작가의 통찰을 이야기로 씨줄을 형성하고 '재령'이라는 남자를 중심으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날줄을 형성하는데 이는 원리와 실제라는 측면으로 볼 때 흥미롭다. 원리는 실제를 통해서 구현되고 실제의 경험은 원리의 철학을 넓혀주는 역할을 할 것이므로 결국 원리와 실제는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고 성장을 시키는 교학상장과도 같을 것이다.
작품에도 등장하듯이 작은 아버지와 사촌언니의 남자는 외적 성공을 지향하는 존재들이지만 이들에게 나라는 화자는 별로 경도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안다. 이미 나라는 화자는 그 속물성을 넘어선 뒤 내면의 성장과 운명과 삶의 세계를 바라보고자 하는 성숙한 영혼이다. 이는 작가의 페르소나라는 점에서 작가의 시선이기도 할 것이다.
100년도 채 못되는 한정된 시간속의 육신보다 무한성의 성격을 지닌 영혼을 더 중시하는 존재라면 내면을 살피는 일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다. 영혼이 존재하냐 아니냐는 것과는 별개로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것이 행복에 더 가까워지는 길임은 외적 성공과는 관계없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혜의 삶을 추구하는 이들은 공감할 것이다.
작가는 나라는 화자를 통해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에 대한 호감과 비호감의 정도는 드러낼지언정 모든 존재들에 대한 애정을 거두지 않는다. 차별없이 모든 존재들을 바라보되 그들의 외양에 평가나 중점을 내리지 않고 그들의 내면에 관심을 둔다.
이는 오랜 시간 외적 성공의 경험을 보내고 내면적 성장의 시기에 다다른 성숙한 영혼의 공통점이기도 할 것이다. 모든 존재들은 운명적인 길을 걷되 그것을 스스로 더 인식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를 지니고 있다. 작가는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들을 연민으로 바라볼 뿐이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사주명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통찰력도 훌륭하지만 문학적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격을 유지하는 것도 훌륭하다. 적지 않은 호사가들에게는 사주명리라는 소재가 길흉화복의 기능적 측면을 직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지엽적인 소재로 들려주고 싶은 유혹과 함정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그러나 작가는 결국 이 모든 것이 삶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와 방편임을 안다. 단순한 흥미위주의 이야기거리인 문집(文集)이 아니라 삶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문학(文學)의 영역에 속한다는 것은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일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문학적 시선의 격(格)이 존재함을 이 작품을 통해 느끼게 된다.
흥미롭게도 <재령>은 '나'라는 존재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물론 작가는 '나'를 통해 삶과 인간에 대한 시선을 마음이 일으키고 흐르는 방식대로 서술한다. 또한 '나'는 나에 대해 얘기하기도 하지만 나보다는 주로 다른 이들을 통해 나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다.
바깥의 세계를 지우개로 점점 지우다보면 나의 중심으로 더욱 가까이 나의 시선이 머물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란 무엇인가와도 연결되는 것이어서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향성이 다음 작품의 기대를 갖게 한다.
윤보인 작가의 <재령>은 단순한 외적 성공만이 모든 행복의 조건의 필수조건이 아님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이들의 외적 평가와 상관없이 운명을 거스르지 않되 인간적인 삶을 살려는 이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다양하고도 극심한 경험들이 그저 실패이기만 실패가 아니라 영혼의 성숙과 진화를 위한 운명의 예비였음을 짐작하는 이들에게 한줄기 위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