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번쯤 될까. 내가 오늘 하루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드나 든 숫자다. <오마이뉴스>는 언론사 중에서도 시민이 자유롭게 글을 기고할 수 있다. 나처럼 글을 기고하는 사람을 시민기자라고 부르는데, 이들이라면 나와 같은 경험을 몇번쯤은 하지 않았을까 싶다.
나는 지금 약간 긴장한 상태다. 며칠 전 송고한 내 글이 여전히 '검토 중'이기 때문에. 내 글에 문제가 있었을까. 즉, <오마이뉴스>는 누구나 글을 보낼 수 있지만 아무 글이나 기사로 채택하지는 않는다. 언론사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편집기자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늘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알기로 대부분의 시민기자들은 다른 생업을 갖고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라 어떤 때는 일에 쫓겨가며 누가 시키지도 않은 글을 아등바등 써내고는, 송고를 하는 순간 잊어버리기도 한다. 하지만 머지않아 다시 상기하게 되니 내 글이 채택되면 반가운 메시지가 오기 때문이다.
"기자님의 기사가 방금 채택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지인과 함께 나누세요~^^"
물론 항상 이 메시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내 글이 기사로 채택되지 못하는 날도 많으니까. 그럴 때도 서운하거나 억울한 마음을 가져 본 적은 없다. 내가 내 글에 책임이 있다면, <오마이뉴스>의 지면을 알차게 채워나갈 책임은 편집기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내 글이 최고가 아니라는 것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다. 그러니 좋은 기사들에 밀리거나 그 자체로 부족해 탈락하는 것도 놀랍지 않다. 내가 내놓은 글 때문에 훗날 이불킥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가끔은 채택되지 못해 흑역사를 줄이게 되었다는 감사한 마음을 갖기도 한다(진심100%).
그럼에도 궁금할 때는 있다. 왜 이번 기사는 채택되지 못했을까? 반드시 기사가 될 거라는 확신은 없을지언정 '혹시' 기사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글을 송고한 것이니 이상한 의문은 아닐 것이다. 몇 년간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고민한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다.
시민기자들이 주축이 되어 쓰는 '사는 이야기'는 제목 그대로 사는 이야기여야 한다. 그러나 사는 이야기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또, 내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써야 하지만 그럼에도 오직 내 경험과 생각만 쏟아내는 일이어서는 안 된다. 너무 알쏭달쏭한가.
어설프고 부족한 설명이다. 여전히 촉이 좋지 않아 채택될 수 없는 글을 쓰기도 하니, 아는 척을 하기에 섣부른 것은 사실. 하지만 다행히, 내 느낌이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다.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을 보고 막연하던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몰랐던 정보들을 신나게 건져올렸다.
19년 차 편집기자가 말하는 글쓰기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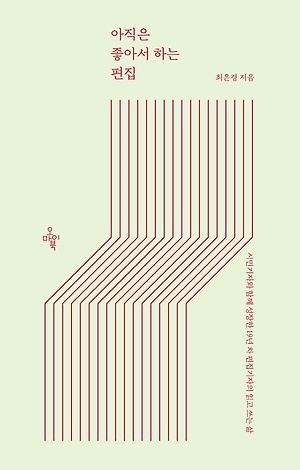
▲<아직은 좋아서 하는 편집> 책표지 ⓒ 오마이북
이 책은 '시민기자와 함께 성장한 19년 차 편집기자의 읽고 쓰는 삶'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다. 저자는 그야말로 아이가 태어나 성년이 될 긴 시간을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로서 일한 최은경 작가다. 그러니 시민기자에 국한할 것 없이, 공적인 글을 쓰는 데 갖춰야 할 덕목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참 요긴한 책이다.
에세이와 기사의 차이 역시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다.
""이 글을 독자가 왜 읽어야 하지?"
에세이가 기사가 되려면 이 질문에 글쓴이 스스로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쓰고 싶은 글을 쓰는 것과 기사를 목적으로 쓰는 글은 달라야 한다. 내가 쓰고 싶어서 쓴 이 글을 독자들이 왜 읽어야 하는지, 독자들도 궁금해할 만한 내용인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145)
채택되지 못했던 내 글 역시 이것으로 설명된다. 내 글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데는 연습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하다. 그렇다면 채택되지 않는 글을 쓰면 실패한 것일까? 나는 결코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저자 역시 글쓰기의 의미를 짚는 것을 잊지 않는다.
"무엇보다 글을 쓰면서 나 자신이 꽤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글쓰기는 자신을 돌아보는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글쓰기 이전의 나와 글쓰기 이후의 나는 다를 수밖에 없다. (...) 씀으로써 현재의 나, 미래의 나가 모두 달라진다. 쓰지 않으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196)
글쓰기 전후의 내가 다르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사족을 붙이자면, 난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나는 글을 쓰면서 내가 얼마나 편협하고 시시한 인간인지 깨닫는다. 그럴수록 자존감이 낮아지냐 하면, 천만의 말씀. 오히려 모난 곳을 정확히 바라보며 다듬게 되고 발전의 여지가 있는 내가 사랑스러워진다.
또, 내 곁의 사람들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이런 내 곁에 있어줘서. 그래서 글쓰기는 혼자 하는 작업이지만, 나에겐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람이 썼으면 좋겠다.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작업이니까. 이게 행복이 아니고 무엇인가.
특히 <오마이뉴스>에 글을 기고하면, 내 글을 나 못지 않게 성심성의껏 읽어줄 편집기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덧붙인다. 나조차 내 글보다 남의 글이 좋아 쓰기보다 읽기를 탐하는데, 이 무슨 횡재란 말인가. 심지어 그의 손을 거친 내 글은 한걸음 더 나아가 있어 날 성장하게 한다.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글이든 의미있다고 본다. 심지어 아무렇게나 휘갈긴 메모라 해도. 그러나 이왕 쓰는 거 많이 읽히는 글을 쓰고 싶다면 이 책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편집기자가 하는 일을 엿보는 것을 넘어 공적인 글쓰기를 만나게 되고 결국, 글을 쓰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