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붙인 이름일까, 해독주스.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토마토를 끓이고 식혀 과일과 함께 갈아먹는 것을 말한다. 이름처럼 해독까지 해주는지는 모르겠으나 제법 든든하고 배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한동안 즐겨 먹었다.
즙이 아닌 갈아 먹는 것이라 액체라기엔 꽤 걸쭉해 쏟기라도 하면 낭패가 따로 없다. 걸레로 훔칠 수도, 주워서 버리기도 곤란한 것. 이 애매한 것을 남편이 실수로 쏟은 적이 있다. 입고 있던 옷부터 바닥까지 엉망이 되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주스가 뚝뚝 떨어져 얼른 바지를 벗으라고 했다. 바지를 벗고 보니 속옷도 젖어 있어 내친김에 다 벗었다. 그는 그야말로 곰돌이 푸처럼 상의만 입은 채 쭈그려 앉아 열심히 바닥을 닦았다. 사방팔방 튀어 있는 주스 자국을 찾아 이쪽저쪽 옮겨 다니며.
곁에서 같이 치우다 그 행색이 기막혀 한참을 웃었다. 그리고 궁금해졌다. 만약 내 옷에 주스가 쏟아졌다면 저 모습으로 바닥을 닦았을까. 단언컨대 내 대답은 '아니오'다. 아무리 십여 년을 함께 한 남편이지만 그럴 수 없다. 심지어 혼자 있다 해도 그런 시원함(?)은 좀처럼 상상할 수 없으니, 이건 오직 개인적 성향의 차이일까.
내가 자랄 때까지만 해도 남자아이들은 급하면 길에서도 '쉬'를 하게 했다. 다 자란 어른도 마찬가지였다. 좋든 말든 노상방뇨는 남자들의 것이었다. 남성들의 욕구는 참을 수 없거나 참기 힘든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는 법을 배웠다.
2차 성징이 시작된 뒤엔 브라를 좀 일찍 착용해도, 늦게 착용해도, 시선이 집중되곤 했다. 몸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고, 감춰야 하는 대상 같았다. 생리대는 파우치에 넣어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깟 양 무릎 좀 벌리고 앉았다고 모멸적인 말을 듣는 일도 예사였다.
그 때문일까. 여성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정체불명의 검열관이 따라다니는 듯하다. 그 검열관은 시종일관 말한다. 네 몸과 행동을 단속하라고. 그 눈이 어찌나 집요한지, 공중화장실에서 소변보는 소리를 감추기 위해 물을 내리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여태 남성이 그런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여성은 스스로 욕구를 느낄 권리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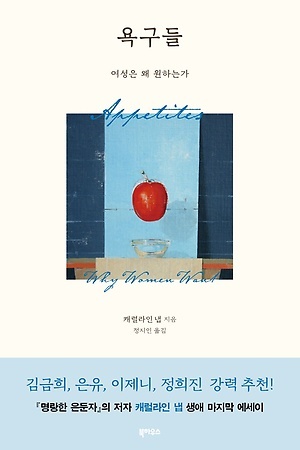
▲<욕구들>책표지 ⓒ 북하우스
내 안의 검열관에 대해 떠올리게 된 것은 캐럴라인 냅의 <욕구들> 덕분이다. 저자는 거식증으로 인해 한때 37킬로그램까지 체중이 줄었다고 한다. 그러니 처음 책을 펼칠 때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는 나와 무관할 것이라 여겼다. 나는 그런 강박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섣부른 거리두기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나 역시 여성에게 몸을 더 축소하고 보완하며 통제할 것을 요구하는 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여성의 몸을 평가하는 시선에 반발심을 가지면서도, 나 역시 튀어나오는 살들을 시시각각 점검하며 그 문화에 동조하고 있었으니까.
미디어와 자본주의는 이 흐름의 한 축으로 지목된다. 끊임없이 불가능한 요구를 하며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있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여성은 더 날씬해지고 잡티와 주름을 감추고 털 하나 없이 완벽해야 하므로 수시로 자기 몸을 통제하며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곳곳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너무도 강렬하여 여성 혐오에 대한 인식과 문화 분석 능력을 갖춘 사람조차도 그 요구에 굴복하기 쉽다고 말한다. 이로써 자연스러운 욕구들을 제한하고 축소하며 억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책은 식욕에 국한되지 않고 더 멀리 나아간다. 식욕은 갈망과 동경, 풍요와 쾌락을 향한 욕구와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외모로 평가되고, 얕잡히고, 주장을 삼켜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며 자기 자신에게 그 욕구들을 느낄 권리가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된다는 것.
그녀는 이 문화를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몸을 긍정하며, 욕구를 드러내고, 불가능한 요구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여성이 사회적인 위치와 권리를 당당하게 획득하는 것도 몸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1959년 미국에서 태어나 20년 전 세상을 떠난 작가지만, 나는 지금, 이 땅에서도 그녀의 주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한다. 우리 몸은 평가와 멸시의 대상이 아닌, 존재 그 자체가 되어야 하므로. 어떤 형태의 굶주림도 없는 세상을 염원하며 이제 몸이 아닌, 문화의 독소를 해독해야 할 차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여성의 몸은 페미니즘이 가장 덜 건드린 미개척지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어쩌면 최후의 미개척지 중 하나인지도 모른다. 여자의 욕구, 그리고 자유와 권리 의식과 기쁨을 품고 자기 욕구를 마음껏 채울 수 있는 여자의 능력은 진보의 표지인 동시에 진보에 대한 은유다. 우리는 얼마나 허기져 있는가? 얼마나 채워져 있는가? 얼마나 갈등하고 있는가?" (38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