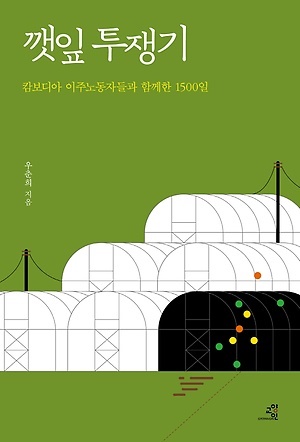
▲책 <깻잎투쟁기> 표지 이미지. ⓒ 교양인
최근 '깻잎 논쟁'이 유행했다. 애인, 나, 내 친구가 함께 밥을 먹는 상황에서 내 친구가 깻잎 반찬을 먹으려고 할 때 붙어 있는 깻잎을 내 애인이 눌러주는 걸 과연 용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다.
누군가 깻잎을 떼어주는 게 맞다, 아니다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을 때, 진짜 문제는 깻잎을 누가 떼어주느냐가 아니라, 누가 '따고' 있는지, 즉 밥상 위에 올려진 깻잎이 누구의 손을 거쳐 왔는지에 초점을 맞춘 책이 있다.
이주 인권 활동가이자 연구자인 우춘희는 깻잎밭에서 직접 일하며 깻잎밭을 비롯한 농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책 <깻잎투쟁기>에 담아 우리 밥상 위의 인권을 말하고자 한다.
저자가 직접 체험한 농촌의 이주노동 현실
<깻잎투쟁기>는 농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임금, 고용허가제, 농촌의 현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성폭력과 건강권 등의 문제를 저자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깻잎밭에서 일하며 관찰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며 엮은 기록이다.
또 단순히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와 청년층의 이탈로 이주노동자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농촌의 현실도 드러낸다.
책을 읽으며 내가 처음 농촌 '체험'을 했을 때가 생각났다. 대학생 때 갔던 농촌연대활동이었지만, 농사일에 대해서는 '체험'이나 마찬가지 아니었나 싶다. 내가 일했던 밭은 담배밭과 인삼밭, 고추밭이었다.
담배밭에서는 무더운 여름 끈끈한 액체 같은 것들이 긴팔에 들러붙어 마치 딱풀을 칠해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하루종일 담뱃잎 옆에 나고 있는 작은 잎들을 떼어냈다. 담배밭에서 일을 하고 숙소로 돌아오며 나는 말했다. "내 주변에서 양담배 피면 다 뺏어 던져버릴 거야". 진심이었다.
검은 차광막이 있는 인삼밭에서는 계속 쪼그려 앉아 일해야 했다. 너무 힘들어서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누군가 옆 동네 수박 비닐하우스를 가겠냐고 물었다. 거기는 일이 쉽냐고 했더니, 비닐하우스 안이 너무 더워 하루에 한 명씩 탈진해서 기어 나온다고 했다.
나는 말없이 인삼밭에서 성실히 일했다. 하루는 작업반장이 오늘은 조금 쉬운 일을 할 거라고 했다. 그래서 나간 밭이 고추밭이었는데 고추밭에 줄을 묶는 일이었다. 누가 쉽다고 했나.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다.
농활 마지막 날에는 시내로 나가 함께 농민가를 부르며 가두행진을 했다. 겨우 열흘가량 농사 일을 하고는 농민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농민가를 목청껏 불렀다.
그런데 지금의 농촌은 내가 농활을 다녀왔을 때와는 다른 상황이 되었다. 이제 농촌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필수 인력이 되었고, 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이 중요한 화두가 되기도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를 보라
2020년 겨울, 영하 18도까지 떨어져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포천 지역의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인 속헹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 같은 경우이다.
많은 수의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은 시내와 떨어진 논밭 가까이에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 거주한다고 한다. 그마저도 한 달에 20~30만 원의 기숙사 비용을 내고 말이다.
저자는 이주노동자들이 사는 기숙사들을 둘러보고 "편하게 쉬어야 할 집이라는 곳이 누군가에게는 잠을 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공포의 공간"이었다고 말한다. 특히 저개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컨테이너 집, 비닐하우스 집,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집에서 사는 것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편견이자 인종차별적 착각이라고 비판한다.
고용주들이 이와 같은 생각으로 열악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고, 정부는 이런 시설을 방관하고 있다. 여름에는 35도가 넘는 더위에, 겨울에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기도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위와 같은 열악한 주거시설에서 살게 방관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닌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임금 체불의 문제 또한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농사라는 일의 특성상 본래 계약된 시간보다 초과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 하다.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미흡하고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미비하니 고용주들의 '배째라' 태도는 소문이 난다. '옆집도 그랬으니 나도 그런다. 뭐가 문제냐?'라고 쉽게 반문하는 고용주들의 질문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그래도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 사업주들도 편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가령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없는 일을 끝마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아무리 능숙한 솜씨로 깻잎을 따도 8시간 안에 깻잎 1만 5천 장을 따기는 쉽지 않은데,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실패하면 월급을 깎기도 하며 말이다. 저자의 말마따나 근로기준법 위에 '고용주의 법'이 있는 것이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다.
밥상 위 깻잎에서 이주노동자를 떠올리자
이 책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임금 체불을 신고한 이주노동자 수와 임금 체불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노동관계법이나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 허가가 취소된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정부의 방관자적 자세를 고의성이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코로나가 터지고 이주노동자들이 입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농촌에서는 비상 상태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 꼼수를 쓰던 고용주들은 웃돈을 주고서라도 이주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에 큰 관심 없던 정부도 방역과 농민들과 이주 인권 단체들의 요구에 그들의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오는 식재료 중 이주노동자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될까? TV에는 투박한 농민들의 손만 나오지 이주노동자들의 손은 나오지 않는다. 존재하되 숨겨진 노동. 그렇다고 그들의 인권 문제까지 숨겨질 수는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구걸을 하러 온 것이 아니지 않나.
그들은 그들의 노동을 제공하고, 우리는 그에 맞는 마땅한 임금과 대우를 제공하면 된다. 우리나라 주요 산업의 일부분을 살리는 데 일조하고 있는 그들을 왜 차별하고 억압하지 못해 안달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매년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농민들은 농민가를 부르며 대규모 투쟁을 벌이기도 한다. 이제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해야하지 않을까? 농업인의 일부로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도 크게 함께 울리면 좋겠다는 작은 상상을 해본다.
우리가 밥상 위에 올려진 깻잎을 보며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친구의 깻잎을 떼어준 애인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이 깻잎을 따며 수없이 흘렸을 이주노동자들의 피땀과 눈물이다. 비단 깻잎뿐인가. 이주노동자들 기사마다 달리는 인종차별적 악플들에 함께 분노하고,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깻잎 논란보다는 깻잎 연대가 더 보람차지 않은가.
아차,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산다고 말하는 악플러들에게도 꼭 이 책을 권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모르면 배우면 된다. 일독을 권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배여진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입니다. 이 글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월간소식지 <교회와 인권>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