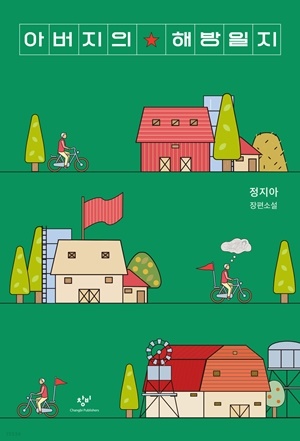
ⓒ
정지아의 신간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맛있게 읽었다. 5만 부가 나갔다고 한다. 한편으로 반가웠고, 한편으로 의아스러웠다. "정지아라는 작가를 아세요?" 어쩌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대화거리가 없는 중년 부부 사이에 괜찮은 이야기 소재가 생겼다.
"<빨치산의 딸>을 쓴 작가 정지아 말이죠. 구례에서 노모를 모시고 산다는 풍문을 들었어요. 그런 책은 사서 읽어야 하는 거요." 부부별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이이지만, 나는 주저하지 않고 두 권의 책을 주문하여 주었다. 이후 아내는 심심찮게 독서의 날을 보냈고, 저녁마다 책에 관한 소감을 말하였다.
"아버지 장례식에 문상을 온 동료들의 이야기인데요. 소설 속에 민주노동당 이야기도 나와요." 아내는 남편이 소설을 읽지 않을 수 없도록 남편의 아픈 곳을 건드렸다.
"빨갱이였던 아버지는 감옥살이를 마치고 나와서도 늘 특별취급을 당했다. 이사를 가면 주소지 경찰서에 미리 신고를 해야 했고…."
1980년대 험난했던 나의 젊은 시절이 떠올랐다. 1980년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경찰들에게 쫓겨 다녔고, 1986년 형사들을 두들겨 팼다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쫓겨 다녔으며, 1989년 불법 조직을 이끈다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 쫓기게 되었다. 수배자의 몸으로 책을 내다보니 책마다 가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정인(정의로운 인간), 황인평(인민 평등), 조민우(민중의 벗)라는 필명을 사용하였고, 나중에는 최윤희라는 유명 수영 선수의 이름을 빌리기도 하였다.
마침내 부천경찰서에 잡혀간 것이 1993년이었으니 얼추 13년 동안 나는 수배자가 되어, '잠수함'을 타고, 설 날 추석 날에도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도발이'의 삶을 살았다. 아마 내 아들이 소설을 쓴다면 "운동권이었던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늘 경찰에 쫓겨 다녔다"라고 쓸 것이다.
정지아는 아버지를 '사회주의자'라고 불렀다.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던들 어찌 소설을 썼겠는가? 하지만 소설 속의 아버지는 낡은 사상에 붙들린 시대착오적 인물로 묘사된다.
"취향마저 빼도 박도 못하게 사회주의자인 아버지", "내 아버지는 정치적으로만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 시도 때도 없이 사회주의자였다."
정지아에겐 퇴색해버린 낡은 사상으로 회상되는 '그 사회주의'를 위해 나도 목숨을 걸었던 시절이 있었다. 1989년 10월, 나는 노회찬, 주대환과 함께 '사회주의노동자당'을 준비하는 기관지를 만들었다. 지하신문의 제호는 <사회주의자>였다. 넥타이 공장에서 죽어도 좋다는 배포였다. 정지아에겐 자신의 삶을 망쳐 놓은 '그놈의 사회주의자'였으나. 그 시절 '사회주의자'는 심장을 뛰게 하는 우리의 영웅이었다. 뜻 없이 휘갈겨 썼을 작가의 글에서 나는 또 한참 동안 망연하였다.
"황 사장은 민노당원인 박동식 씨의 절친한 동생이었다."
민노당은 지금은 사라진 '민주노동당'의 줄임말이다. 우리의 젊음은 민주노동당과 함께 피어났고, 민주노동당과 함께 졌다. 이런 얘기를 밝혀도 될지 모르겠다. 2001년 창당대회에서 여러 당명이 제출되었는데, 당원들은 내가 제안한 민주노동당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이제 민주노동당이라는 이름을 소설에서나 읽는구나….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며 고래고래 외쳤던 지난날이 떠올랐다. 나는 아내 몰래 눈물을 훔쳤다.
정지아는 자신의 운명을 탓하였다.
"아버지는 선택이라도 했지, 나는 무엇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빨갱이의 딸로 태어나겠다 선택하지 않았다. 태어나 보니 가난한 빨갱이의 딸이었을 뿐이다."
여순사건이 일어난 1948년 아버지 정운창은 입산하였다. 총을 메고 4년을 산에서 뛰어다녔고 1952년 위장 자수를 한다. 그러다 위장 자수가 들통이 나 투옥되었다. 죽기 전 아버지는 구례의 아파트 관리인이었다.
그러니까 정운창은 실패한 혁명가였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아버지는 자신의 삶을 선택하였으나, 자신은 무엇도 선택해 보지도 못하고 실패한 혁명가의 딸이 되어버렸다며 작가는 넋두리를 늘어놓은 것이다.
"실패한 혁명가!"
정지아는 아버지의 선택을 자신의 삶을 망친 원죄로 회상하였으나, 그것은 본마음이 아닐 것이다. 소설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술회하였을 것으로 나는 읽었다.
지난날 나는 한말 의병운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 머슴 출신 의병장, 보성과 화순 일대를 신출귀몰한 안규홍 의병장을 몰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미천한 머슴이지만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왜놈 밑에서 욕되게 사느니 죽을 자리에서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1909년 한말 호남의병운동의 최후를 지킨 의병장 전해산을 몰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을 어른이 울면서 나에게 말하였다. "대한의 형세가 이미 글렀는데 그대는 어떻게 하려는가." 나는 말하였다. "이 뒤의 일이야 어찌 될 줄 알겠습니까. 그저 있는 힘을 다해 볼 따름입니다." 어른은 말하였다. "언제나 눈보라 치는 밤이면 우리 해산이 지금 어디 있는가, 추워서 어떻게 견디는가, 밥이나 먹고 다니는가 하여 온 생각이 그대에게 쏠린다."
나는 전해산의 일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한말의병운동에 대해 내가 그동안 품어온 비판적 견해는 알고 보니 운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인들이 주저리주저리 늘어놓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나는 역사 속에서 전개된 피어린 항쟁에 대해 '감 놔라 배 놔라'며 선배들의 삶에 훈수 놓는 평론을 하지 않기로 작심을 하였다.
곰곰이 생각하였다. 내가 만일 1907년도에 살았다면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나는 의병이 되었을 것이다. 내가 만일 1929년도에 살았다면 나는 분명 광주학생독립운동을 하였을 것이다. 내가 만일 1948년도에 살았다면 나의 뜻과 상관없이 나도 총을 들고 산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역사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역사의 부름에 따를 뿐이다. 혁명운동은 제 잇속을 챙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지 않는가? 혁명운동은 그렇게 살지 않고는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없기에 취하는 시대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광주항쟁을 겪은 우리들이 독재정권을 전복하는 혁명운동을 꾀하지 않고 무슨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가?
작가 황광우
************************************************************
황광우는 1958년 광주에서 태어났다. 1975년 고교 시절 반독재 시위를 주도하다가 투옥되었고, 1980년 '서울의 봄' 때 서울대 학생회 사회부장으로 활동하다가, 계엄포고령으로 수배를 당했다.
1984년 인천의 경동산업에서 노동을 하면서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와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을 집필하였다. 1986년 인천 5.3 항쟁을 주도하였고, 1987년 6월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을 창립하였다. 1998년 뒤늦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을 역임했다. 2007년 쓰러져 눕게 되었고, 2009년 전남대 철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여 2014년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광주에서 교사들과 함께 '고전공부모임'을 이끌어오던 중, 2019년 4월 인문연구원 동고송을 창립하였고, 2020년 장재성기념사업회를 만들었다. 현재 광주정신과 인문정신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작가 황광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