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까지 내면서, 노트를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어?'
두 번째 노트를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있는 나를 보고는, 이해할 수 없다며 이렇게 한마디 하는 남편이다. 겨우 나와 맞는 노트를 찾았는데, 시골인 우리 동네에는 아무리 이곳 저곳을 찾아도 없다. 시내 구경 갔다가 우연히 산 노트였다.
작가 노트만 벌써 세 권, 필기 노트 두 권째다. 글을 쓰기로 결심하고 3개월도 안 된 시점이다. 이 정도면 노트를 말할 자격은 있지 않을까. 작가 노트라고 거창한 건 아니고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생각을 모조리 적어 두는 곳이다. 그중에서 필요한 조각들만 맞추어 글을 쓴다.

▲거금들여 산 노트, 3개월만에 세 권째 돌입하다. ⓒ 이정희
무슨 생각이 그리 많은가 싶지만 터무니없는 생각을 쏟아 낸 페이지를, 얼른 지나치려다 보니 이렇게나 쌓였다. '이런 글감이 글이 될 순 없지'라며 다시 마주하기 꺼려지는 생각들 말이다. 그런 잡다한 생각들을 매일매일 새 생각으로 덮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돌아보면 쌓인 생각들 속에 쓸만한 것도 꽤 있다.
내가 노트 쓰기를 계속하는 이유다. 진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
좋아하고 잘 하는 일, 노트 쓰기
최근 함께 글을 쓰는 사람들과 모임이 있었다. 작가 노트 두 권을 다 채워간다는 말에 놀라는 그들. 그들을 보며 내가 노트 쓰기를 좋아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생각해보면 결혼할 때 폐기해야 할 노트만도 수십 권이어서 처치 곤란으로 애를 먹기도 했다.
가끔 노트 쓰기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본다. 노트에 들이는 시간과 돈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다. 만 원 가까이나 하는 두꺼운 종이 노트를 사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했다. 노트를 쓰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저렇게 낭비로 보이니 말이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나를 '기록' 또는 '노트'로 데려가곤 한다. 거기에서 내가 늘 '노트 쓰기'를 검색한 탓이다.
그날은 이재영 한동대 교수님의 '노트 쓰기로 당신의 천재성을 끌어내세요'라는 제목의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영상을 봤다. 우리가 잘 아는 천재들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이작 뉴턴, 아인슈타인' 등에게는 '노트 쓰기'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그래서 노트를 쓰면 좋다는 교수님의 강연이다.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노트 쓰기를 계속해내는 비결을 거기서 찾아냈다는 것.
교수님은 노트를 쓰는 비법으로 '정자체로 쓰기, 반드시 다시 살펴보기, 처음 20%를 단숨에 쓰기, 작은 수첩 활용하기' 와 같은 여러 가지를 제시하셨다. 나도 몰랐는데, 이 가운데 내가 쓰는 비법이 있었다. 나의 지난 모든 노트는 대부분 처음에 가장 많이 쓰여 있다. 비법은 처음 20%를 단숨에 작성하는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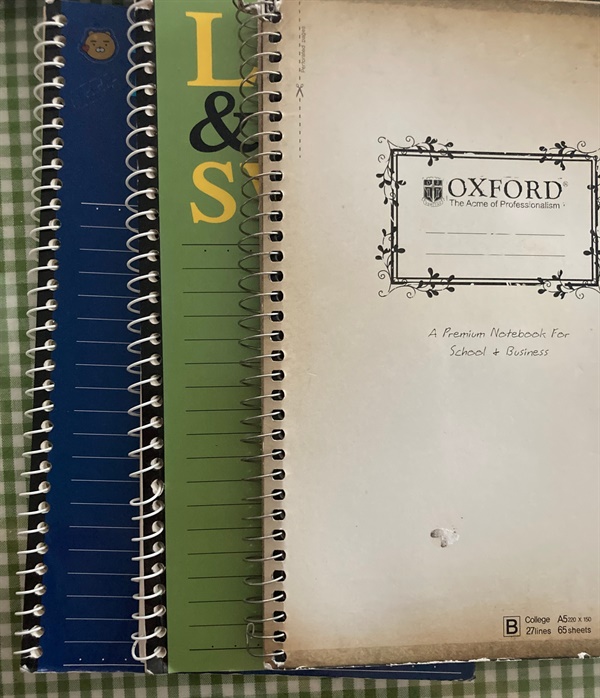
▲노트 덕후 사진 ⓒ 이정희
아니나 다를까, 지난 7월 30일에 시작한 두 번째 작가 노트를 펼쳐보니 그날만 무려 10장이나 쓰여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나는 노트가 두꺼워질 때마다 노트를 자주 넘겨 봤다. 뿌듯함이 느껴졌다. 채워질 수록 더 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경험해 봤을 거다.
왜 그럴 때 있지 않나. 다이어트도 어느 정도 감량이 이루어지면 재미가 나서 멈출 수 없듯이. 눈으로 쌓인 결과는 성취감을 준다. 행복감과 만족감을 주는 성취감,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다. 내가 노트 쓰기를 지속하는 숨은 비결이다.
작은 성취, 오래 지속하는 비결
다른 일에도 노트 쓰기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지난 학기 성적이 나오지 않은 우리 반 아이와 공부 인증 스터디를 했다. 아이에게 그 어떤 과목이라도 좋으니 매일 한바닥씩 공부한 내용을 연습장에 채워오라고 했다. 나는 단지 칭찬 도장과 함께 '무한 칭찬'을 보낸다.
아이는 초반 2주는 띄엄띄엄 해오더니 한 달이 지나자 매일 카톡으로 인증샷을 보내왔다. 끝이 보이는 연습장을 보여주며, 자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리고 성적도 올랐다. 눈에 보이는 작은 노력이 성취감을 만들어 낸 거다. 놀라운 건, 2학기 때도 하자며 아이가 먼저 제안해왔다는 것.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떼쓰던 아이인데 말이다.
사람의 행동을 계속 움직이고 좋은 습관을 지속하게 하는 건 별게 아닌 거 같다. 내가 해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갖는 일이다. 내 이야기가 글이 될까 싶을 때도, 이전에 내가 쌓아 둔 글을 보며 다시 할 수 있으리라고 힘을 내듯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