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현들은 알고 있었다. 시간은 시위를 떠난 화살의 속도처럼 빠르다는 자명한 사실을. 그래서다. 그들은 이렇게 부연했다.
"후회는 언제나 늦는 법이니, 지금에 충실하며 돌이켜 통탄할 일을 경계하라."
이는 흐르는 세월을 그저 그렇게 보내지 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라는 생의 경구로 읽힌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엄정한 위의 사실을 이전에도, 아직도, 아니 앞으로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다 가기 십상이다. 안타깝지만 부정할 수 없는 일.
엊그제 열린 듯한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벌써 저물고 있다. 달력을 뜯어내며 보니 이제 12월을 표시한 마지막 한 장만이 외롭게 남았을 뿐.
한 해가 마무리 되는 달인 12월. 무얼 하며 보내야 조금은 덜 쓸쓸하고, 헛되이 지낸 나머지 11개월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시기엔 좋은 시(詩) 한 편 친구 삼아 긴 겨울밤을 보내는 게 어떨까싶다.
시란 세상과 삶이 내포한 진실을 짧고 은유적인 문장에 담아낸 문화예술의 절정이며, 시인은 다른 어떤 이들보다 세계의 본질을 가까이에서 관조할 줄 아는 사람이다.
무언가 막막한 심경 속에서 뭘 해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해 찬바람 횡행하는 추운 거리를 헤매는 독자들을 위해 세상과 인간의 본질을 노래한 3편의 시를 소개하고자 한다.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연말 선물이 될 수 있었으면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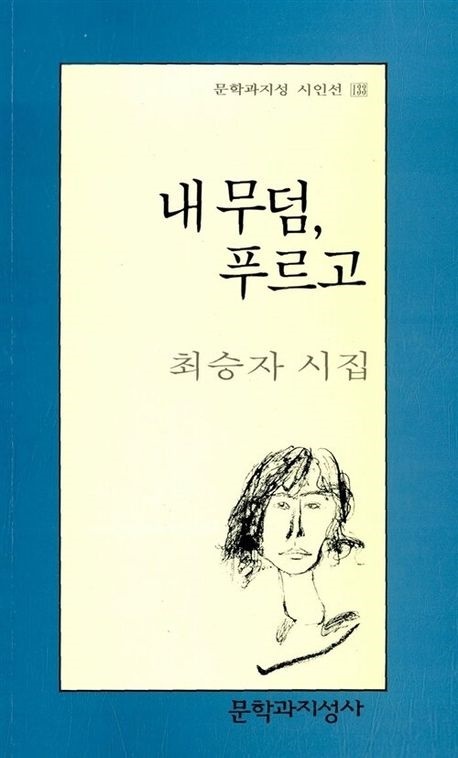
▲최승자 시집. ⓒ 문학과지성사
버석거리는 삶 속에서 '푸른 죽음'을 보는 이
살아있는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건 인간의 한계이자, 인간만이 가진 인식의 드넓은 지평이 아닐지. 필부필부(匹夫匹婦)는 그 생각이 그저 생각으로만 그치지만, 시인은 다르다.
그래서다. 인간보편을 더듬는 예민한 시적 촉수를 가진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시인 최승자(71)는 시집 '내 무덤, 푸르고'에 '未忘(미망) 혹은 備忘(비망)'이란 제목의 연작시를 싣는다. 그중 여덟 번째 노래는 아래와 같다.
未忘 혹은 備忘 8
내 무덤, 푸르고
푸르러져
푸르름 속에 함몰되어
아득히 그 흔적조차 없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개울들 늘 이쁜 물소리로 가득하고
길들 모두 명상의 침묵으로 가득하리니
그때 비로소
삶 속의 죽음의 길 혹은 죽음 속의 삶의 길
새로 하나 트이지 않겠는가.
자신을 포함한 '살아있는' 사람의 바깥에 서서 지극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푸르름 속에 함몰된' 죽음을 떠올리는 건 쓸쓸한 일이다.
그럼에도, 그런 명징한 인식을 통해 '삶 속에 내재한 죽음' 또는, '죽음 속에 존재하는 삶'을 인식하는 건 '고뇌를 통해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행위다. 최승자의 작품이 여타 시인들의 시와 구별되는 지점도 바로 거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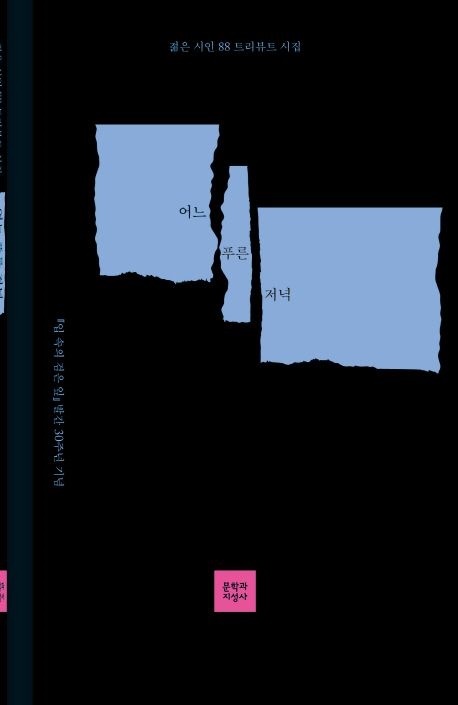
▲기형도 시집. ⓒ 문학과지성사
추운 날 더 떠오르는 단어 '엄마'
시인 기형도(1960~1989)는 요절(夭折)했다. 수사가 아닌 사실 그 자체다. 겨우 만 29세에 어두운 극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으니.
만약 살아있었다면 어떤 시적 성취를 이루었을지 감히 짐작조차 어려운 영민한 작가였던 그는 주목받는 일간지 문화 담당 기자이기도 했다.
세상 어떤 아들이 '그리움'과 '눈물' 외의 방식으로 엄마를 떠올릴 수 있을까? 그건 시인이나 회사원, 공무원은 물론이고 도둑까지 마찬가지일 것이다. 기형도 역시 엄마를 떠올린다. 눈물과 그리움으로. 이런 시다.
엄마 생각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가난한 엄마가 시장에서 열무를 다 팔고 집으로 돌아와도 특별히 달라질 건 없다. 겨우 푸성귀 반찬으로 늦은 저녁을 차려 아들과 함께 먹는 것 외엔. 그럼에도 우리는 바로 그 시간을 기다린다. '엄마가 돌아오는'.
유년의 아이들만이 아니다. 중년의 자식들 역시 "엄마"라고 발음하면 주위 사방 전체가 연탄불 들어오던 아랫목처럼 따스해진다. 그래서다. 기형도의 '엄마 생각'은 바로 이 추운 계절에 맞춤한 시다.
그래도 살아간다는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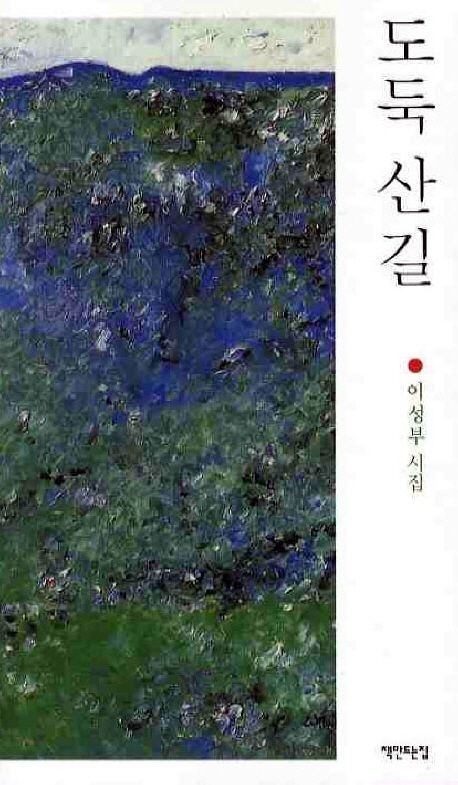
▲이성부 시집. ⓒ 책만드는집
사람이 생의 진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래 살아야할까? 나처럼 53년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건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순(耳順)이나 고희(古稀)에 이르면 갑작스레 깨달음이 올까?
시인 이성부(1942~2012)는 지상에서 꼭 70년을 살았다. 한국문학사에 오래 기록될 절창(絕唱)을 여럿 남겼고, 취미 수준을 넘어서는 등산으로도 문단 안팎에 이름이 높았던 그는 말년에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
깔딱고개
내 몸의 무거움을 비로소 알게 하는 길입니다
서둘지 말고 천천히 느리게 올라오라고
산이 나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리 고되고 숨 가쁜 것 피해 갈 수는 없으므로
이것들을 다독거려 보듬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무둥치를 붙잡고 잠시 멈추어 섭니다
내가 올라왔던 길 되돌아보니
눈부시게 아름다워 나는 그만 어지럽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산길은 마침내 드러누워
나를 감싸 안을 것이니 내가 지금 길에 얽매이지 않고
길을 거느리거나 다스려서 올라가야 합니다
곧추선 길을 마음으로 눌러 앉혀 어루만지듯이
고달팠던 나날들 오랜 세월 지나고 나면 모두 아름다워
그리움으로 간절하듯이
천천히 느리게 가비얍게
자주 멈춰 서서 숨 고른 다음 올라갑니다
내가 살아왔던 길 그때마다 환히 내려다보여
나의 무거움도 조금씩 덜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편안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건 결국 산을 오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진실'을 알게 된 시인은 마침내, '편안합니다'라며 자신의 생과 시에 마침표를 찍고 독자들 곁을 떠났다.
이제 '그래도 생은 벅차고 아름답다'는 이성부의 가르침만이 문장으로 남았다. 그래도, 슬프지만은 않다. 시인 이상부와 달리 우리에겐 아직 생이 진행형이므로.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북매일>에 게재된 것을 일부 보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