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쓴다는 건 참 불편한 일이다. 하루 중, '자 이 시간에는 오직 글만 쓰면 됩니다, 아무도 누구도 어떤 것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해요'라는 이런 시간이 있다면 모를까 - 그런 시간은 애초에 본 적도 없는 것 같다 -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든 시간을 짜내는 구조 속에서 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요즘 같이 일 속에 많이 머무르는 구간에 잠시 숨 고르기 하듯 브레이크를 밟고 글을 쓴다는 것은 상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쉽지 않다.
그나마 만만한 순간이라면, 모든 일과가 다 마치고 하루 끝자락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쓰는 것이다. 약간의 피곤함에 대해 저항할 힘만 있다면 더이상 어떤 것도 쫓아오지 않으니 그때가 적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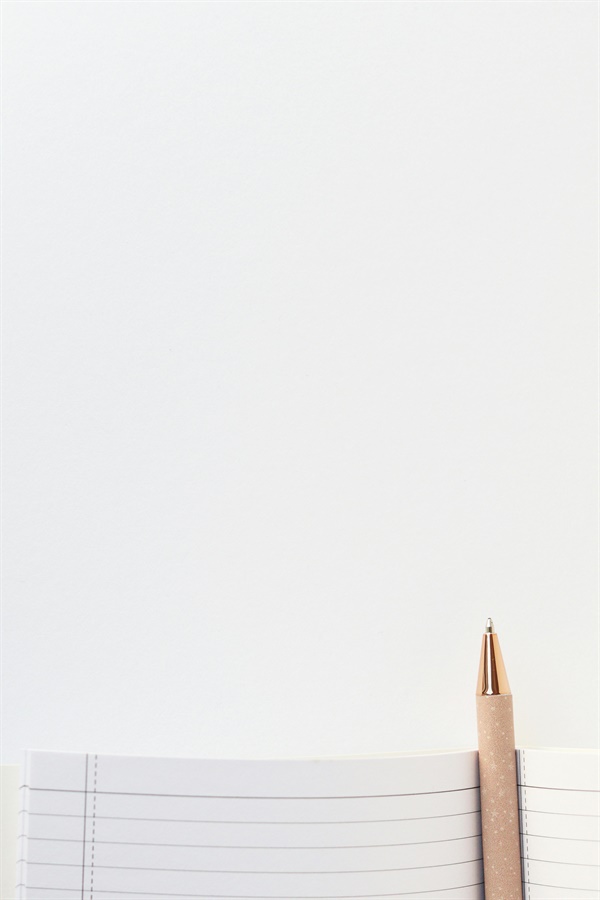
▲글을 쓴다는 건 불편한 일이다‘편한 것들은 나를 끝내 불편함으로 이끌 것이고, 불편한 것들은 나를 끝내 편함으로 이끌 것이다’ ⓒ 픽셀스
그조차도 너무 불편한 일임은 분명하다. 늦은 밤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장대 끝에서 한발 더 나아가듯 글을 쓰는게 도대체 어딜 봐서 좋은 일일까. 1분 1초라도 얼른 씻고, 침대로 풍덩 해서, TV 프로그램이나 보다가 자는 게 더 편하지.
단 며칠만 글을 쓰지 않아도 안다. 편함이 온몸을 감싸 안는 것을 느낀다. 쓰는 것 보다, 쓰지 않는 것이 편하다.
이 사실에 취해있었나, 아니면 늘 속에서는 뭔가를 쓰고 있어서 썼다고 믿었나, 문득 마지막으로 글을 쓴 것을 확인하니 무려 10일이 지나있었다.
다시 쓰기 위해서는 도화선이 되는 명제가 필요했다. 다행히 손쉽게 찾을 수 있었다. '편한 것들은 나를 끝내 불편함으로 이끌 것이고, 불편한 것들은 나를 끝내 편함으로 이끌 것이다'
거의 매일 운동을 한 게 벌써 2년이 넘어간다. 고백하자면 불편하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 운동을 하는 건, 매일같이 사서 고생, 몸을 사서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거의 매일 운동을 한 게 벌써 2년이 넘어간다.(자료사진) ⓒ bruno_nascimento on Unsplash
하지만 그 불편함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나이에, 지금의 이 일상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그 매일의 불편함이 편함으로 이끌어준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이 해석을 붙일 수 있는 구석들이 합쳐진 것이 곧 현재의 내 삶을 만들었다. 특별히 글쓰기는 그토록 매일의 불편함 속으로 다이빙 하는 일이지만, 글쓰기가 없었다면 내 존재는 마침내 편안함에 이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종극에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은 결국 불편함을 추구하는데 있음을 믿어야 한다.
불편함으로, 매일매일 한발 한발 걷는 것이 절벽으로 떠미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떨어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그 모든 불편함들이 그동안 얼마나 한땀 한땀의 깃털이 되어, 단단한 날개를 만들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