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고 나는 몇 달 동안 천식 환자가 된 듯한 환상에 시달렸다. 지리하게 이어지는 문장마다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방에 처박아두고 다시 기분이 나아지면 꺼내 읽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너무 많이 말한다. 그가 쏟아낸 기억들을 꾸역꾸역 다 읽긴 했지만 의무감으로 읽었을 뿐, 지금도 생각나는 건 그의 기침 소리뿐이다.
인터넷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탓인지 갈수록 긴 책 읽기가 꺼려진다. 그래서 짧은 이야기로 구성된 책을 만나면 반갑다. 가즈오 이시구로의 <녹턴>은 기억에 관한 다섯 개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집이다. 보조장치로 음악이 탑재되었다. 가즈오 이시구로는 많이 말하지 않는다. 대신 여백을 많이 남겼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여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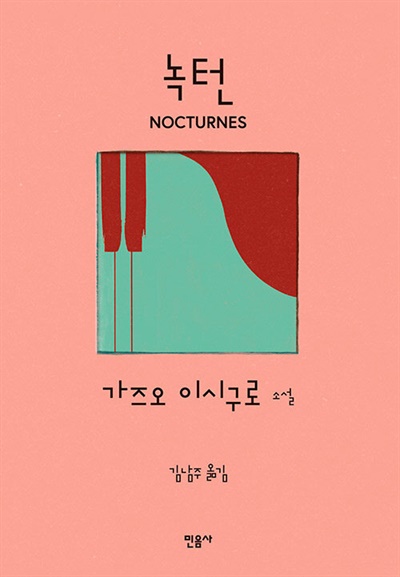
▲가즈오 이시구로의 <녹턴> 개정판 표지 ⓒ 홍윤정
다섯 단편들 모두 울림을 주었지만 나와 비슷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말번힐스> 이야기를 여기에 쓰고 싶다.
호텔이나 식당에서 듀오로 연주하는 뮤지션 부부 소냐와 틸로는 영국의 한적한 시골에서 휴가를 보낸다. 뮤지션 지망생인 화자가 부근 카페에서 일하다 이 부부를 알게 된다. 머리 희끗한 이 부부는 태도가 대조적이라 단박에 사람들 이목을 끌었다.
소냐가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싸늘하게 불만을 표하면 틸로는 세상 최고의 음식이라며 호들갑을 떤다. 소냐가 형편없는 호텔 서비스를 지적하면 틸로는 그 호텔이 아주 멋지다 생각하고, 소냐가 밋밋한 영국 시골 풍광에 실망하면 틸로는 이렇게 멋진 곳에 오게 되어 행운이라 말한다. 소냐가 까칠한 현실주의자라면 틸로는 대책없이 긍정적이기만 한 낙천주의자랄까.
매사에 못마땅해 하는 소냐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듯하다. 영락없는 내 모습 아닌가. 나는 타인이 저지르는 사소한 잘못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지적질할 때가 많다. 앞에서는 하지 못하고 뒤에서 한다. 소심해서다. 남편과 있을 때 이 인간 저인간 못마땅한 점을 토로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남편은 너님이나 잘하라고 타박한다.
속담을 끌어와 자기 눈의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티끌은 잘도 본다고 훈계하기도 한다. 타이르듯 말할 때도 있다. 귀곡산장 마귀할멈에게서 도망치듯 다들 슬금슬금 피하겠네 주변에 누가 남겠냐 등등. 결코 동조해주지 않는 남편과의 대화는 대개 다툼으로 끝나버린다.
틸로가 산책하는 동안 소냐와 화자가 대화를 나눴다. 소냐가 말했다. 젊었을 땐 화를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많은 것들에 화가 난다고. 거울 속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소냐는 살면서 실망을 많이 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했다. 동감한다. 화자와 헤어지기 전 소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틸로가 여기에 오면, 당신에게 말할 거예요. 결코 용기를 잃지 말라고요. 그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런던으로 가서 밴드를 만들라고. 당신은 틀림없이 성공할 거예요. 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행운이 함께하길 빌어요."
"행운이 함께하길 빕니다. 그리고 두 분, 화해하시길 바랄게요."
돌이켜보니 다섯 편의 이야기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에게 행운을 빌어주고 헤어진다. 비록 지금 별 볼 일 없는 신세라 할 지라도 너무 의기소침해 하지 말라는, 서로에게 보내는 위로의 말이다. 우리가 살면서 정작 필요로 하는 건 이런 '다정함'이 아닐까. 사람은 어디서나 비슷하게 사는 모양이다. 소냐와 나는 참 많이 닮았다.
세사르 아이라(Cesar Aira, 1949~ )라는 아르헨티나 작가의 인터뷰 기사를 외국언론에서 읽은 적이 있다. 정확히 6년 전이다. 휴대폰 메모장에 기록해둔 걸 오늘 발견했다. 우리나라에 소개되진 않았지만 저서 80여 권이 이미 여러나라 언어로 번역된 문학작가다. 기자가 그에게 하루 일상을 물었다. 대답이 인상적이다.
"오전에는 신문(Periodicals)을 읽고 오후에는 산문(Prose)을 쓰다 저녁에는 시(Poetry)를 읽은 뒤 밤에 얼음넣은 위스키를 한 잔 마시고 잠자리에 듭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인생에 비유하고 나름대로 그의 일상을 분석해 메모장에 끄적여놓은 게 보였다. '오전에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공부하고(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살아가며(산문을 쓰며), 저녁이 되면 지난 시간을 기억하다(시를 읽다), 밤이 되면 깊은 잠에 빠져들겠구나(죽겠구나).'

▲황혼, 수채화 ⓒ 홍윤정
하루를 인생에 비유하면 나는 지금 황혼 무렵을 서성이고 있다. 저녁이 되면 그럭저럭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에 몸과 마음이 느긋해진다. 내게 저녁 시간은 하루종일 욕하고 미워했던 대상들에게 일말의 미안함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하다.
가령, 요가 수업이 시작된 지 15분이나 지났는데 당당히 문을 열고 들어와 매트를 바닥에 탁 떨구는 애엄마. 보기 싫어 죽겠는데 꼭 내 옆에 앉는 상습지각생이다. 카페에서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시켰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떡하니 내놓는 알바생. 수 년 째 똑같은 레퍼토리로 강습하는 운동코치. 소화제를 사러 약국에 갔더니 간들대는 목소리로 건강보조제를 강권하는 약사…
다들 내 심박수를 높인 인간들이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어 그랬을 텐데 그걸 다정하게 감싸주지 못하고 까칠하게 인상쓴 점 미안하다. 그 외에도 차마 부끄러워 여기에 언급하지 못하는 무수한 대상들을 향해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말번힐스>의 소냐처럼 나도 많이 실망하며 산 것 같다. 앞으로 종종 돌아보며 반성은 하겠지만 그런다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 쉬이 살아날지는 모르겠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냉소적이고 불만투성이다. 그럼에도, 책 속 다섯 편의 화자들이 전하는 다정한 인사를 여기에 기록해두고 마음에 담기로 했다. 언젠가는, 내 입에서도 그런 다정한 말들이 자연스레 튀어나올 날이 올 것이다.